문재인 정부가 쇠퇴한 도시지역의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기능 재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본격화하면서 제주지역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소규모 지역주도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활성화계획은 원도심 활성화가 화두로 던져진 최근 제주지역의 분위기와도 맞닿아있다. <제주의소리>는 세 차례로 나눠 도시재생 뉴딜 추진에 따른 제주지역의 대응 과제와 시사점을 살펴본다. [편집자 주]
[제주와 만난 도시재생 뉴딜] (3) ‘포장된 개발’ 그만, ‘정말 필요한 것’이 핵심

문재인정부가 ‘도시재생 뉴딜’을 공식화하면서 지자체들마다 사업 추진단이나 대응 TF팀을 구성하고 각종 협약을 채결하거나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대응방안을 찾느라 분주하다.
제주 역시 지난 7월 24일 관련 12개 부서, 도시재생지원센터, 개발공사, LH, 제주연구원 등으로 꾸려진 TF팀을 구성해 대응해 나섰다.
이번 도시재생 뉴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5만㎡ 이하 우리동네 살리기 사업과 5~10만㎡ 규모의 주거지지원형 사업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당장 올해 말 제주지역에서 2개 지역이 선정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당장 ‘준비돼 있는 지역이 있느냐’가 관건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뉴딜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그 지역 주민, 상인회 등과 함께 상생조직위원회 개념으로 별도의 조직을 꾸려 당국과 협업체계를 만들어 갈 것”이라면서도 “준비기간이 짧은데다 미리 주민들 간 조직체계가 구성된 곳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걱정을 나타냈다.
지역이 겪고 있는 문제를 이 같은 방식으로 풀어간 경험을 가진 곳이 드문 만큼 ‘안내자’로서의 당국의 역할이 중요한 대목이다.
정부는 이번 사업을 공식화하면서 기존 중앙 주도의 대규모 도시재생 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지자체가 주도하고 중앙정부는 지원만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지역주도의 상향식(Bottom-up)으로 핵심 사업지를 지자체가 직접 선정토록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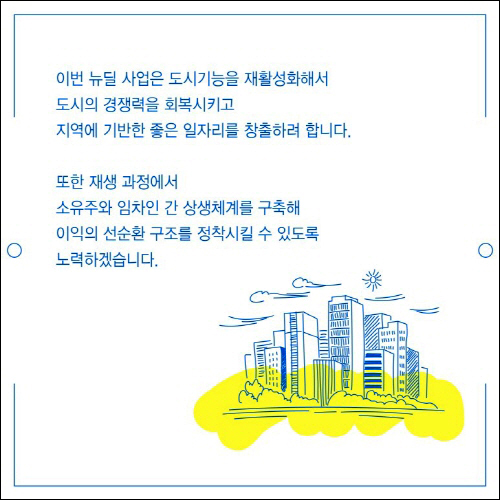
중앙정부가 아닌 지자체가 많은 역할을 담당하게 하는 셈이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당국이 한 발짝 물러서서 주민들의 자발적인 움직임을 뒷받침 해야한다는 의미이지, 과거와 같은 접근방식으로 일방적 사업 추진을 하라는 의미는 아니다.
생업에 바쁜 주민들이 이 프로젝트를 전반적으로 살펴보기 어려운 만큼 이번 사업의 전반적인 내용부터 진행 과정, 어떤 제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지 알고 싶어 하는 주민들에게 알려주는 안내창구 역할을 해야한다는 주문이 나온다. 전문가들을 적절하게 주민들과 매칭시켜 주는 것 역시 당국의 몫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부설연구기관인 토지주택연구원(LHI)의 김주진 도시관리연구실장은 “사업 내용을 지방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해서 뿌리는 방식은 안된다. 공공부문의 역할은 ‘논의를 하는 판’을 깔아주는 데 있다”며 “정책의 흐름과 구체적인 내용을 먹고 살기 바쁜 주민들 스스로가 판단하기 힘든 만큼 상시정보를 제공하는 창구 역할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도시재생 뉴딜이 실행되면 건물주 뿐 아니고, 세입자와 영세상인들도 생활에 영향을 받게 된다”며 “‘지역사회에 뭐가 더 필요한가’에 대해 입장이 서로 다른 만큼 다양한 구성원들이 한발짝 물러서서 함께 가야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