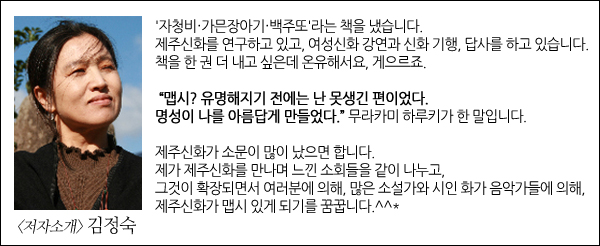




<김정숙의 제주신화 ③> 민중의 삶, 일상과 함께 하는 신들
문화는 자연환경에 대한 이해의 정신적, 물질적 표현이다. 자연적 조건과 신화의 형성 그리고 담론으로서의 문화는, 각 문화마다 그것의 보편성과 고유성을 가지게 하면서, 끊임없이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준다.
제주신화는 제주의 자연환경과 문화를 보여주는 타임캡슐이다.
제주도의 자연환경은 제주도의 문화를 읽어내는 가장 중심적이고 기본적인 단초가 된다. 제주도 신앙이 다른 지역과 차이를 보여주는 것도 기본적으로는 이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세계의 많은 신화들과 마찬가지로 제주신화 역시도 신화의 보편성을 가지면서 동시에 제주지역만의 고유한 몇 가지 특성을 보여준다.
1. “정에 어신 정수남이 궡이(처럼) 굴지 말라”
우선 제주신화는 어느 신화에도 비길 수 없을 만큼, 인간의 삶과 친밀하다는 특징을 갖는다. 그리스신화처럼 엄청난 돈을 벌어다 주는 문화적 상품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신 제주신화는 제주사람들의 일상적 삶 속에 아주 가까이 살아 숨 쉬고 있어 주목할 만한 입지를 가지는 것이라 생각된다.
우리나라에 가장 흔한 욕 중의 하나는 ‘개새끼’이다. 그러나 그 흔한 욕이 제주에서 사용된 것은 대중매체가 보급된 후의,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그동안 대물림되던 제주에서의 일상적인 욕들은 제주신화에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들이었다.
제주의 어머니들은 그녀의 자녀들에게 ‘노일저대구일의 딸’궡이(처럼) 궁뎅이를 빼쭉대며 뽄(멋)만 내면서 나돌아다니지 말라고, ‘정에 어신 정수남이’궡이 생각 없이 굴거나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라고,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흘그생이’궡이 흘긋거리지 말라고 늘 가르쳐 왔다.
절대로 빠져서는 안 될 것은 ‘쇠(소)잡아먹을’ 간새(게으름)이었고, 가장 치명적인 욕 중의 하나는 ‘쇠(소)도둑놈의 집안’이었다.
신을 표상할 때도 신비한 신의 이미지를 나타내는 후광을 입히는 일은 없다. 입가에 피를 흘리면서 사람의 두개골로 된 술잔을 들고 있는 무시무시한 모습도 아니다. 팔이 여럿이거나, 온 몸이 눈으로 뒤덮이거나, 머리가 여러 개인 신의 모습도 아니다. 엄청난 형태로 신을 모시고, 조각이나 그림으로 우상화, 신비화한 경우도 거의 없다.
지배, 지혜, 복수, 관능, 질투 등의 개념을 신에게 부여하여 인간의 모든 심성들이 찬양되고, 신과 같은 동일함을 얻으려 했던 그리스와도 다르다. 언제 어디서든 늘 경외되는 대상으로 있는 것도 아니다. 그리스신화의 제우스처럼, 많은 신들을 대표하는 신격도 없다.
마을에 있는 나무, 큰 돌, 바다가 내려다보이는 바위가 신이 되었다. 수확이 끝나거나 새해가 열릴 때면 아이들에게 빔을 해 입히듯, 나무를 신의 몸으로 삼아 거기에 물색을 걸어 고운 옷을 입혔고 지전과 소지를 걸어 풍요로운 농사를 빌었다.

제주에서 땅은 남다른, 더욱 중요한 곳이었다.
그 귀한 물도 땅에서 솟아난다 비가 오면 물이 모두 땅속으로 흘러들어 고도가 낮아져야 솟아나온다.오름과 오름을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걸어 다니다가 저편에서 갑자기 뭔가 쑥- 솟아나오는 모양으로 다른 사람과 마주쳤다. 바람을 막아주고 담과 집을 지어주는 재료들도 땅에서 나온다. 곡식, 물, 사람, 흙과 돌, 모든 소중한 것들이 땅에서 솟아나오니 신들도 땅에서 솟아 나오는 것으로 생각했던 것일 게다.

중요한 것은 21세기의 바로 오늘까지도 그러하다는 것이다.
제주에서는 해마다 입춘날이면 전국에서 유일하게 입춘굿을 하며, 한 해의 풍농을 기원한다.
음력 정월에는 인간의 명절과 같은 신과세제, 7월 장마가 끝난 뒤에는 장마가 끝난 뒤 곰팡이를 쓸어내는 청소 제의인 마불림제, 10월에는 추수감사제에 해당하는 시만곡대제(新萬穀大祭) 등, 일정한 때가 되면 마을의 본향당에서는 하루 종일 굿을 한다. 아이들은 마을의 신이 모셔진 당 입구에 모여 공을 차고, 한 구석에는 점심 준비가 한창이다. 마을을 떠나 외국에 가 있던 자손들까지도 잠시 돌아와 마을의 당에 모여 기도를 하고 얘기꽃을 피운다.


제주에는 고온다습한 풍토적 영향으로 피부병이 많았고 사람들은 당에 가서 삶은 계란을 올리고 기원을 했다. 미끈한 계란처럼 탐스럽고 매끈한 피부가 되도록 기원하며 올린 제물이었다.
제우스에게, 일본 천황의 직계로 인식되는 천조대신에게, 그 무시무시한 인도의 시바신에게, 알라신에게, 21세기의 오늘에도 여전히 그러고 있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제주의 신들은 민중의 삶, 일상과 함께 언제나, 아주 가까이 있다. /김정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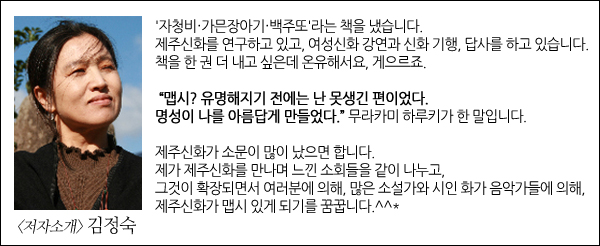 | ||
<제주의소리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