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제주옹기박물관 허은숙 관장

“잘 됐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잘 돼야 한다. ‘제주옹기’가 잘 된다는 건 뿌리를 잘 내리고 싹이 잘 트는 것이다”
허벅, 통개, 장태, 망대기, 단지…, 유약을 칠하지 않아 질박한 색감을 띤 제주의 옹기는 제주의 자연 그리고 삶 그 자체를 쏙 빼닮았다. 산업화 물결에 밀려 1970년대 초 맥이 끊겼던 제주옹기가 언젠가부터 다시 숨을 쉬고 있다.
2007년 대정읍 신평리에 ‘껌은돌 공방’을 만들어지고, 2008년에는 사단법인 제주전통옹기전승보존회가 창단됐다. 그리고 2010년 대정읍 구억리에 체험장을 갖춘 제주옹기박물관이 문을 열었다.
이 같은 움직임엔 십수년 가까이 온 청춘을 ‘제주옹기’에 쏟아 부은 허은숙(45) 관장이 있다. 그녀에겐 ‘억척’이라는 말이 절로 따라붙는다. 도예 전공자, 하물며 남자들도 고된 일에 나가떨어지는 동안에도 꿋꿋하게 터를 지켜온 그녀다. 단순한 호기심이 이제는 사명감이 됐고, 30대 초반 파릇했던 청춘은 어느덧 희끗한 중년에 접어들었다.
제주에선 현무암으로 만든 돌가마를 가리켜 굴이라고 한다. 굽는 온도와 방법, 구워진 그릇의 빛깔에 따라 노랑굴과 검은굴로 나뉜다. 검은굴은 낮은 온도로 구운 후 굴을 막아 연기를 먹여 까만빛깔을 얻어내는데서 얻어진 이름이다. 노랑굴은 1200도 고온에서 불을 때는 과정만으로 색을 입혀 황갈색, 검붉은 색을 띠기 때문에 얻어진 이름이다.
서귀포시 대정읍은 제주옹기의 집산지다. 제주는 화산섬이라 돌 많고 땅이 거칠지만 신평리 주변에선 찰진 흙이 나오고 가마 만들 자리와 땔감을 구하기는 구억리가 제일이었기 때문. 그렇게 자연스레 이곳은 제주옹기 집산지로 굳어지게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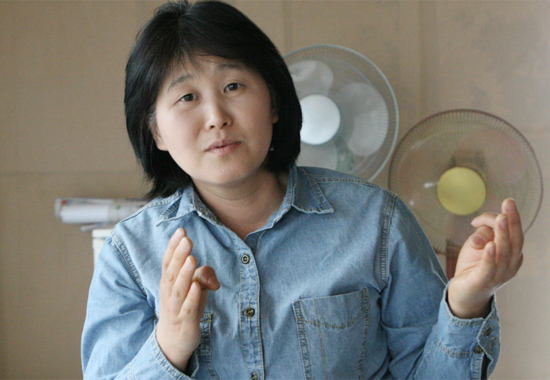
1999년, 그녀가 처음 이곳에 발을 딛던 때다. 도예 전공도 아니거니와 서울서 육지물 좀 먹었던 그녀가 이곳에 오게 된 건 단순히 ‘흙 좀 얻으려…’는 이유에서였다.
허 관장은 제주대 산업디자인학과 1회 졸업생으로 대학교 3학년 때 서울로 취직을 하게 됐다. 서귀포 촌에서 나고 자라 제주도 바깥을 나가본 적 없는 그녀에게 서울 생활은 영 쉽지 않았다. 버티듯 수년을 지내다 가족의 병고로 귀향하게 됐다. 대기업 환경디자인연구소에서 일했던 경력 덕에 당시엔 생소하던 ‘환경디자인’이란 개념을 끼고서 말이다.
마냥 놀 수 없어 학교 조교 일을 시작했던 것이 ‘터닝포인트’였다. 학교에서 진행하던 환경디자인 프로젝트에서 제주옹기의 존재를 알게 됐던 것이다. ‘이곳에 뼈를 묻겠다’던 동료들과는 달리 제주 흙 좀 얻는 대신 노동력을 제공하는 대가로 현장에 발을 디뎠던 그녀다.
그러나 웬걸. 마음을 다졌던 동료들은 하나둘 씩 떠나가고 현장에는 그녀를 비롯한 몇뿐이 남지 않았다. 그녀의 역할이 다 끝나도 끝내 발길을 돌릴 수 없었던 것이었다. 혀 끌끌 차며 얼마나 가는지 두고보자던 어르신들도 3년이 지나자 낯빛이 달라졌다. 기특했는지 안쓰러웠는지 오며가며 한 마디씩 툭툭 던졌다.
옹기 만드는 사람으로서의 근본과 뿌리가 되어준 곳을 나왔던 그때를 돌이켜보면, 스스로 불가마 속으로 들어가 더 뜨겁게 혹독하게 자신을, 스스로의 신념을, 그리고 미래를 구워내던 시간이었다. 그녀는 많은 사연 끝에, 동료들과 함께 신평리에 ‘껌은돌 공방’을 만들었다.
“그저 한 가지 바람은 제대로 된 전수자들이 제주옹기의 생명력을 이어갔으면 하는 것뿐이었다”고 그녀가 말했다.
그러던 그녀에게도 시련이 닥쳤다. 2007년 첫 번째 팀들과 좋지 못한 일로 헤어지면서 두 번 다시 옹기와 관련된 일은 그 어떠한 것도 하지 않겠다며 짐 싸들고 집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불과 일주일도 채 못갔다. 그때까지 묵묵히 바라본 1세대 도공들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믿음을 져버리는 것 같아 도저히 가질 못하겠더라. 스스로 자초한 일이라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한다. 가족들에게도 마찬가지다. 이왕 이렇게 된 거 제주옹기의 가장 원초적인 구억리와 신평리에 뿌리를 내리겠다 다짐했던 것”이라고 허 관장은 말했다.

그때부터 1세대 기능인들의 기록화 작업을 시작했다. 도공뿐만 아니라 옹기 장수, 관련 일을 했던 어떤 누구라도 기록을 하다보니 몰랐던 부분들이 계속 나왔다. 3년이 지나자 80%정도 작업을 마쳤다.
그녀의 하루 일과는 온통 ‘옹기’뿐이다. 동선도 집-작업장이면 끝이다. 무슨 낙으로 사냐 물었더니 “글쎄요…”라는 답이 돌아온다. 이제는 차마 어쩔 수 없는, 그녀가 안고 가야 할 운명이 된 듯 싶었다.
허 관장은 “나도 남들처럼 취미도 갖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좋아하는 게 뭐지 스스로에게 물었더니 결국엔 ‘흙’이더라. 이젠 떼어놓을 수 일상이 돼 버린 것 같다. 벗어날 수만 있다면 벗어나고 싶다. 그렇지만 나 스스로도 벗어날 수 없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안다”고 털어놓았다.
“지난 10여년 간이 제주옹기의 ‘발아’의 시기였다면 앞으로는 ‘안착’의 시기가 될 것”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구억리 분교를 고쳐 만든 제주옹기박물관은 현재 문을 닫은 상태다. 분교는 교육청 소유인데다가 지역 주민의 의견과 맞지 않으면 언제든 물러나야하기 때문이다. 허 관장은 ‘셋방살이’의 설움을 떨치고 이제는 어엿하게 내 집에서 내 미래를 펼치겠다고 말했다. 현재 작업장이 있는 무릉리 근처로 박물관을 옮길 계획이다.
“전통문화는 하루아침에 이뤄지는 게 아니더라. 10년은 지속적으로 이끌어가야 몸에 밴다. 제주옹기박물관이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체험교육에 집중하는 것도 이때문이다. 제주옹기의 보존, 전수 기능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으론 ‘어린이’들이 중요한 자원”이라고 설명했다.
허 관장은 ‘행정’의 관심이 또한 중요하다고 짚었다. “제주옹기는 전통자원으로서 ‘제주’라는 이름을 붙여졌기에 제주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것이지, 현장에 있는 사람 것은 아니다. 현장이 뒷받침이 되는 것 뿐이다. 앞으로는 행정이 적극적으로 나서줬으면 좋겠다. 경제적 지원이 아니라 ‘제주옹기는 제주도 거야 건들지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입장에 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주의소리>
<김태연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