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훈의 제주담론] (20) 제대로 뜬 '지슬', 뒷심은 도민만이 받쳐줄 수 있다
영화 《지슬》이 떴다. 그것도 세게 떴다. 예견했던 바이지만, 심상치 않던, 범상치 않은 오멸의 영화. 2013년 선댄스 영화제(Sundance Film Festival)에서 월드드라마(외국 영화) 부문 심사위원 대상을 거머쥔 것이다. 4·3영화라는 별명이 있는, 제주 촌놈이 촌에서 맹근 작품이 내로라하는 글로벌 무비 가능성의 도가니판에서 완판승을 일구어 냈다. 이름 하여 선댄스의 쾌거다.
선댄스? 뭔 댄스?
 | ||
“선댄스가 뭔 춤이여?” 하시는 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인터넷에 널린 정보를 정리해 소개해 본다.
선댄스 영화제는 매년 1월 20일 미국 서부 유타주의 북부인 파크시티에서 열린다. 이 영화제는 1978년 유타주의 솔트레이크시(Salt Lake City)에서 열린 ‘유타유에스 필름 페스티벌(Utah/US Film Festival)’이 그 모체로, 처음에는 회고전 상영과 세미나에 초점을 맞춘 행사를 중심으로 하는 소규모 영화제였다. 이후, 헐리우드의 명배우이자 영화감독인 로버트 레드퍼드(Robert Redford)가 헐리우드 상업영화에만 관심이 쏠리는 것에 반발해, 1982년 독립영화 육성과 신예감독의 발굴, 후원을 모토로 선댄스재단(Sundance Institute)을 설립하고, 영화제를 후원하기 시작하면서 세계적인 영화제로 발돋움하기 시작한다.
이 영화제의 바뀐 이름인 선댄스 영화제(Sundance Film Festival)라는 이름 역시, 그의 흥행작인 영화 《내일을 향해 쏴라(Butch Cassidy And Sundance Kid)》(1982년 작) 중 그가 연기한 ‘Sundance Kid’에서 따왔다고 한다. 현재 선댄스 영화제는 세계 최고의 독립영화제로 자리 잡았고, 영화인들게는 이 영화제에 초대되는 것만으로도 의미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국제적으로 미국 독립 영화를 위한 최대 견본시이자, 신인 감독들의 중요한 등용문으로 평가받고 있다.
 | ||
새 이름으로 새롭게 출발한 이 영화제의 첫 해에는 ‘빔 벤더스’가 연출한 《파리, 텍사스》가 세계적인 주목을 끌었고, ‘코엔 형제’의 《분노의 저격자》가 심사위원 대상을, ‘짐 자무쉬’의 《천국보다 낯선》이 심사위원 특별상을 받았다. 이들은 현재 세계영화사에 자신의 핸드프린트를 선명하게 각인한 명감독들로 성장했다. 이처럼 실력 있는 신예감독들이 이 영화제를 통해 발굴되어 세계 영화계에서 그 진가를 인정받고 무명의 신예감독에서 세계적인 거장으로 성장하면서 영화제의 명성 또한 높아졌다.
특히 1989년 선댄스가 발굴한 스티븐 소더버그 감독의 《섹스, 거짓말 그리고 비디오테이프 Sex, Lies and Videotape》가 칸영화제에서 그랑프리를 수상하면서 세계적인 영화제로 주목을 받게 했다. 선댄스에서 주목받은 영화는 곧 세계영화계의 관심으로 이어지고, 감독들에게는 ‘고생 끝 행복 시작’의 새로운 미래티켓을 거머쥐는 일이기도 하다.
한국 영화로는 1996년 박철수 감독의 《301·302》가 처음으로 이 영화제의 월드섹션 부문에 선정되어 화제를 모았고, 1997년 박철수 감독의 《학생부군신위》가 같은 부문에 초청되었다. 2000년에는 이명세 감독의 《인정사정 볼 것 없다》가 초청받았고, 이지호 감독의 단편영화 《동화》(1999)는 국내 최초로 경쟁작 부문에 출품되었다. 하지만 2004년 김동원 감독의 다큐멘터리 《송환》이 특별상인 ‘표현의 자유상’을 수상한 것을 제외하면, 아쉽게도 한국영화가 선댄스 영화제 경쟁부문에서 수상한 이력은 전무했다. 이번 오멸 감독의 대상 수상은 그동안 한국영화계가 바라던 소망 하나를 이룬 셈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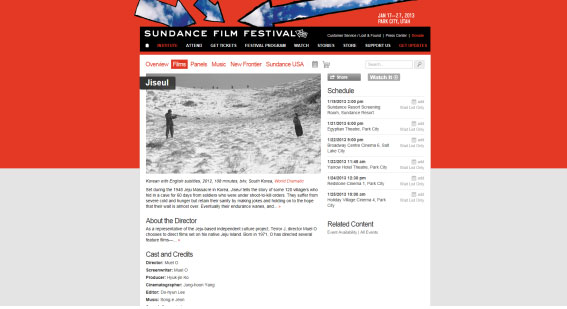
작년 베니스 영화제에서 김기덕 감독이 《피에타》로 대상을 받으면서 한국영화의 위상이 더없이 높아졌는데, 이번에 오 감독의 선댄스 영화제 대상 수상은 또 다른 한국영화의 힘을 세계적으로 드러낸 일로 찬사를 받을 만하다. 아이러니한 것은 둘 다 비주류 아티스트들의 작품이라는 점이다.
영화 《지슬》은 지난해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처음 공개돼 넷팩상(아시아영화진흥기구상), 시민평론가상, 한국영화감독조합상 감독상, CGV 무비꼴라쥬상 등 4관왕을 차지하면서 영화계의 주목을 받았고, 지난 해 12월 서울독립영화제에 초청돼 전 회 매진이라는 기록을 세웠다. 또한 올해 1월 초 열린 아시아 독립영화의 미래-AFC 쇼케이스 2013에 초청돼 전 회 매진 상영이라는 기염을 토했다.
선댄스 영화제는 초청작을 자국인 미국 영화와 외국 영화(월드시네마)로 나누고 다시 극영화와 다큐멘터리 부문으로 나눠 4개 부문에서 상을 준다. 심사위원 대상은 각 부문 최고의 작품에 주는 상으로, 《지슬》은 월드드라마(외국 극영화) 부문에서 이 상을 받은 것이다. 《지슬》의 대상 수상은 심사위원 만장일치로 이뤄졌다고 한다.
또 지난 12월 23일 네덜란드에서 개막한 세계적인 영화제인 제42회 로테르담국제영화제 스펙트럼 부문에도 초청돼 상영을 앞두고 있으며, 오는 2월 5일부터 프랑스에서 열리는 제19회 ‘브졸아시아국제영화제’ 장편영화 경쟁부문에도 진출해 있다. 또한 이외에도 10여 개 이상의 외국 영화제에 초청받고 있다. 이처럼 《지슬》이 만들어 낼 뉴스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도민들이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아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 ||
남는 문제, 제주도와 제주도민들
4·3은 제주의 현대사에서 모든 것을 가르는 트라우마다. 4·3의 비극적인 역사는 제주도민들이 세계사의 격변기에 외부로부터의 힘에 응전한 가혹한 결과이기도 했다. 제주의 현대사는 1948년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 당시를 살았거나, 그들의 후손들이라면 어느 누구도 4·3을 떠나서 제주도에서의 삶을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의 막강한 영향력과 잴 수 없는 무게를 지닌 심연의 상처인 것이다.
4·3특별법이 만들어지고 법적·제도적 4·3문제 해결의 길이 열리면서 4·3의 아픔은 어렵지만 치유와 복원의 길로 들어서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4·3은 대한민국의 1%도 세계인의 0.000001%도 잘 알지 못하거나 전혀 알지 못하는 아시아의 작은 섬에서 일어난 ‘사건’일 뿐이다. 그런 탓에 그동안 학계와 4·3진영에서는 일찍부터 4·3의 국제화·세계화에 대한 담론이 존재해 왔다. 그것은 당연한 것이며, 필요불가결한 것으로 인식되어왔던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어떻게?’였다. 어떻게 4·3을 국제화·세계화시킬 것인가의 문제 말이다. 결국 필요성으로만 언급되었을 뿐 4·3이 세계와 만나는 일은 쉽지 않았다.
그런데, 예기치 않은 곳에서 길이 열린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제주에서조차 ‘다슴애기’ 취급 받았던 오멸 감독이 사건을 낸 것이다. 소위 네임밸류 하나 없는 프린지아티스트였던 이 영화감독은 다른 말하기 방법으로, 그동안 4·3에서 시도되지 않았던 영화라는 매체와 언어로 그만의 4·3을 완성했다.(이미 이에 대한 글을 썼기에 이 글에서 《지슬》에 대한 언급은 피하기로 하자.
다만, 그의 영화 속 4·3 말하기는 기존의 4·3 어법과 다르면서도 새로운 시각에서 만들어졌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그리고 그가 그려낸 4·3은 절제된 영상미학과 영화언어를 통해 충분히 4·3의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이 꽤 성공적인 그만의 4·3스토리가 통한 것이다. 어디로? 바로 세계로다. 그동안 학자들이 세미나 상석에서 열심히 되뇌던 그 국제화·세계화의 길이 열린 것이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모든 일은 뒷심이 있어야 한다. ‘롱런’, 모든 영화인들이 바라는 일이다. 롱런을 칠수록 영화의 생명은 오래가는 것이기에. 이 영화 역시 롱런할수록 4·3은 상영관에 오래 걸릴 것이고, 그동안 1%의 4·3이 퍼센티지를 갱신해 나갈 것이며, 0.000001%의 세계적 인지도 역시 자릿수를 좁혀갈 것이다.
다가오는 3월에 《지슬》은 애초 제작진의 약속대로 제주 개봉 후 전국에 배급 상영된다. 그동안 아무도 관심 두지 않았던 음지에서 언 손 녹이며 영화를 만들었던, 제주에서 나서 제주에서 살고 제주에서 영화를 찍어왔던, 이제 마흔을 넘긴 고집스런 늦깎이 신예감독 ‘오멸’에게 ‘다슴애기’가 아닌 적장자의 대우를 해야 할 때가 되었다.
3만의 4·3희생자 수를 영화 《지슬》의 관객 수로
감독은 《지슬》의 제주 개봉에서 제주도민 3만 명 정도가 이 영화를 보아줬으면 하는 바람을 피력한 바 있다. 그 정도면 전국적으로도 바람몰이가 가능하다는 얘기다. 그가 바라는 제주도민의 뒷심의 실체다. 아무리 김기덕 감독이 베니스에서 그랑프리를 안고 와도 흥행에는 실패했다고 한다. 상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영화를 보느냐의 문제이다. 제주 개봉에서 제주도민 3만 명(이는 4·3 당시 피해자와 같은 수다.)이 상영관을 찾아 영화를 봐준다면, 그것은 사건이다. 4·3이 역사적 사건이듯 4·3영화인 《지슬》 역시 문화사적 사건이 되는 것이다.
그 영화를 본 이야기를 이 섬 곳곳에서 시작한다면, 그것은 마치 영화 《지슬》에서 동굴 속 주민들의 웅얼거리는 목소리들이 거대한 공명의 울림이 되듯, 그 울림이 세계로 퍼져 나가는 것과 같은 일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저예산 독립영화 《지슬》이 제주에서 3만 관객, 전국에서 3백만 관객, 세계적으로 3천만 관객을 끌어 모을 수 있다면, 4·3의 영토는 그만큼 넓어질 것이고, 아시아의 작은 섬 제주에서 일어난 1948년의 피맺힌 역사는 세계사적으로도 결코 잊히지 않을 것이다.
결국, 올해 4·3운동은 ‘영화 《지슬》 보기 운동’이 되어야 할 것 같다. 얼마나 쉬운가? 영화를 보아주기만 해도 4·3의 전국화와 세계화가 이루어진다는데, 마다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인구 60만의 제주섬에서 5%의 사람들이 이 영화를 봐준다면, 전국의 5% 이상의 관객을 끌어 모으는 마중물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일에는 다른 누구보다 4·3유족들이 나섰으면 한다. 왜냐하면 일차적으로 이것은 그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피맺힌 세월을 살아 온 4·3의 적장자인 유족들이 나서서 4·3 영화 보기 운동이 벌어진다면 일단 당연하고 자연스럽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들은 환호하는데 유족들이 멀뚱하게 있을 순 없기 때문이다. 적어도 4·3유족과 후손들로 1만의 객석은 채울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8천 공무원 조직이 있다. 공무원 중에는 유족들도 있을 것이고, 또한 공적인 녹봉을 먹고 있으니, 제주의 공적인 문제 중의 하나인 4·3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기에,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준다면, 적어도 1만 명의 관객 수는 채울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도의회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 어차피 4·3의 제도적 해결에 발 벗고 나섰던 것은 제주도의회였다. 각 도의원들이 지역구에 갈 때마다 입소문을 내면서 적극 권장한다면 도민들 모두에게 알려질 것이다. 그러면 불특정 도민 다수로 나머지 1만을 채울 수 있다. 그리하면 3만 관객이라는, 당시 희생자 수를 넘어서는 또 다른 3만의 사건을 만들어낸다면, 그동안 ‘다슴애기’로 살아왔던 이 프린지아티스트에게 뒷심 한번 넣어 줄 수 있을 것이다.
개봉하는 날 도지사와 도의장이 앞장서고 도청 간부급 공무원들과 도의원들이 함께 상영관을 찾아 준다면, 그리고 덧붙여 소위 제주도의 기관장급들이 부하 직원들을 대동하고 속속 상영관을 찾아준다면, 이는 4·3 영화 보기의 붐으로 이어질 것이다.
그동안 무관심하던 제주도는, 며칠 전 이 영화의 선댄스 수상과 맞물려 지대한 관심을 표했는데, 내용 중에 영화제작에 따른 제작비 일부와 촬영장비를 지원했다는 내용까지 덧붙였다가 언론의 빈축을 산 바 있다. 평소에는 무관심하다가 얼마 되지 않는 영화제작비를 지원했다고 생색내다 얻은 빈축이다. 그 보도자료에는 우근민 지사가 “제주 출신 영화감독이 제작한 영화 ‘지슬’이 제주의 아픈 역사를 예술로 승화시킨 작품인 만큼 후세에 산교육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도민과 학생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홍보할 것”을 특별히 강조했다는데, 몸소 모범을 보일 필요가 충분하다.
그동안 여러 경로를 통해 4·3의 역사적 해법을 부정해 온 바 있는 퇴역 경찰공무원들의 모임인 ‘경우회’와 퇴역 장성들의 모임인 ‘성우회’ 그리고 ‘재향군인회’ 집행부들도 이 영화를 꼭 보았으면 한다. 왜냐하면 이 영화는 주민들의 피해만을 다루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어떤 의미에서 유족들은 그런 이유로 이 영화에서 그려진 4·3이 자신들이 바라던 바에 못 미친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바로 그 당시 토벌대로 온 군인들의 속사정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그 가혹했던 시절에는 모두가 사연을 가지고 있음을, 그러기에 더욱 비극적임을 이 영화는 상징적으로 잔잔하게 그려내고 있다. 이것이 이 영화가 다른 4·3작품들과 다른 점이기도 하다.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토벌대의 속사정을 영화적 언어와 스크린의 허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그려내고 있기 때문이다.
마치며
필자는 얼마 전 영화 관련 토론회 석상에서 오멸 감독을 ‘제주의 김연아’라고 소개한 바 있다. 그녀는 피겨스케이팅의 불모지인 한국에서 그야말로 혜성처럼 나타나 전무후무한 실력으로 한국빙상을 세계화시켜버린 장본인이다. 그 누구도 예상치 못했지만 그녀는 세계의 무대에서 낭보를 계속 보내왔고, 우리 국민들은 어느 순간 이 피겨요정을 우리의 뇌리에 애정 깊게 각인시켰다. 그때까지 우리는 누구도 김연아를 몰랐다. 그렇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관심의 사각지대에서 고군분투한 그녀의 실력은 세계를 주물렀다.
오멸 감독은 순 제주토박이다. 필자에게는 바로 그 점이 더 중요하다. 온전히 이 섬 땅의 DNA를 가지고 만들어낸 영화이기에, 그 영화가 일군 성과이기에 더욱 그 의미가 크기 때문이다. 이 작은 섬의 누구도 돌보지 않았던 전설 같은 비극의 역사가 세계인의 문화코드로 부활하는 드라마를 그가 써 낸 것이다. 국제자유도시니 특별자치도니 해봐도 결국 그 의미는 세계와 직접 만나는 제주도가 되자는 것 아니었는가?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멸 감독의 영화 《지슬》은 그 둘을 이미 충족시킨 셈이다.

이제 도민들이 나서서 오 감독에게 그동안의 외로움과 각고에 답하는 격려를 보낼 필요가 있다. 그 방법은 어렵지 않다. 오는 3월 제주 개봉 때, 빠뜨리지 않고 영화 《지슬》을 챙겨 보아주는 것이다. 그리고 혼자 가지 말고 한 사람이라도 더 손잡고 가준다면, 그에게 더 큰 격려는 없을 것이다.
《지슬》을 보자, 도민들이여! /박경훈 제주민예총 이사장 <제주의소리>
<제주의소리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