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출범과 제주] 공공기관장·감사 등 5명 안팎…JDC이사장 초미관심
[박근혜정부 출범과 제주] 공공기관장·감사 등 5명 안팎…JDC이사장 초미관심
박근혜 시대의 개막과 함께 부푼 꿈을 키우는 이들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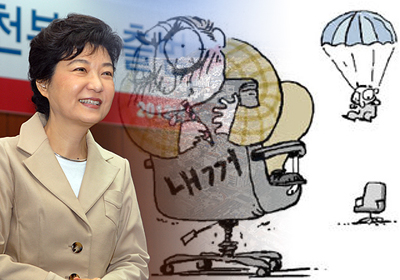 | ||
국정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공직의 수는 얼마나 될까.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정부조직법 등에 따르면 대통령은 ▲내각 ▲헌법기관 ▲정부투자기관, 산하기관 등 공공기관 ▲특정직(검찰, 경찰 고위직 등)에 대한 임면권을 갖고 있다.
대략 8000개에서 많게는 1만개에 달할 정도로 대통령이 갖는 인사권은 어마어마하다. ‘제왕적’이라는 수식어가 항상 따라붙는 이유다.
전국적인 상황이 이렇다는 것이고, 제주지역으로 좁히면 대략 5자리 안팎이 정권창출 공신들의 몫으로 여겨진다. 대부분 정부부처 산하 공기업과 공공기관의 장(長)이거나 감사 등이다.
가장 선망하는 자리는 국토교통부(옛 국토해양부) 산하 공기업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이사장이다.
참여정부를 출범시킨 뒤 진철훈(전 서울시 주택국장), 김경택(전 제주대 교수)씨가 정권창출 몫으로 이사장을 맡았다. 이명박 정권이 들어선 뒤에는 변정일 전 국회의원이 자리를 꿰찼다. 연임까지 성공, 최장수 기록을 써가고 있다.
변 이사장의 임기가 5월까지인 점을 감안할 때 교체 타이밍이 조금은 앞당겨질 수도 있다. 벌써부터 개국공신 3~4명의 이름이 오르내린다.
우선 대선 때 제주도국민통합행복추진위원회 상임위원장을 맡았던 김한욱 전 제주도 행정부지사의 이름이 거명된다. 제주도 관광문화국장·기획관리실장, 행정자치부 제주4.3처리지원단장, 국가기록원장 등을 지낸 관료 출신이다.
중앙선대위 국민소통본부 부본부장 겸 제주총괄 본부장을 맡았던 김용하 전 제주도의회 의장도 유력 후보 중 한 명이다. 친박 외곽조직인 ‘제주희망포럼’을 이끌며 캠프가 꾸려지기 전부터 ‘박풍’을 일으킨 주역으로 꼽힌다.
제주캠프 종합상황실장을 맡아 실무를 총괄했던 양창윤 제주도당 사무처장도 후보군에 이름이 오르내린다. 현경대·안경률 의원 수석보좌관, 국회 제공회(제주출신 공무원 모임) 회장, JDC 비상임이사, 한국저작권위원회 사무처장 등 다양한 경험이 장점으로 꼽힌다.
JDC의 2인자 격인 상임감사도 정권창출 공신의 몫으로 분류된다.
참여정부 때는 노사모 출신의 정구철 제주국제대 교수, 김형규 오일장신문 회장, 양시경 제주경실련 공동대표가 바통을 이어받았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MB의 대표적 사조직인 선진국민연대 출신의 김경수 전 대한민국 ROTC 중앙회 부회장이 자리를 꿰찼다.
JDC 이사장과 상임감사 모두 연봉이 1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알짜’로 통한다. 급수를 조금 낮춰 본부장급을 비롯한 1~2자리가 ‘낙하산’을 탈 공산도 있다.
한국마사회에서도 1~2개(제주본부장, 감사) 자리가 선거공신 몫으로 배정될 수 있다.
참여정부를 만든 제주지역 1등 공신으로 노무현 대통령으로부터 ‘군사(軍師)’라는 애칭을 받은 이종우 전 남군의회 의장이 본부장을 맡은 바 있다.
대한교원공제회가 전액 출자한 라마다 프라자 제주호텔의 상임감사도 선거공신이 비집고 들어갈 수 있는 자리 중 하나다.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적 경호처장을 자처했던 유시민 전 장관이 이끈 개혁당 제주도당의 산파 역할을 맡아 노무현 대통령 만들기에 기여했고, 이후 열린우리당에 합류한 김용균씨가 참여정부 말기에 배려(?)를 받았다.
이 밖에 제주대병원 상임감사 자리도 박 대통령의 ‘결심’에 따라 선거공신을 앉힐 수 있는 자리다. 현재는 김순효 전 도의원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 제주도당 여성위원장 출신으로, 비례대표로 제8대 제주도의회 의원 배지를 달았다.
선거공신들이 부푼 꿈을 꾸고 있지만 정작 박근혜 대통령은 당선자 신분일 때부터 ‘낙하산 인사는 없다’고 선을 그은 게 변수라면 변수다. 경우에 따라선 생시가 아닌 ‘꿈’으로 그칠 수 있다는 얘기다.
정권창출 공신들 역시 박 대통령의 인사스타일을 잘 알고 있는 만큼 하마평에 오르내리는 것 자체가 부담일수밖에 없어 이래저래 한숨 소리가 늘고 있다.<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