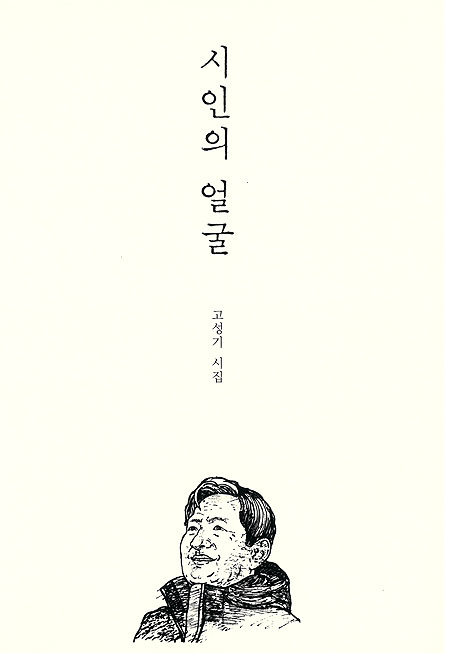
1987년 시조 시인으로 등단하면서 문인으로 산지 30년이지만 시집은 이번까지 네 번째다. 고 씨 스스로도 “참 게으르다”며 “이제야 세 번째 시집인데 그렇다고 좋은 작품을 쓴 것도 아니”라고 한없이 자세를 낮췄지만 책 속 시들은 마치 초겨울 바다를 누비는 방어처럼 생동감 있는 에너지와 자연의 법칙에 순응하며 떨어지는 낙엽 같은 차분함을 동시에 갖추고 있다.
시인의 얼굴엔 바람이 일어야 한다. <시인의 얼굴>중에서 <시인의 얼굴> |
어찌 흘러야만 강이랴 기다림도 흐르는 것을 메마른 땅이어서 속으로만 울컥 토하는 울음 넘치는 섬의 절규를 쫓아가며 들을 뿐 <시인의 얼굴> 중에서 <제주 건천(乾川) 1> |
발문을 맡은 윤석산 시인(제주대 명예교수)은 “고성기 형의 원고를 받아들고 채 30분이 못되어 해설을 자청하고 말았다”며 “모두가 아주 자유분방한 자유시 형식인데다, 포말리스트들처럼 활자체를 변형하고, 한 자를 한 행으로 설정하는가 하면, 영어 단어도 괄호 안에 넣지 않고 드러낸 작품들이 자꾸 시선을 잡아끌었기 때문”이라고 호평했다.
고 씨는 책머리에서 “수확의 계절 가을에 원고를 정리하며 거둘 게 없어 낯 뜨겁다. 그러나 유명 시인 창고에 개봉도 않고 쌓여 있는 무명시인의 설움을 받고 싶지는 않다. 그 동안 내게 보내준 시인들의 시집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주섬주섬 원고를 모아 뽑았다. 10년이 지나도 부끄러움은 여전할 테니”라고 겸손하게 밝혔다.
1950년 한림에서 태어난 고 씨는 제주일고와 제주대학교 국문과를 졸업하고 1974년부터 제주여자고등학교에서 국어교사를 거쳐 교장으로 재직하다 2013년 은퇴했다. 1987년 시조 시인으로 등단해 시집 <섬을 떠나야 섬이 보입니다>, <가슴에 닿으면 현악기로 떠는 바다>, 산문집 <내 마음의 연못>을 출간했다. 2000년 동백예술문화상, 2011년 제주도 예술인상을 받았다.
북하우스, 159쪽, 1만원.
한형진 기자
cooldead@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