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리시선] 바닷길을 개척해야
| ‘소리시선(視線)’ 코너는 말 그대로 독립언론 [제주의소리] 입장과 지향점을 녹여낸 칼럼란입니다. 논설위원들이 집필하는 ‘사설(社說)’ 성격의 칼럼으로 매주 수요일 정기적으로 독자들을 찾아 갑니다. 주요 현안에 따라 수요일 외에도 비정기 게재될 수 있습니다. / 편집자 글 |
제주의 사면, 바다
“우리가 바다를 알고자 하는 것은 단순한 호기심 때문이 아니라 바다에 우리들의 생존이 걸려 있기 때문이다.” 미국 케네디 전 대통령의 말이다.
사면이 바다인 제주 섬에 바다의 의미는 특별하다. 그럼에도 알게 모르게 우리의 시야는 인근 바다에 제한되어 버렸다. 현실적인 가능성에 그 너머를 상상하는 힘을 잃어버렸는지 모르겠다. 육지와의 연관성을 중시해 바다도 인근으로 한정한 게 아닌지 모르겠다.
제주도는 한반도 남해안에서 약 140km 떨어져 있고, 수심 100m 내외(90-130m)의 대륙붕에 위치한 화산섬이다.
동시에 제주도는 서해, 남해, 동중국해 등 3개의 해역과 접해 있으며, 이들 해역을 구분하는 주요 경계다(국립제주박물관 편, ‘해양문화의 보고’, 2017 참고).

역사와 바다
조선 시대 제주 바다는 봉쇄의 상징이었다. 제주는 가장 먼 유배지였다. 제주 바다는 건너기 힘든 길이었다. 출륙 금지령이 그 대표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탐라 시대는 경제적으로 더 척박한 시기였을지 모르나, 바다에서만큼은 조선 시대보다 훨씬 자유로웠다. 대등한 무역은 아니었지만 중국, 일본과의 교류가 활발했다.
과거 유배지였던 제주가 이제는 대표적인 여행지로 사랑받는 섬이 되었고 이주하는 사람도 늘어났다. 여러 문제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나, 이전에 비하면 확실히 좋아졌다. 그러나 우리의 시선이 제주 땅과 하늘길에 머물고 바닷길에는 덜 주목하는 게 아닌가 하는 게 필자의 소견이다.
세계화 시대라면 우리는 제주를 제주 섬과 인근 바다에 국한할 게 아니라, 바닷길을 열어 더 큰 바다로 나가야 하지 않을까? 우리는 어느 시대의 바다를 지향하며 사는가? 태평양과 접해있는 지정학적 위치를 활용해야 하지 않을까? 탐라 시대 자유로웠던 뱃길이 (물론 무척 험난했을 것이다) 이 시대에 펼쳐져야 하지 않을까?
남해 큰 바다와 제주
필자 연구실 출입문 벽면에 있는 업다운(up-down) 지도를 가끔씩 들여다본다. 양옆으로 중국과 일본, 바로 위 오키나와와 대만이 보인다. 한중일의 역사적 관계를 잘 알기에 동중국해는 아련하게 보인다. 국가 간에 서로 사이가 좋다면 제주와 이들 국가의 도시 간에 상호 교류가 활발하고 여객선이 줄기차게 왕래할 듯하다.
비현실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꿈 깨라고 말할지 모르겠다. 실제로 동중국해 해역은 배타적 경제수역(EEZ)과 대륙붕 경계를 두고 한중일의 견해가 첨예하게 대치되는 곳이다. 하지만 더 넓은 남해의 가능성을 접기에는 이르지 않나 생각된다. 동중국해는 제주 기준에서 보면 남해가 된다. 북해만큼 남해로도 역량을 모아야 하지 않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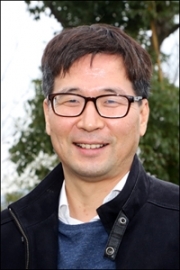
물론 제주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매우 제한되어 있다. 하지만 그 가능성을 개척해야 하는 건 여전히 제주의 몫이다. 제주의 역량과 의지가 있어야 어떤 조건에서든 가능성이 생기는 법이다. 여러 조건과 여건보다 중요한 건 의지일지 모른다.
중국과 일본과의 뱃길을 활성화할 방안을 모색할 주체가 등장해야 한다. 몇 차례 시도가 있었고 실패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 우리에게는 도전이 필요하고 실패도 중요하다. 그 가운데 무의미한 시간이 아닌 축적의 시간을 보내야 한다. /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고봉진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