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에 홀려 필름에 미쳐' 잠든 김영갑을 추도하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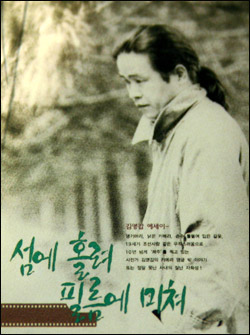
유난히도 길던 올해의 겨울 끝자락, 막 봄꽃들이 하나둘 피어나려고 할 때 형님은 올해 출사를 하는 것이 꿈이라고 하셨지요. 출사를 가실 때 불러주시겠다고 하셔서 그렇게 기다렸는데 이게 무슨 소식입니까?
한 번도 형님, 아우 불러본 적은 없습니다만 어쩌면 서로 그렇게 부르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살아생전 단 한 번이라도 직분이라는 껍데기를 떼고 선생님, 목사님 하고 서로를 부르지 않았더라면, 형님, 아우 그렇게 불렀을 터인데, 살아생전에는 그렇게 부르지 못하다 이제 이어도에 잠드시고 나서야 형님이라고 불러 봅니다.
이제야 형님이라고 불러봅니다
막 사진에 미치려고 할 때 저는 형님의 이름 석자를 들었습니다. 김영갑이라는 그 이름, 그리고 책을 통해서 사진 한 장을 얻기 위해서 그 얼마나 눈물겨운 삶을 살았는지를 알고는 감히 사진에 미치겠다는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형님에게 사진은 삶이었는데 저에게 사진은 그저 유희처럼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갤러리로 첫 방문 할 때가 생각납니다. 추운 겨울이었죠. 당연히 그 추운 겨울, 루게릭병으로 힘들어하고 있을 형님은 그저 누워 계실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꼿꼿하게 의자에 앉아서 오고 가는 손님들에게 잔잔한 미소로 화답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고통이었는지를 알지 못했습니다만, 그렇게 앉아 계시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몰랐습니다. 그 아픔의 깊이를 알 수 없어 나는 똑바로 눈도 마주치지 못하고 서둘러 전시실로 들어갔습니다.
전시실에 걸려 있는 사진들, 그것은 충격이었습니다. 바람에 홀린 듯한 사진들을 보면서 그 한 장의 사진을 어디에서 찍었을까 하나둘 영갑 형이 서 있었을 자리들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그래요. 그 곳은 언제가 내가 섰던 곳이기도 했고, 내가 서고 싶은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형님에게는 이 땅에서의 마지막 겨울이었죠. 함께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하시며 그 힘든 몸으로 두 시간여에 거쳐 독대를 하셨어요. 책상에 놓여진 담배 - 아, 담배를 피울 수 있을 정도로 몸이 좋아졌는가보다,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물론 목사 앞에서 담배를 태우면 안된다는 생각을 하셨는지 독대를 하는 내내 담배를 입에 물진 않으셨지요.
"목사님, 사진 중에서 제일 힘든 것을 택하셨군요."
"……."
"꽃 사진이 쉬운 것 같은데 사실 누가 찍어도 똑같은 사진이 나올 경우가 많고, 그래서 꽃 사진으로 자기의 색을 낸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죠."
그때 저는 고수의 가르침을 한마디라도 잊지 않으려고 얼마나 귀를 기울였는지 모릅니다. 아직 나만의 색깔을 가진 사진을 찍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날 함께 이런 저런 대화를 나누며 사진 한 장에 혼을 담았던 형의 여로를 볼 수 있었습니다.
가르침
"올해는 그동안 나가지 못했던 출사를 나가는 것이 계획이랍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축하드립니다. 꼭 나갈 수 있길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때는 나도 불러주십시오."
환하게 웃으며 꼭 그렇게 하겠노라고 하셨는데 그 약속을 서로 지키지 못했습니다. 내 기도는 이뤄지지 않았고, 형은 그렇게 이 세상을 놓고 말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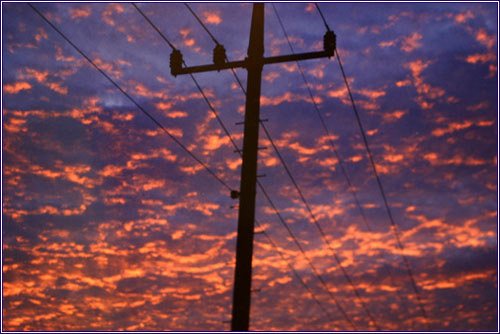
그러니까 섬에 홀려 제주도로 건너온 지 20년을 채우고 이어도로 가셨군요. '육지것'이라는 딱지를 떼어버리고 '제주것'이 되어버린 형. '육지것'인 나도 맨 처음에는 그 '육지것'이라는 말이 왜 그렇게 거슬리는지 모르겠더군요.
그런데 형이 "육지것이라고 부르지만 제주분이라고 하지 않고 스스로도 제주것이라고 하잖아요"하면서 그것이 단지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그 단어 속에도 제주인들의 한이 들어 있고 정이 들어 있다고 했지요.
그때 나는 알았죠.
이 사람은 이젠 육지것이 아니구나, 제주것이구나.
그런데 이렇게 맑은 날 가시다니요.
늘 아프니 그렇게 오래 갈 줄 알았지 이렇게 갑자기 숨을 놓을 것이라고 생각도 못했지요. 그럴 줄 알았으면 사랑하는 사람,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는 것을 미루지 말 것을 그랬습니다.
딱 한 번 몰래 카메라를 가지고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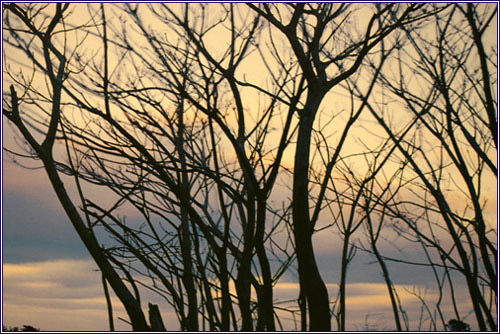
내가 저런 풍광을 본 적이 없는데, 저런 곳에 서 본 적도 없고 기억도 없는데 왜 저 풍경이 내게 들어와 있는 것일까 놀란 것이죠.
제주의 오름, 들판을 거닐 때마다 형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쯤에서 찍었겠다, 저쯤에서 찍었겠다 하면서 말이죠. 그리고 함께 출사 나가면 "여기서 찍었죠?"하려고 했는데, 그 한 마디를 하지 못했으니 이제 더욱 더 영갑 형이 서 있었던 그 자리, 걸어갔던 길이 더욱 그리워지겠네요.
영갑 형, 이어도에서 편히 쉬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