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몽골을 만나다] 몽골의 쇠망
중국 본토를 중심으로 동아시아 전역 거의를 지배하며 번창을 누리던 몽골족의 왕국 원나라는 권신(權臣)들의 계속된 정쟁으로 내부 국정이 해이해지고, 이 틈을 타 한족(漢族)이 여러 곳에서 반기를 드는 등 크고 작은 폭동이 일어나면서 쇠망의 길로 접어듭니다. 이 시기에, 즉위하기 전의 고려 공민왕은 원나라의 수도 대도〔지금의 베이징〕에서 10년 동안 지냈기 때문에 그 징조들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이어진 몽골과의 관계로 나라 운영의 모순이 심화되고 누적되어온 고려 역시 ‘국지부국(國之不國)’, 곧 ‘국가의 형태는 갖추었지만 나라꼴이 말이 아닌 것’으로 묘사될 정도로 정치·사회·경제 전반적으로 황폐해져 있었습니다. 이에 자주성 회복과 내정개혁을 바라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그 여망에 부응하려는 의지를 즉위 이전부터 가졌던 인물이었던 공민왕은 즉위하고 나서 기회를 모색합니다.
몽골이 1353년(공민왕 3)에 한족 장사성(張士誠) 등이 일으킨 반기평정에 실패하자 공민왕은 몽골의 쇠망을 확신하고, 몽골에 붙어 막강한 위세를 떨치던 기철[기황후의 오빠] 등 부원배(附元輩) 요인과 그 근친들을 궁중연회에 참석하라며 불러들여 제거한 다음, 준비해왔던 반원정책을 단행합니다. 그게 1356년(공민왕 5)의 일입니다.
그 뒤 제주는 반원정책에 반기를 드는 목호세력과 고려가 수차례 맞부딪치는 현장이 되고 맙니다. 제주 관할 주도권 향방도 몽골과 고려 사이를 몇 차례 오고갑니다.
제주 관할에 참여했던 토착세력은 고려와 몽골, 혹은 목호가 미치는 영향력의 강도에 따라 행보의 향방을 움직였습니다. 제주백성은 고려 관리의 잦은 수탈에 고초를 겪었던 터라 봉기를 일으키기도 하는 등 고려 관리에게 반감을 갖는 경우가 잦아 목호세력에 기울어지기 쉬운 사정에 처해 있었습니다.
몽골은 쇠망해가면서도 제주에 집착했습니다. 1366년(공민왕 15)에는 몽골황제 순제가 피난할 궁전을 짓기 위해 몽골사신이 와서 사전조사를 했고, 다음 해에는 목수 등을 보내 궁전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제주에는 몽골족이 모여 사는 마을이 이미 이루어졌을 만큼 몽골인 수가 많았고 목호세력이 제주관할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제주를 ‘낙토(樂土)’로 여길 정도였으니 탐라에 대한 몽골의 집착이 짐작되고도 남습니다. 또한 제주가 중국대륙으로부터 한참 떨어진 지역이어서 피난뿐만이 아니고 훗날의 재기를 염두에 두었기 때문인 듯도 합니다.
<관련유적 둘러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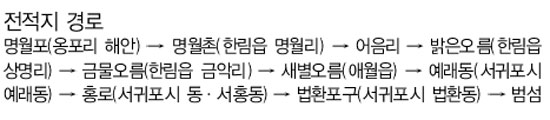 | ||
명월포와 명월촌
명월포는 지금의 한림읍 옹포리 해안에 있는 포구입니다. 1270년, 진도삼별초의 이문경 부대도 이 포구를 통해 제주로 들어왔습니다. 1273년 삼별초를 정벌하기 위해 출동한 여·몽연합군 역시 이 포구로 들어왔습니다. 몽골족 목호를 토벌하기 위해 온 최영 장군도 이 포구로 들어왔다 돌아갔으니, 명월포 자체의 역사도 참 다난합니다.
고려시대의 명월촌은 현재의 한림읍 옹포리, 명월리, 상명리, 동명리, 금악리 등을 포함한 지역 일대를 일컫습니다. 용천수가 솟는 샘이 풍부해 일찍이 마을이 생겨났던 지역이지요. 1300년(충렬왕 26) 고려가 제주에 14개 군현을 새로이 설치할 때 명월현이 되었습니다.
지금의 옹포리 해안에 있는 포구인 명월포로 1270년에 삼별초 부대, 1273년에 여·몽연합군, 1374년에 최영장군의 출정군 등이 들어올 때마다 전투가 벌어졌으니, 그때마다 명월촌 주민들은 터질 듯한 긴장감으로 불안과 공포에 떨어야 했을 것입니다. 희생도 만만치 않았겠지요.

중산간에 자리한 금악리의 넓은 초원은 몽골이 설치했던 목장지대의 일부이기도 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6소장으로 편입됐었다고 합니다.
이 마을에는 “목호의 후손들이 여기저기 산재해 살고 있었는데, 성姓을 모르는 자가 많았으며 마을사람들과 서로 도우며 근실한 생활을 하는 자가 많이 있었다. 제주사람들은 혼혈족들의 빈곤한 생활과 한스러운 고독감, 비열감 등을 덜어주고 제주사람들과 다름없는 인간적인 대우를 해주기 위해 일자리를 마련해주고 호적이 없는 자들을 양자로 입양시켜 주거나 솔자[거느려 사는 사람]로 입적시켜 주었다.”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금물오름
한림읍 금악리 남동쪽에 자리한 오름으로 ‘검은오름’이라고도 부릅니다. 표고 428m, 비고 180m로 우뚝 솟아 마을을 굽어보고 있습니다. 보는 방향에 따라 분위기가 다릅니다. 남이나 북쪽으로는 원뿔꼴을 이루고 동이나 서쪽으로는 사다리꼴을 이루고 있는데 어디서 봐도 아름다운 모양새입니다. 길이 잘 다듬어져 있어 가볍게 오를 수 있습니다. 중턱 위로는 거의 풀밭이어서 천천히 걸어도 30분 안팎이면 꼭대기에 다다릅니다.
타원형의 화구 ‘금악담’이 물을 머금고 있습니다. 이 오름은 제주오름 가운데 몇 안 되는 화구호가 있는 오름인 것이지요. 정상에서 바라보는 탁 트인 사방 전망이 감탄사를 자아냅니다. 이 오름과 들판 어디쯤서 전투가 벌어졌던 것일까, 상상은 꼬리를 물지만 아름다운 풍광에 취하노라면 전적지로서의 실감은 잘 나지 않습니다.


새별오름
새별오름은 들불축제로 유명세를 탄 오름이지요. 표고 519m, 미끈한 풀밭으로 덮여있어 미려한 몸체를 그대로 드러내놓고 있는 매혹적인 자태가 눈길을 잡아끕니다. 이웃해 있는 쌍둥봉우리는 이달오름입니다. 이 이달오름에서 새별오름을 보면 크고 작은 다섯 개의 봉우리들이 별표 모양으로 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새별오름일까 싶은데, 아침햇빛을 받거나 저녁노을빛에 물들었을 때 금성처럼 찬란한 아름다움을 뽐낸다니, 또 그래서 새별오름인 듯도 합니다.
새별오름 정상에 서면 제주 서쪽 지대 시야가 탁 트이면서 거칠 것 없는 들판이 펼쳐집니다. 어름비 평원입니다. 이 평화로운 들판이 최영 장군의 군대가 진을 쳤었고, 목호 군대와 치열한 전투를 벌였던 곳이라고 하는군요. / 김일우·문소연
<본 연재글의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엄격히 금지합니다. 본 연재글의 저작권은 '제주문화예술재단'에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