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이 든다는 것은 슬픔을 알아가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슬픔을 견뎌내면서 더욱 더 단단하게 철이 들어가는 것일지도요. 철이 드는 것, 그리고 슬픔을 아는 것, 둘 중에 어느 것이 먼저 오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하는 것처럼 쓸데없는 물음일 테지요. 그럼 이제 제가 그놈의 철이 들었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확 쓰기를 포기해버릴까.’ 하는 생각이 불쑥불쑥 드는 것을 참아가면서 말이지요.

#. 어머니는 밥물을 맞추지 못하셨다
고등학교 입학하고 5월로 접어들 무렵이었습니다. 부엌에서 밥을 짓던 어머니는 저를 불렀습니다. 솥뚜껑을 열고는 알맞게 뜸이 든 것 같으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얼른 “네”라고 대답했습니다. 부엌 솥 쪽으로는 고개도 돌리지 않은 채 말이지요.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그 후로도 어머니는 똑같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밥 뜸 잘 들어시냐...?”
그리고 설익거나 너무 질거나 예전과는 다른 밥이 자주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가끔은 제가 밥물을 맞추기도 했고, 뜸이 잘 든 것 같으냐는 말에 전 여전히 저는 “네”라고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고백하건데 저는 그때 상황의 심각성은 전혀 깨닫지 못한 채 모든 일이 귀찮기만 했습니다.
어머니는 그렇게 점점 앞이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손가락 두 개를 펴 보이며 몇 개냐고 물어보면 더 이상 어머니는 정답을 맞히지 못하셨습니다. 아 그것은 열심히 노력하고 기를 쓰고 해도 안 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하루, 하루가 다르게 어머니는 보지 못하는 것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 예고도 없이 아무 준비도 없이, 일테면 “지금의 상황은 이렇고 얼마 후에는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친절한 설명도 없이 그렇게 어둠에 잠식당하고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난데없이 말이지요.
아 생각해 보니 그건 아니었네요. 어머니가 제게 뜸이 잘 든 것 같으냐고 했을 때부터, 제가 부쩍 자주 밥물을 맞추게 됐을 때부터, 설익거나 진밥이 상에 올라올 때부터 사실 어머니는 당신의 뜻과는 무관하게 천천히 자연스럽게 당신의 상황을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눈치 채지 못하게 하려고 정말 무던히 노력하셨지만 어쩔 수 없이 들켜 가면서요.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이 겨우 두 달 정도에 걸쳐 일어난 것이라면, 저로서는 순식간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요.
그때까지만 해도 전 앞으로 닥칠 일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이었다 해도 전 너무 어렸고, 네 그러네요. 저는 그때 채 철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런 상황은 한바탕 쏴아 하고 지나가는 소나기 같은 것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밑도 끝도 없이 아무런 생각 없이 어머니의 시력은 다시 돌아올 거라고 막연히 믿었습니다. 일종의 감기처럼 말이지요. 이 시기가 지나면 진밥 설익은 밥이 아니라, 알맞게 뜸이 든 밥이 밥상에 올라 올 것이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돌아오다
지금처럼 땡볕이 한창이던 여름, 아버지는 어머니와 같이 서울로 가셨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종합 병원에서는 이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으니까요. 그리고 서울로 올라가기 전에 용하다는 심방을 불러 밤새껏 굿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굿을 하는 중에도, 서울로 올라가려 집을 나서면서도 친척들과 남은 식구들에게 “꼭 다시 보게 하겠다”고 몇 번이나 힘주어 말했습니다.
아버지의 말에 다들 맞장구를 쳤고 이런 감기 같은 어머니의 어둠은 유명한 종합병원의 권위 있는 의사를 만나고 오는 것으로, 모든 것이 씻은 듯 해결될 거라 믿어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어머니는 아버지를 따라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아 기억이 되살아나네요. 아버지와 어머니는 북아현동에 집을 두고 있던, 우리 동네에 여동생이 있는 제주도 국회의원 집에서 주무셨다고 했습니다. 저희들과 같은 성씨를 쓰던 국회의원 이었지요. 그리고 그 국회의원의 따님이 병원 안내도 해주셨다고 했고요. 제주도 하고도 서귀포 시골 부모님은 난생처음 서울 길에 그렇게 도움을 받아 무사히 병원에 도착했다고 전화로 상황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으로 올라가셨던 어머니와 아버지는 바로 삼일 후에 내려오셨습니다. 종합 병원에서의 결과는 암담했던 게지요. 수술로도 어떻게 해 볼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시신경이 기능을 못하는 것이라 각막을 이식하는 것과도 무관한 것이라 했습니다. 그렇게 어머니의 서울 행은 끝을 맺었습니다. 너무도 싱겁게 끝나버려 상황을 전하는 아버지에게서는 헛웃음만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내려온 어머니는 오히려 평온한 듯 보였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빛을 잃으신 것처럼 더 이상은 말도 잃으셨습니다. 어머니는 농기구와 농약을 쌓아두는 집 구석 어두컴컴한 창고를 당신의 공간으로 삼으셨습니다. 컴컴한 창고에 가장 구석진 곳, 의자에 하루 종일 앉아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한마디도 하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어떤 날은 한 모금의 물도 마시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당신이 맞닥뜨린 어둠에, 그 상황에 어머니는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그리고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그때 어머니는 쉰 둘, 저는 고등학교 1학년 열일곱 살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비로소 조금씩 철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편에 계속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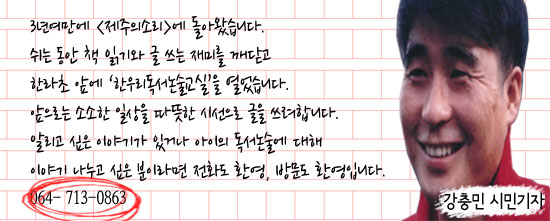 | ||
<제주의소리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