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사람 레코드] (3) 공항 가는 길 / 마이 앤트 메리 (20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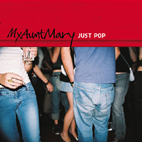
아무리 섬이라도 그렇지 이건 너무했다. 도시 한복판에 공항을 만들어 놓다니. 비행기들이 수시로 드나든다. 그 비행기를 바라보면 제주도에 머물고 있는 게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는 것만 같다. 이호나 외도에서는 비행기의 배를 아주 가까이에서 볼 수 있다. 비행기가 머리 위를 지나가면 자동차 밑에 숨어있는 고양이가 된 기분이다. 세계지도를 펼쳐보면 제주 공항처럼 도시 한가운데에 공항이 있는 곳이 또 있겠지만 공항은 도시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한다. 그래야 다른 어딘가에 대한 생각이 들지 않기 때문이다. 하림의 노래 ‘여기보다 어딘가에’만 들어도 마음이 싱숭생숭한데 공항이 가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심장이 쿵쾅거린다. 도시 외곽에 있는 공항에서 내려 시내로 들어오면서 혹은 국도 지나 있는 공항으로 가는 길에 한 시간 정도는 걸려야 생각도 정리할 게 아닌가. <마이 앤트 메리>의 ‘공항 가는 길’도 들으면서 감상에 젖을 시간을 가져야 하지 않겠나. 하필이면 용담동에 산다. 공항의 불빛이 가로등처럼 반짝거리는 동네. 공항 옆 해안도로를 걷다가 ‘반짝이는 것이 속도라면’이라는 시를 메모하긴 했지만 공항은 역마살을 자극한다. 게다가 어떤 버스는 공항을 경유한다. 분홍색 캐리어를 질질 끌고 가는 여자도 그렇고, 배낭 하나 메고 한 손엔 삼다수 물통을 든 남자도 그렇다. 그냥 따라가고 싶게 만든다. 김동률의 ‘출발’을 흥얼거리면서. ‘아주 멀리까지 가 보고 싶어 …… 얼마나 더 먼 곳을 바라볼 수 있을지 작은 물병 하나, 먼지 낀 카메라, 때 묻은 지도 가방 안에 넣고서 언덕을 넘어 숲길을 헤치고 가벼운 발걸음 닿는 대로 끝없이 이어진 길을 천천히 걸어가네 ……’. 신공항 건설에 대한 말이 계속 나오는 것을 보면 나만 이렇게 제주 공항이 도시 한복판에 있는 것에 대한 불만이 있는 건 아닌 것 같다는 엉뚱한 생각도 하면서. 제주 공항에서 서너 시간만 날아가면 울란바토르라고 하는데, 이건 너무하잖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