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8월5일 혈전용해술 도중 환자 숨져...업무상과실치사 예견 및 회피 입증 한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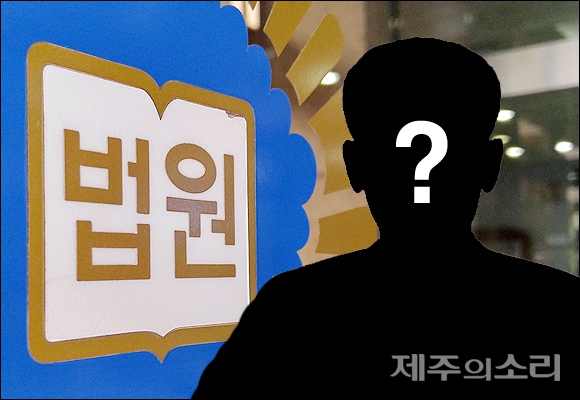
[제주의소리]가 2017년 10월10일 보도한 [제주서 뇌경색 수술 중 사망 의료과실 법정다툼 예고] 기사와 관련해 수술 5년만에 법원이 의료진의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와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시내 모 종합병원 전 신경과 전문의 홍모(56)씨에 9일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은 해당 병원 전 신경외과 전문의 이모(52)씨와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방사선과 전문의 또 다른 이모(50)씨에도 무죄를 각각 선고했다.
논란이 된 수술은 2016년 8월4일 오후 10시30분쯤 A(당시 61세 여성)씨가 해당 병원 응급실에 들어서면서 시작됐다. A씨는 산책도중 뇌경색 증세를 보여 의식이 혼미한 상태였다.
외과 전문의는 CT와 MRI 촬영후 신경과 전문의를 호출했다. 영상판독을 거친 신경과 의료진의 판단은 혈전용해술이었다. 이는 정맥주사를 통해 항응고제를 투여하는 수술 방식이다.
의료진은 환자의 체중을 추정해 곧바로 마취제를 투여했다. 이어 수술 중 움직임을 막기 위해 손과 발을 병상에 묶었다. 자정이 넘은 2016년 8월5일 0시40분 정맥주사가 투여됐다.
문제는 이후다. 의료진은 환자가 과민반응을 보이며 시술 장비를 뽑아내자, 약물을 재투여해 수술을 마쳤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천공이 발생해 방사선 전문의까지 지혈에 나섰다.
A씨는 수술이 끝나고 오전 3시20분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의료진은 출혈이 없다며 이후 퇴근했지만 A씨는 과다출혈 증세를 보이다 이날 오전 7시14분 병원에서 숨졌다.
병원측은 A씨가 질병으로 사망했다는 진단서를 발급했지만 변사사건 보고를 받은 검찰은 고인의 허벅지에서 다량의 피가 흐른 점을 이상하게 여겨 부검에 나섰다.
뇌경색의 경우 허벅지 3~4cm를 절개한 뒤 혈관으로 카테터라는 관을 삽입해 뇌혈관까지 밀어올린 뒤 스텐트라는 의료장비를 넣어 혈관을 확장시킨다.
검찰은 수술과정에서 의료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의료장비를 다루는 방사선사에게 지혈을 맡긴 점도 문제 삼아 의료법 위반 혐의까지 적용해 2017년 9월26일 이들을 불구속기소 했다.
재판과정에서 의료진들은 뇌경색의 긴급성을 고려해 체중을 추정해 약물을 투여했고 수술 과정에서 환자가 시술장비를 손으로 뽑는 등 과민반응을 보였다고 주장했다.
방사선사에게 지혈을 맡긴 행위에 대해서도 당시 방사선사는 의사의 지시에 따랐고 의료법상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지혈에 도움을 준 것 뿐이라고 맞섰다.
장장 5년에 걸친 재판 결과 법원의 판단은 무죄였다. 재판부는 의료관련 기관 4곳의 감정과 부검 결과를 토대로 업무상과실치사에 대한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의료진이 환자에 대한 사망을 예견하거나 사고를 회피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지혈 등 의료행위도 허용된 의료행위 범위에 있다”고 밝혔다.
1시간 가까이 이어진 판결문 낭독이 끝난 후 무죄 선고가 나자, 방청석에 있던 유족들은 재판부를 향해 “너무 억울하다”며 발언권을 요구했다.
유족측은 “5년을 기다렸다. 그사이 아버지까지 돌아가셨다. 수술 직후 의료진은 천공 부위가 생겨 다른 쪽으로 시술을 했다고 했다. 환자의 과민반응은 의료진의 일방적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진이 제출한 진료와 수술기록 만으로 판단을 내리면 병원측에 유리할 수밖에 없다. 사고 후 의료진은 다른 지역으로 병원을 옮기고 지금껏 사과 한마디도 없었다”며 끝내 오열했다.
재판부는 이에 “검찰이 제출한 자료를 통해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 선고를 떠나 고인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피고인들도 환자를 살리지 못한 점에 대한 생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