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세계제주인대회에 부쳐] 전경수 서울대 명예교수, 베트남 유이떤대학 외국어대학장
| 최근 개최된 ‘2021 세계제주인대회’에서 ‘제주아일랜드 디아스포라 포럼’ 온라인 주제발표를 맡았던 전경수 서울대 명예교수가 특별기고를 보내와 싣는다. 평소 고대 탐라사 문화에 각별한 연구와 관심을 기울여온 원로학자가 2021 세계제주인대회와 제60회 탐라문화제 개최를 계기로 탐라민족 비전의 전승을 거듭 당부해왔다. 전경수 교수는 제주도를 연구 대상으로 학술연구단체인 제주학회의 전신인 제주도연구회 6명 발기인 중 한 사람으로 이후 제주학회장을 역임하는 등 탐라사에 대한 활발한 연구활동을 이어왔다. 제주가 외가다. / 편집자 글 |
넓디 넓은 세상에 흩어져 있는 “제주인”의 “세계대회”를 접하면서, 상념에 잠기는 문제는 “濟州”라는 키워드다. 이 섬에 대해서 어떤 종류의 생각을 하든지 간에 관계없이 떠오르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다. 이 섬과 관련된 모든 생각의 출발점에 있는 문제다. 나는 오래 전부터 “濟州”라는 단어사용의 재고를 주장해왔다. 이 주장을 시작한 지가 이십 년도 넘었다. “濟州”라는 글자를 구성하고 있는 한자들을 하나씩 풀어보면, “濟”는 “물 건널 濟”이고, “州”는 “땅 州”이다. 즉 “濟州”를 다시 알기 쉽게 풀어 쓰면, “물 건너 있는 땅”이란 뜻이다. “물 건너 있는 땅”이란 말을 하는 주체가 누구일까? 그리고 그 주체는 어디에 발을 딛고 서 있는 사람일까? 이 섬의 식자들은 쉽사리 알 수 있는 문제다. 초등학생들도 알 수 있는 문제다. 본시 이 섬은 耽羅(또는 탁라)로 인식되었다. 주변의 제국들이 그렇게 인식하고 지칭하였던 역사적 문서와 그림이 존재한다. 중국에서는 양(직공도), 신라(황룡사구층탑), 일본(주방국조세문서)에서 그렇게 인식했던 엄연한 증거들이 있다. 유독 가까이 있었던 백제에서 탐라를 인정했던 흔적은 아직도 찾아볼 수가 없었다. 탐라는 백제의 부용국(附庸國)이었기 때문이다. 고대국가로서의 탐라가 보여준 임계치가 어느 정도 드러난 셈이다. 이러한 사실을 자성사적(自省史的) 관점으로 바라보고 싶다. 백제와의 부용관계 속에서 탐라인들은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었을까? 탐라인 내부의 문제를 투시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고 있는 한국의 지명들 중에서 한자로 된 것들은 대부분 중국에 있는 지명들을 차용한 것들이다. 경주, 상주, 원주, 호남, 영남 등등. 이 모든 것들은 중국의 역사서에 등장하는 중국의 지방 명칭들이다. 그런데, 필자가 세밀하게 조사해 본 결과, 정작 중국 땅에는 “濟州”라는 지명은 없다. 말하자면, 이 명칭은 Made in Korea이다. 그러면, 그것이 그야말로 이 섬에서 만든 독창적인 명칭인가? 그것도 아니다. 서기1105년 탐라가 고려에 복속된 이후에 등장한 명칭이다. 그랬다가, 원(元)이 고려를 침공한 이후, 이 섬에 기동력의 기반인 군마(軍馬) 생산을 위한 목장을 건설하면서 탐라총관부(耽羅摠管府)를 설치하였다. 이 섬에 군마생산을 독려하는 총독부를 설치한 것이다. 요즈음 말로 하면, 전쟁무기를 생산하는 병참기지를 건설한 것이다. 탐라는 원의 군마생산용 식민지로 전락한 것이다. 동시에 원은 고려에 쌍성총관부(雙城摠管府)를 설치하였다. 원에 의해서 고려가 찬탈하였던 “耽羅”의 명칭을 회복한 셈이었다. 아쉽게도 그 명칭회복은 자력으로 획득했던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타력으로 살아가는 방식이 안착하기 시작한 것이다. 덕분에 탐라의 지위가 어느 정도는 고려와 대등한 차원으로 회복되었던 측면도 있었다. 그것도 잠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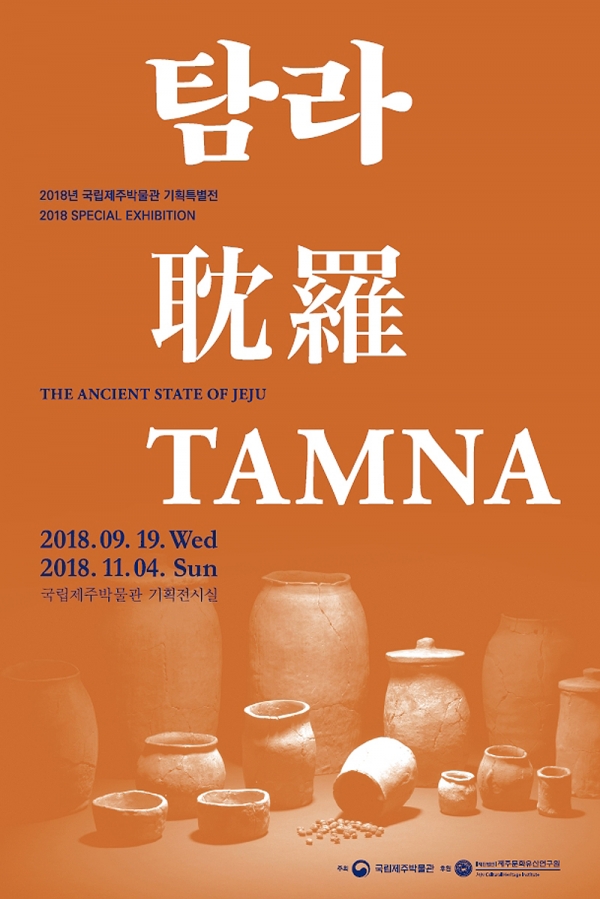
그 기간 동안 이 섬의 원시림(原始林)은 사라지고 초지(草地)가 조성되었던 역사가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 다양한 생명체들의 보금자리였던 원시림이 말이라는 하나의 종을 위한 초지로 변한 것이다. 생물종다양성이 인위적으로 단기간 내에 해체되는 경험을 한 셈이다. 지구생태사상으로도 전례가 없었던 희귀한 사건이다. 생태계가 뒤죽박죽으로 엉망이 되니, 사람의 삶은 어떻게 되었겠는가? 뒤죽박죽된 생태계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살림살이가 겪었던 시련은 상상을 초월한다. 사실상 단기간 내에 원시림을 초지로 만들어내는 과정도 쉬운 일이 아니다. 한라산록 중산간 지대는 불바다로 변한 경험을 한 것이다. 거대한 화염이 원시림의 생명을 송두리째 앗아갔던 것이다. 미생물 덕분에 영양 좋은 물을 품고 있던 원시림이 초지로 변하면서 이 섬의 중산간지대는 말라 버릴 수밖에 없었다. 지금 곶자왈이라도 살아남은 과정을 역추적해보면 해답은 분명하다. 꿀이 흐르던 하천이 건천(乾川)으로 변한 것이 이때부터라는 점을 화산계의 지질과 수맥관계 연구자들은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생태계의 기반이 변하면, 사회조직도 변하게 마련이다. 남정네들은 노동력동원에 의해서 산으로 징발되었을 것이고, 결과적으로 살림살이는 여성들이 도맡아 하게 되는 특수한 방식이 만들어졌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 결과의 유산은 지금도 부분적으로는 진행형의 모습으로 남아 있음을 부정하지는 못한다. 생태학적으로 따져보면, 원시림이 사라졌다는 것이 탐라멸망과 동의어로 받아들여져도 무방하다. 왜냐하면 자생력으로 살림살이를 일구어가는 기반인 원시림을 잃었기 때문에, 쉽사리 타방의 지배를 받게 되는 방식이 안착하는 것이다. 원시림이 제공했던 생산력의 기반으로 국제적 브랜드였던 “탐라복(耽羅鰒)”이 자취를 감추었던 생태사(生態史)가 증언하고도 남음이 있다. 탐라복은 원시림이 내려준 혜택이자 보물이었던 것이다. 탐라복은 그렇게 해서 사라지고 말았다. 참으로 안타까운 타자지배(他者支配) 천년의 생태사가 이 섬에 안착한 것이다.
원의 세력이 패퇴 되고 난 뒤, 고려는 다시 “耽羅”를 “濟州”로 개명하였다. 이름이란 이렇게 중요한 것이다. 한 지역과 집단의 아이덴티티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작명에 심혈을 기울인다. 제국주의 시대에 다른 곳을 점령하였던 유럽인들은 반드시 점령지에 자신들이 이식한 본국의 지명을 덧씌웠다. 그 다음에 서서히 점령지 주민들의 아이덴티티를 갉아 내는 정책들을 사용하였다. 지금도 아프리카나 남북아메리카에 “콜로니” 또는 “꼴로니아”라는 지명들이 남아 있다. 그것이 점령지 또는 식민지라는 의미인 것이다. 이 섬에 “濟州”라는 이름을 지어준 사람들은 이 섬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 그럴 수가 없다. 그 이름은 이 섬을 점령한 사람들이 만든 이름이다. 그 이름은 철저하게 타자화된 식민주의적 이름이다. 이 섬에 있는 사람이 “나는 제주사람이네”라고 하는 표현을 풀어보면, “나는 식민지 사람이네”라는 뜻이다. “물 건너 있는 우리 땅”이라는 뜻으로 사용되는 “濟州”는 육지에서 이 섬을 바라보고, 불러진 배를 느긋하게 두드리면서 부르는 이름이다. “에헴, 저 섬은 우리의 식민지야”라는 뜻이다. 한마디로, “濟州”란 지명을 의미론(semiotics)으로 풀어보면, 그것은 “식민지(植民地)”란 뜻의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전경수 2010 참조). 지명에서 보듯이 “濟州”란 지명에는 식민지적 삶의 방식이 철저하게 녹아들어 있는 것이다. 이 섬에 살고 있는 사람들 자신들도 의식하지 못할 정도로 처절하게 뿌리를 박고 있는 것이다. 식민지적 근성과 생활양식의 완판을 보는 느낌이다.
“濟州”란 명칭이 이 섬을 지칭하기 위해서 사용된 지 이제 700년이 넘었다. 13세기부터 21세기까지 사용되고 있는 이 명칭의 내력에 대해서는 충분히 전달되었다고 생각한다. 그 이전에 사용되었던 명칭은 “耽羅”였다. 이 섬 사람들이 스스로 호칭하였던 단어가 있었을 것이다. 그것을 한자화한 것이 탐라임은 분명하다. 그 정확한 발음을 듣고 싶은 것이 나의 소망이다. 인류학자들이 만났던 세상사람들은 모두 스스로를 호칭하는 단어를 갖고 있다. 아메리카 인디언의 하나인 “샤이안”(Cheyenne)은 사람이라는 뜻이다. 알라스카와 카나다 북부에 살고 있는 “이누잇”(Inuit, 에스키모라는 멸칭은 외부인들이 붙인 것)도 사람이라는 뜻이다. 이 섬 사람들이 스스로를 호칭하였던 단어가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일본학자들의 문서에는 “도라” 또는 “다무라”라고 기록된 경우도 있다. “도라”와 “다무라” 그리고 “탐라”, 셋 사이의 어느 정도에 위치할 수 있는 발음이 나오는 그 단어도 사람이라는 뜻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분명 그 단어를 구성하는 모음의 발음에는 아래 “아”를 포함할 것이다. 나는 그것을 탐라어의 핵심이라고 생각한다. 탐라어를 회복하고 싶은 것이 나의 소망이다. 나는 이러한 과정들을 종합적으로 간략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 섬의 역사를 “耽羅千年, 濟州千年”이라고 말한다. 전자의 천년과 후자의 천년은 기본적으로 다른 발상에서 제작된 단어들이다. 이제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면서, 지난 천년(대략 말하자면)의 타자화된 식민지 의미의 “濟州”를 역사서의 전유물로 봉납(奉納)할 때가 되었다. 탐라는 동아시아 판도라는 맥락에서 사용되었던 명칭이고, 제주는 한반도에 갇힌 상태의 명칭임은 분명해졌다. 전자는 개방의 의미를 지향하고, 후자는 폐쇄의 의미를 담고 있다. 출육금지라는 헤게모니 기획이 실시될 정도로 질곡적 식민통치의 역사가 이 섬에 안착하였던 결과의 하나가 “공쟁이”라는 유산이라고 생각한다. 이 세상에서 근대적인 식민통치의 역사가 가장 긴 카리브해의 섬사람들에 대하여 인류학자 피터 윌슨(Peter J. Wilson)이 만든 단어에 해희(crab antics, 蟹戱)라는 말이 있다(Wilson 1973). 내가 그 단어를 “해희”라고 번역하였다. 바닷가 모래사장의 게들이 서로 공격하는 방식의 모습을 말한다. 윌슨의 책에는 백인들이 지배하는 식민지 생활에서 길들여진 습성이라는 설명이 붙어 있다. 게들은 뒤집어지면 이동할 수가 없다. 몸이 뒤집어진 게는 외부 포식자의 손쉬운 먹잇감이 된다. 게들이 서로 뒤집기하는 모습을 표현한 단어가 해희이다. 이 섬에서 흔히 쓰는 단어로 번역하면 공쟁이일 것이다. 내부총질이라는 의미와 다름 없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모두 함께 자멸하게 된다. 외부인들은 ‘손도 안대고 코를 풀게’ 되는 것이다.

전자의 “耽羅千年”에 등장했던 주인공들 중의 대표적인 인물들이 “삼신인(三神人)”과 일본측으로부터 혼입(婚入)해온 “삼공주(三公主)”들과 그들의 후손들이다. 그들은 탐라에 나라를 건설했고, 그들의 대표적인 국제적 브랜드인 “耽羅鰒”을 수출했던 기록들이 일본 나라의 궁성지에서 출토된 목간(木簡)과 지방사료에 잘 남아 있다. 혼인과 무역에서 보여주듯이 탐라는 탄탄한 국제화의 기반을 갖고 있었던 섬이었다. 역으로 본다면, 국제화가 탐라생존의 기반이었던 것이다. 인류학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허락된다면, 탐라는 수장국(首長國, chiefdom) 수준이었던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안전하다. 탐라를 둘러싸고 있었던 국제정세와 탐라의 정치경제적 능력을 결합해서 생각해면, 탐라는 당시의 고대국가 수준으로 발돋움함에 실패했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그러한 저간의 과정으로 인한 결과가 고려의 탐라점령으로 귀착되었던 사실(史實)이 있다. 고려가 지워버린 명칭인 탐라를 복권(復權)시키는 것이 이 섬 사람들의 역사적 지상과제임을 명심해야 한다.
미래천년과 탐라가 결합된 생각을 하면서, 나는 “耽羅民族”이라는 단어를 만들었다. 고대국가로의 격상희망이 실패한 가장 큰 이유는 물질적인 경제력뿐만이 아니라 내부결속을 위한 정신력이었다고 생각한다. 내가 지금 그것을 증명할 자료를 구할 길은 없다. 어느 누구도 그러한 자료를 찾아볼 생각을 해본 적도 없다. 그러나 나의 졸견을 반대할 수 있는 자료도 아직까지는 없다. 고대국가가 결성된 곳에서는 반드시 정치적 중심세력이 굳건하게 존재하였다. 그 세력의 상징을 나는 “民族”이라고 말한다. 이러한 생각은 근대국가의 형성과정에 대한 학습으로부터의 가설이기도 하다. 정치역학적으로는 부족(tribe) 또는 부족연맹 정도의 탐라였고, 그것의 힘을 키워서 민족으로 승화하지 못했던 것이 고대국가 탐라의 실패였다고 생각한다. 베네딕트 앤더슨(Anderson 1983)의 말대로 “민족”이란 일종의 상상공동체(imagined community), 즉 본래부터 있었던 또는 혈연적으로 만들어진 공동체 수준이 아니라, 그러한 차원을 넘어선 사회적으로 구성된 공동체이다. 이 개념은 시간적 차원을 넘어서 탐라의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 고전적인 개념으로서의 “民族”이 수직적인 혈연과 친척을 기반으로 형성된 집단의 팽창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라면(즉 씨족과 부족을 기반으로 한 집단을 말함), 앤더슨이 주장하는 상상공동체로서의 민족은 “끈끈한 수평적 동지애”(a deep horizontal comradeship)로부터 창발되는 것이다. 그것은 구성원들의 끊임없는 자기희생으로부터 달성가능한 정신력을 요구하고 있다. 부족 수준의 탐라가 고대국가로 발돋움하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끈끈한 수평적 동지애”의 결여로부터 찾아야 할 것이다. 내부암투가 아니라 내부결속을 말한다. 백제와의 정치적 부용관계 속에서 작동했던 것이 탐라내부의 암투와 결속 둘 중의 하나임은 명백하다.
인간관계 속에서 수직적 친척관계의 수준만이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는 “濟州”는 결코 “耽羅民族”의 수준으로 도약할 수 없다. 탐라민족을 주체로 한 해상국가 탐라는 불가능한 프로젝트인가? 한라산을 중심으로 동중국해와 일본쪽으로 연장되는 탐라민족의 실질적인 세계화는 불가능한 것인가? “무슨 당, 무슨 당해도, 괸당이 제일이여”라는 정신으로는 결코 민족의 수준으로 도약할 수 없다. 대외관계라는 차원에서 본다면, 괸당정신이 보여주는 역동성은 제도화된 내부암투의 또 다른 표현이기도 하다. 정치의 계절이 다가왔다. 친척관계 수준의 괸당정신을 수평적 동지애의 수준으로 승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 노력은 끊임없는 수평적인 자기희생의 정신에서 출발한다는 앤더슨 박사의 조언에 귀를 기울이게 된다. 그렇지 않으면, 승자 없는 패자만 남게 된다. 한반도의 식민지라는 질곡적 의미의 “濟州”로는 스스로의 아이덴티티가 확고한 이 섬의 삶이 생성될 수 없다. “濟州”에 몰입하는 정치지도자라는 사람들에게 이 섬의 미래를 맡길 수가 없다. 천년 전 탐라멸망의 과정을 되풀이할 수는 없다. 겉으로 드러난 내부암투의 ‘공쟁이’가 난무하는 정치판도는 이 섬의 희망적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
“탐라민족”은 이 섬의 원풍경인 원시림 회복을 바란다. 그래서 외부인들을 포함한 모두에게 행복한 살림살이를 약속하는 탐라복이 돌아오기를 고대한다. 탐라복은 이 섬에 약속된

복을 안겨준 기억과 경험의 부활을 기다린다. “탐라민족”을 향한 거대한 비전이 절실하다. 탐라시대로 돌아갈 수는 없다. 돌아가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물리학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 섬에서 잘 살기 위한 방향은 분명하다. 절체절명의 목표도 분명하다. 목표와 방향이 분명하기 때문에, “탐라민족”에 비전을 잇자고 제안하는 것이다. 미래 천년을 바라보는 탐라민족으로의 승화를 위한 동력엔진이 수평적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절실하다. / 전경수 서울대 명예교수, 베트남 유이떤대학 외국어대학장
* 참고문헌
전경수 2010 탐라.제주의 문화인류학. 민속원.
Anderson, Benedict 1983 Imagined Communities: Reflections on the Origin and Spread of Nationalism . Verso.
Wilson, Peter 1973 Crab Antics: The Social Anthropology of English-Speaking Negro Societies of the Caribbean. Yale University Pres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