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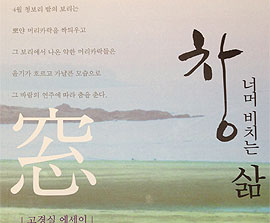
고경실 제주도 부이사관(57)이 첫 수필집 <창 너머 비치는 삶>을 발간했다.
고 부이사관은 지난 2011년 <수필시대> 9·10월호에 ‘바람의 교향곡’으로 등단했다. 이번에 내놓은 첫 수필집은 2년 간 써온 글 52편을 묶은 것이다. 등단 후 그가 얼마나 부지런히 글쓰기에 매달려왔는지 짐작케 한다.

1부 ‘생명줄이 되어 온 터전’, 2부 ‘영혼의 꽃비’, 3부 ‘인연의 숲’, 4부 ‘삶의 여백’ 등 수필이라는 창틀을 두고 자기 자신과 바깥세상을 들여다봤다. <창 너머 비치는 삶>이란 이름이 붙은 것도 이 때문이다.
지난 2010년 기획재정부에 파견된 그는 현재 타향살이 중이다. 그래서일까. 고향 제주를 돌아보는 마음이 한껏 절절해졌다. 이러한 그리움은 ‘한라산 윗세오름 사랑’을 통해 여실히 드러난다.
그는 직장 생활이 어려울 때마다 새벽부터 한라산에 올랐다고 했다. “가을에 주는 아름다운 단풍 그리고 겨울날의 아늑한 모습, 나는 패션쇼를 하는 여인의 모습을 보는 느낌으로 한라산 사랑을 하고 있다”는 그는 “한라에서 부는 바람은 잘 왔다고... 그리고 모두를 내 몸처럼 사랑하면 다 풀린다고 속삭인다”고 털어놓는다.
공직에 몸담아 오길 수십 년, 수필집 군데군데 나랏일 하는 이의 마음가짐이 드러난다. ‘누워 있는 자들의 눈물’에서는 행정구역 내에 살고 있는 거동 불능자들을 찾아다니며 주민증을 발급하는 내용을 그리고 있다. 자식들의 버림 받고 사는 노인들의 서러움을 맞닥뜨리며 제 자신을 굽어 살피기도 했다.

그의 나이 올해로 쉰일곱. ‘사랑하는 가족’에서는 정년을 앞둔 그의 심정과 지극한 가족 사랑이 교차를 이룬다. “이제 나의 인생이 석양이 비치는 시기에 이르렀다. 흔히들 말하는 무대 뒤로 퇴장할 준비를 해야 한다는 스텝들의 눈짓이다. 이제는 내려가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다 보니 자꾸만 쓸쓸할 것 같은 것이 아닌가. 그런데 아니다. 가족에 의한 사랑이라는 울타리가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장미 넝쿨을 올려서 크고 아름다운 꽃을 피우면 되겠지”라고 표현한다.
수필집 말미에 그가 등단하던 때 작품을 추천했던 성기조 시인이 평설이 붙었다.
성 시인은 그의 수필을 가리켜 “원숙한 성품을 가진 사람은 유약한 듯 보이지만 속마음은 단단하다. 좋은 글은 아름답고 읽기 편하지만 반드시 뜻은 강하기 마련이다. 고경실의 수필을 읽으면서 느껴지는 감정”이라고 소개한다.
또한 그는 “공직에서 훈련된 균형 잡힌 감각은 글감을 고를 줄 알고, 표현에 대해서도 적절성을 유지한다. 흐르는 물처럼 문장을 써내려가지만 지나침과 모자람이 없다. 항상 긍정적인 생각과 세상을 보는 눈이 빠르기 때문에 만족한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글 속에서도 느껴진다”며 감상을 보탰다.
제주대 법정대학원, 경상대학 박사과정을 수료한 고 부이사관은 제주시 부시장을 역임했다.
문예운동사. 1만5000원. <제주의소리>
<김태연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