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OK世通, 제주 읽기] (126) 데이비드 볼리어 저, 배수현 역, 《공유인으로 사고하라》, 갈무리,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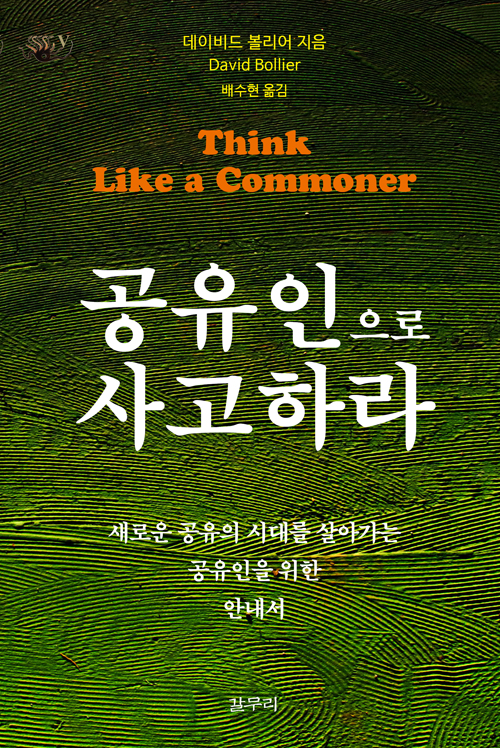
강원도 평창의 산촌에서 태어나 유년기를 보낸 필자는 스스로 팽이를 만들겠다는 야심찬 계획의 첫 단계로 뒷산에 가서 어린 소나무를 베어왔다가, 아버지로부터 꾸지람을 들었다. 앞으로 한참을 자랄 소나무를 기껏 한 뼘 남짓한 팽이 하나 만들겠다고 잘라버려서 당시 유행했던 삼림녹화 정책의 시대정신에 반하는 행동을 했다는 게 그 이유가 아니었다. 어린 나에게 잔잔한 충격을 준 아버지의 말씀은 ‘남의 산에서 자라는 나무를 함부로 베어서는 안된다’는 것이었다. 남의 산이라! 산에 내 산과 남의 산이라는 구분이 있다니! 산에 주인이 있다는 것이었다. 집에 주인이 있고, 논과 밭에 주인이 있는 것은 알고 있었는데, 산에 주인이 있다는 것은 당시의 나로서는 미처 생각해보지 못한 일이었다.
산은 곧 자연이고 자연에 주인이 있을 수 있다는 게 낯설게만 느껴졌던 필자는 이후 성장 과정에서 수많은 주인들을 만나면서 더욱 큰 낯설음에 적응해야 했다. 학교에도 주인이 있고, 병원에도 주인이 있으며, 심지어 (민자) 도로에도 일정기간 주인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돌이켜보면 산에 주인이 있다는 것이 낯설었던 만큼, 몽골의 대평원을 여행하다가 도심지를 중심으로 땅의 주인들이 쳐 놓은 담장들의 풍경을 보면서, 들판에도 주인이 나타나기 시작한 대륙의 변화를 실감하기도 했다. 이처럼 산과 들과 길과 집들에 주인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우치며 수십 년을 살아오면서도 어린 시절의 그 질문은 내게 여전히 유효하다.
모든 존재가 깃들어 사는 곳에 주인이 따로 있다는 것. 집을 지은이는 집이 주인일 수 있지만, 산과 들을 자신의 것으로 주장할 수 있는 주인이 있다는 것. 누가 언제부터 땅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고, 누가 언제부터 산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지 알지도 못하면서, 이러한 사실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이고 살고 있다. 《공유인으로 사고하라》의 저자 볼리어는 이렇듯 자연을 사유화한 역사로부터 공유재 논쟁을 설명한다. 인클로저(enclosure)는 공유재를 사유재로 전환한 경우를 명쾌하게 보여준다. 그는 15세기 중엽 이후, 영국의 지주들이 그 이전에 방치되었던 땅에 경계를 긋고 사유화함으로서 다수의 농업노동자와 공업노동자를 양산한 인클로저 운동을 상기한다.
땅을 사유화한 역사는 고대 농업생산의 출발과 함께 해온 역사인데, 근대 이후 더욱 구체적이고 맹렬하게 확장하면서 제국주의와 산업주의 흐름을 타고 번져나갔다. 유럽의 제국들은 아프리카와 아메리카, 아시아의 땅에 금을 긋고 빼앗았다. 오늘날 아프리카 나라들의 국경이 직선으로 뻗어있는 것을 보며 얼마나 한심하게 땅에 금을 그어댔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일은 오늘날까지도 이른바 미개척지에 대한 경계선 획정과 사적 소유화 작업으로 지속하고 있다. 도대체 사적 소유란 언제부터 시작되었으며, 어디까지 가능한 것인가? 누군가의 것으로 귀속할 수 있는 재원의 한계는 어디까지 일까?
볼리어의 공유재 논의는 공유재의 가치에 대한 재정의로부터 시작한다. 토지와 물, 식량 등이 어떻게 공유재로서의 가치를 박탈당하고 제국주의의 약탈 대상으로 전락하고, 사유화와 기업화의 길을 걸어왔는지를 보여준다. 그는 또한 사유재산의 이론적 배경을 만들어낸 존 로크의 재산권 이론이 인간 본연의 공유 가치와 어떻게 배치되는지를 보여준다. 인클로저는 근대만의 일이 아니다. 공공 공간과 인프라에 대한 인클로저 또한 지속하고 있다. 지식과 문화의 인클로저는 대학과 연구의 시장화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난다. 우리 모두의 공적인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누군가의 사적인 것으로 접수되는 상황을 뻔히 보면서도 그 시스템의 이용자로서 살아야 하는 현실의 모순은 이제 남의 나라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사회의 내 이야기이다.
사적 소유로 점철된 사유재산의 제국은 디지털 문명을 맞으면서 모종의 전환점을 형성한다. 디지털 공유제의 출현이 그것이다. 소프트웨어를 공유하면서부터 자급과 공유의 가치가 확산하고 있다. 컴퓨터 프로그램 오픈 소스는 신선한 자극을 주었다. 내 것이 아닌 우리 모두의 것이라는 생각은 소수의 상상에서 다수의 상식으로 전환하고 있다. 이제 사회와 시민, 국가 등의 제반 주체들이 공동체 가치를 향하여 진화하고 있다. 시장주의 질서를 넘어서서 현실 경재와 사회에 선한 영향을 미치는 공유재의 힘은 정보와 통신의 비약적인 발전에 따른 사회의 변화를 실감하게 한다.
공유재의 사회적 확산은 저자 데이비드 볼리어(DAVID BOLLIER, 1955~)의 활동 이력에서도잘 나타난다. 그는 정책 전략가이자 운동가로서 저술활동으로서 다수의 공유재 관련 저서를 펴냈다. 또한 전 세계의 공유(재) 운동을 지원하는 국제 컨설팅 프로젝트인 <공유(재) 전략 그룹(COMMONS STRATEGIES GROUP)> 창립, 미국 워싱턴 소재 운동 단체 〈공공지식〉(PUBLIC KNOWLEDGE)을 공동 창립 등 운동가로서 활동해왔으며, 베를린 공공정책 상(BERLIN PRIZE IN PUBLIC POLICY)을 받기도 했다. 그의 활동은 전 세계 도처에서 경제적 실효를 발휘하는 대안적인 경제운동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공유재(commons)라는 말은 공통의 땅에서 왔다. 여럿이 축산 가축이나 장작 수집과 같은 특정 전통적 권리를 공유하는 땅을 커먼랜드(common land)라고 불러왔다. ‘공통의(common)’라는 말에 들어있는 ‘com-’은 의사소통(communication), 회사(company), 공동체(community), 공산주의(communism) 등 공통의 것을 뜻하는 말들에 두루 쓰인다. 이 콤(com-)이라는 말에는 함께 만들어서 함께 나눈다는 뜻이 들어있다. 원시공동체 사회의 생산과 분배 방식은 말 그대로 공동체 기반의 것이어서 함께 만들어서 공평하게 나눠가지는 것이었다. 따라서 공통의 것으로 존재하는 다수의 것이 존재했고 그것을 공유의 개념으로 지속해왔다.
영어 어원 ‘com-’은 두 가지 뜻을 같은 말에 담고 있지만, 한자는 그것을 두 개로 나눈다. 하나는 ‘함께 하다’라는 뜻이고 다른 하나는 ‘골고루 나누다’는 뜻이다. 한자 발음 ‘공’을 공유하고 있는 두 개의 공이 있다. 하나는 ‘共’이고 다른 하나는 ‘公’이다. 전자는 물건을 공손하게 들고 가는 모양을 담아 ‘함께 한다’라는 뜻을 담고 있으며, 후자는 물건을 고르게 나눈다는 ‘공평하다’의 뜻을 가지고 있다. 반면에 사유의 사(私)는 ‘벼(禾)를 가진다(厶)’는 독점의 뜻을 담고, 유(有)는 값비싼 고기(肉)를 손에 쥔 모습(又)으로 ‘소유하다’는 뜻을 담고 있다. 이렇듯 ‘공공’이라는 말과 ‘공유’와 ‘사유’라는 말에는 생산과 분배 방식에 따른 인류 문명의 오랜 역사가 담겨있다.
공유재(共有, commons)나 공유인(共有人, commoner)에 들어있는 ‘공유(共有)’는 두 사람 이상이 한 물건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 같은 말처럼 보이지만, 공유(公有)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를 뜻한다. 물론 사유(私有)는 개인이나 이익단체의 소유이다. 공유(共有)의 반의어는 독점(獨占)이나 전유(専有)이며, 공유(公有)의 반의어는 사유(私有)이다. 이런 점에서 오늘날 공공성을 독점하다시피 한 국가의 공공(公共)을 넘어서는 공유(共有) 개념과 그 가치, 제도의 확산은 뚜렷하게 대안적이다. 불과 몇 십 년 전에 출발한 마이카(my car) 시대를 넘어 공유차 개념이 확산하고 있는 걸 보면, 소유 관계를 둘러싼 사회체제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빨리 변화할 수도 있다.
농경문화의 정착과 확산 이래 수천 년간 이어온 공유와 독점·사유의 대결 구도에 새로운 국면을 보여주고 있다. 사적 소유의 제도적 안정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자본주의 경제 체제와 그것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는 국가의 공유(公有)를 시민사회의 공유(共有)와 연결하여 사회체제를 재구조화기 위한 반성과 성찰을 시작할 시점이다. 비록 그 전망을 낙관하기에는 아직 신자유주의의 인클로저가 막강하게 자리 잡고 있지만, 공유의 가치가 근대에 대한 성찰과 시장에 대한 반성으로 확장하고 있음은 분명해 보인다. 공유재는 시장경제 일변도의 자본주의 사회를 견제하고 대체하려는 힘을 가지고 있다. 신자유주의 질서를 넘어서기 위한 대안으로도 공유재 논쟁은 가능성이 크다. 그것은 정신적 가치의 차원을 넘어서서 법과 제도, 사회적 실천의 차원으로 확산하고 있다.
 ▷ 김준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