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OK世通, 제주 읽기] (227) 여사면, 중국문화사–고대 중국문화 설명서, 학고방,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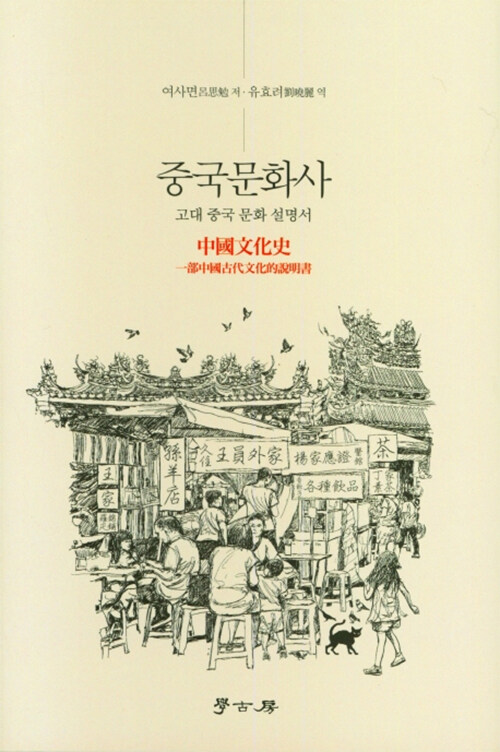
역사는 믿을 만한가?
언젠가 이런 생각을 했다. 통사든 단대사든 이른바 ‘역사 기술記述’이 가능한가? 다시 말해 그것이 진짜 과거의 기록으로 믿을 만한가라는 의문이거나 또는 우문이었다. 이런 의문이나 우문은 진지했지만 그 답은 오히려 싱거웠다. 사람이 쓴 역사란 과거의 모든 것을 담는 것도 아니고, 그럴 수도 없으며, 그럴 필요도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 역사는 과거의 모든 것이 아닌 일부이며, 사가史家의 의도나 편의, 그리고 나름의 관점에 따라 서술한 과거에 대한 ‘이야기’일 따름이다. ‘이야기’이니 당연히 뻥도 들어가고, 심지어 심한 왜곡이 존재하기도 한다. 그런 까닭에 역사를 읽으면 재미는 있지만 자꾸 의심이 들고, 그럴듯하긴 한데 뭔가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를 사실로 믿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것이 과거를 알 수 있는 유일한 창구였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중국인들은 사서史書를 유가 경전의 반열에 올려놓았고, 유학을 신봉한 조선인들 또한 열심히 배우고 익혔는데, 이른바 십삼경十三經 가운데 『서경書經』,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 『춘추곡량전穀梁傳, 『춘추공양전公羊傳』 등은 경전이기 이전에 사서였다.
근현대에 고고학이란 새로운 학문이 등장하여 본격적인 고고학적 발굴이 이루어지면서 사서가 유일한 과거를 들어다보는 창구라는 오랜 관념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사서의 진실이 거짓일 수도 있다는 의심이 짙어짐과 동시에 사서에 대한 믿음이 오히려 확고해지기도 했다. 예컨대 우리가 일반적으로 『도덕경』이라고 부르는 노자老子의 책은 「도경道經」이 앞에 있고, 「덕경德經」이 그 뒤를 잇고 있다. 그런데 1973년 호남성 장사長沙 마왕퇴馬王堆에 한나라 분묘에서 튀어나온 비단에 적힌 노자의 책(백서帛書)은 「덕경」이 먼저이고 다음이 「도경」이었다. 그저 도가의 도리를 강조하는 형이상학적인 사상서인줄만 알았는데, 통치론 위주의 실용서 역할도 했음을 인지하는 순간이었다.
물론 반대로 의심쩍던 역사기록이 사실로 확인되는 경우도 있었다. 대표적인 것이 갑골문이 대량으로 발견된 은허殷墟 발굴이다. 1899년 왕의영王懿榮이 한약재인 용골龍骨을 사왔다가 그 안에 적힌 몇 개의 글자(갑골문)를 발견했을 때만해도 향후 얼마나 거대한 일이 전개될지 전혀 눈치 채지 못했을 것이나, 그것을 시작으로 은허가 발굴되고, 존재 여부에 대해 긴가민가하던 은나라가 실제 존재했음이 확인되었으며, 이후 하나라의 존재에 대한 확신까지 가져다주었다. 이렇게 해서 나온 것이 이른바 하, 상, 주나라의 연대를 확정하는 프로젝트인 「하상주단대공정夏商周斷代工程」(1996~2000년)이다.
중국학자 갈조광葛兆光은 이렇게 말했다. “땅에서 나온 유물로 인해 중국사상사를 완전히 새롭게 써야할지 모른다.” 그리고 몇 년의 세월이 흐른 후 그가 책을 보내왔고, 다시 몇 년이 흐른 2013년 그의 『중국사상사』(1,2권)가 한국에서 번역 출간되었다.
‘문화’사는 가능한가?
역사 기록에 대한 믿음이 흔들린다면, ‘사’가 붙은 모든 저술에 대한 믿음도 따라 요동칠 수밖에 없다. 특히 ‘문화사’는 더욱 더 그러하다. 문화에 대한 정의조차 중구난방인지라 딱히 몇 마디로 단정 짓기 어려운 마당에서 ‘사’까지 붙으니 어찌 어렵지 않겠는가? 문화의 사전적 정의에 따르면, “인류가 생활양식의 과정 및 그 과정에서 이룩해 낸 물질적, 정신적 소산을 통틀어 이르는 말로 의식주를 비롯하여 언어, 풍습, 도덕, 종교, 학문, 예술 및 각종 제도 따위를 모두 포함한다.”(국어사전) 그렇다면 과연 수천 년의 역사와 방대한 지역,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온 중국문화를 몇 권의 책으로 정리할 수 있을까? 과연 그것이 중국문화라고 단정할 수 있을까? 그래서 중국문화에 관해 쓴 책들을 보면, 무슨 ‘개론’이나 ‘총론’, ‘이해’, ‘강의’ 등의 말이 붙어 있거나 오늘 소개할 책, 여사면(呂思勉뤼쓰몐, 1884~1957년) 중국문화사처럼 「고대 중국문화 설명서(一部中國古代文化的說明書)」라는 부제가 붙어 있기 마련이다. 부제에서 ‘일부一部’는 한 권의 책을 뜻하는 수량사數量詞이지만 필자는 자꾸만 ‘일부분’이란 뜻으로 읽힌다. 역시 ‘사’에 대한 생각 때문이다.
그러나 중국문화사를 개략적으로 살펴보는 것은 가능하다. 특히 여사면의 책은 전혀 문제가 있거나 아쉬움이 남지 않는다. 이는 그가 이미 『중국통사』, 『백화본국사白話本國史』, 『중국사회사』를 비롯한 통사와 『선진사先秦史』, 『진한사秦漢史』, 『양진남북조사』, 『수당오대사』, 『중국근대사8종』등을 저술한 바 있는 중국현대사학계의 태두이자 진인각陳寅恪(1890~1969), 진원陳垣(1880~1971), 전목錢穆(1895~1990) 등과 더불어 중국의 4대 역사학자로 손꼽히는 인물이기 때문이다. 전목은 여사면이 상주부중학당常州府中學堂에서 역사와 지리를 가르칠 때 제자였다. 그는 평생 강소성의 상주常州와 소주蘇州 일대에 거하면서 교육과 저술로 생을 마쳤는데, 역사 외에도 문학, 문자학, 민족학, 사회학, 경학, 정치학 등에 관한 전문서적을 포함하여 전체 18종 25책을 저술했다. 게다가 그는 양계초梁啓超가 주창한 ‘사계혁명史界革命’에 동조하여 당시 ‘핫’했던 진화론적 역사관을 받아들여 이른바 중국 신사학新史學의 선하를 이루었고, 고답한 전통 역사관념에서 벗어나 근대 학문인 사회학을 접목시켰으며, 고향인 무진武進(지금의 상주)의 학문 전통에 따라 금문학파今文學派에 속하면서도 고문학파의 의견을 무시하지 않았고, 무엇보다 문언이 아닌 백화白話(구어체)로 저술하여 교육을 위한 저술 목적에 부합하고자 노력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번역된 여사면의 책은 본서를 제외하고 2012년 출간된 『삼국지를 읽다(三國史話)』(정병윤 역, 유유출판사)가 유일하다. 이런 점에서 만시지탄晩時之歎이긴 하나 참으로 다행스럽다.
기존의 중국문화사는 일반적으로 주제별, 연대별로 서술된 것이 대부분인데, 본서는 제1장 혼인제도부터 시작하여, 친족제도, 정치제도, 계층, 재산제도, 관직제도, 선거제도, 부세제도, 군사제도, 형법, 실업, 화폐, 음식과 복식, 주거생활과 교통의 발전, 교육, 언어와 문자, 학술, 종교 등 전체 18장으로 구분하여 연대별로 설명하고 있다. 주제와 연대별 서술방식을 섞은 셈이다.
여사면 『중국문화사』의 특징
책을 읽다보면, 저자의 의문 제기와 나름의 답변이 자주 눈에 띤다. 단순히 소개나 설명의 글이 아니라 저자의 견해, 의론이 반영되어 있다는 뜻이다. 장점은 여기저기서 베끼고 모은 이른바 동초서주東抄西凑가 아니라 일관된 자신의 문화사관에 따라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는 것이고, 단점은 시대와 지역이 달라짐에 따라 굳이 필요 없는 이야기도 존재한다는 것이다. 다행 한 두 가지 불필요한 이야기는 역서에서 주석으로 처리되어 있다. 장점으로 몇 가지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대대례기大戴禮記』는 “남자는 서른 살, 여자는 스무 살에 결혼하는 것은 천자나 서인이나 다를 것이 없다.”고 했지만 『좌전』은 “천자는 열다섯 살에 자식을 낳는다. 남자가 서른 살에 장가가는 것은 서인의 예이다.”라고 했다.(48쪽, 제1장 혼인제도) 이에 대해 그는 이렇게 묻는다. “인간의 생리는 예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는데, 상고사회에서 혼인 욕구가 가장 절실한 청년시절을 넘어 서른 살, 쉰 살까지 혼인 적령기를 미루는 까닭은 무엇이었을까?”(48쪽)
이에 대해 그는 생리적인 욕망을 억누르는 것보다 충족시키는 것이 좋기는 하지만 사회는 결혼한 부부에 대해 경제적인 독립을 요구하기 때문에 십대 남녀가 이행하기 어려우며, 자식의 양육과 교육도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결혼 적령기를 늦출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여기까지는 누구나 말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런데 그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간다.
“하지만 지나치게 억눌린 성적 욕망은 개인이나 사회에 모두 좋지 않은 영향을 가져온다. 이것은 사회제도와 인간의 본성이 불일치한 부분이라 하겠다. 만약 경제적인 독립과 아이의 양육 문제를 양성 관계에서 분리시키면 이러한 문제들도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현재로서는 산아제한, 아동 공교육의 실시, 만혼자와 독신주의자의 혼인 성사 등에서 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50~51쪽) 산아제한이나 아동의 공교육 실시는 참으로 ‘모던’하다.
또한 기존의 사학자들이 주장하는 내용에 대한 반박과 교정도 눈에 띈다. 예를 들면 봉건제도에 관한 발언이 그러하다. 봉건封建이란 토지를 나누어 주고 나라를 세우게 한다는 뜻인 봉토건국封土建國의 약칭이다. 일반적으로 봉건시대는 서주西周시대의 정치제도로 진시황이 여섯 나라를 통일하여 중앙집권의 군현제郡縣制를 실시하면서 사라졌다고 한다. 하지만 여사면은 굳이 훈고적 해석에 얽매여 분봉이 있어야만 한다고 고집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봉건은 다른 부족을 복종시킨 경우, 다른 부족을 정복하여 자신 쪽 사람을 추장으로 내세운 경우, 자신의 부족 일부를 다른 쪽으로 이주시킨 경우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의 주장에 따른다면, 봉건시대는 서주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며 그 이전에 선先봉건시대가 있었고 이후에 본격적인 봉건시대가 있었으며, 진대 이후 한대의 군국제郡國制는 물론이고, 이후 당, 송대에 식읍을 수여한 경우에만 녹봉을 주면서 물질적 수혜가 없는 껍데기 제도로 전락한 후에도 중국 서남지역의 토관土官(토사土司, 현지 부족 추장) 등에게 작위를 봉하고 토지를 활용하여 먹고 살 수 있도록 한 것(식읍처럼) 역시 봉건의 일종이다. 이렇게 되면 봉건제가 서주에서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왜 청말에 이르기까지 중국 고대사회를 봉건사회라고 부르는 지 이해할 수 있다.
제5장 재산제도에서 그는 ‘소유제의 변화와 경제제도의 변천, 사회개혁, 재산 분배제도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데, 재산분배에 있어 “시대를 막론하고 중국 사회에는 빈부격차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는 균빈부均貧富 사상이 있어 왔다.”고 하면서 “이는 근대에 와서 사회주의 사상이 중국 사람에게 쉽게 받아들여진 이유이기도 하다.”라고 말했다. 중국의 유학이념과 사회주의 이념이 전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그처럼 극적으로 전환될 수 있었는지를 설명하는데 좋은 근거를 제시한 셈이다. 그러나 그는 여기에서 또 다시 한 걸음 더 나아간다. “그런데 균빈부 사상이 지향하는 바는 좋으나, 기존의 학자나 사회 활동가들이 내세운 실시 방안은 늘 미흡하여 문제가 뒤따랐다. 이는 중국 전통 사상으로부터 깊은 영향을 받기는 했지만, 현실에 대한 통찰력은 부족했기 때문으로 보인다.”(209쪽) 사회주의의 균등분배 방식에 대한 비판이 아니겠는가? 아직 중국에서 사회주의 이념이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의 발언이니 더욱 유의미하고, 또한 그의 예지叡智가 빛나는 부분이기도 하다.
학문적 우호관계
이번에 여사면의 『중국문화사』를 소개한 것은 단순히 ‘중국문화사’에 이해와 관심을 유발하기 위함이 아니다.
본 역서는 산동 연대煙臺에 있는 노동魯東 대학 한국어과 유효려劉曉麗 교수가 번역했다. 목포대학에서 한국어학으로 석,박사 학위를 받은 그녀는 한국어 교육 전문가이자 통번역가로 활동하고 있는데, 이번 역서는 중국 정부의 중화학술외역中華學術外譯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중국 국사사회과학기금의 지원을 받아 출간되었다. 사실 중국인으로 중국문화에 어느 정도 이해가 있기는 하나 전공이 한국어인지라 중국 고전문헌이 잔뜩 들어가 있는 여사면의 중국문화사를 번역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게다가 모국어가 아닌 외국어로 번역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결국 지인들의 도움이 있었고, 필자도 마지막 교정 작업에 참가했다. 작업을 하면서 문득 여사면과 그의 조선인 친구들이 생각났다.
여사면은 1920년 조선 신의주를 방문하고 「의주유기義州遊記」(1920년 발표)라는 기행문을 남겼다. 거기에서 조선인 친구 두 사람이 있다고 했는데, 그들 두 사람이 바로 의사義士 추경구秋景球(생졸미상)와 학자 김형택金澤榮(1850~1927)이다. 두 사람은 모두 중국으로 망명하여 생활하면서 우연한 기회에 여사면과 우의友誼를 맺게 된다. 그들을 통해 여사면은 조선에 대해 깊이 이해할 수 있었을 것이고, 그들은 여사면을 통해 중국학자의 진면목을 살필 수 있었을 것이다. 여사면은 기행문에서 이렇게 말했다. “조선이 지금 일본의 강포함에 굴복하고 있으나 백성의 마음은 죽지 않았고, 나라도 반드시 망하지 않을 것이다. 나라를 되찾은 이후에 응당 중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게 될 것이다.” 동병상련同病相憐의 처지에 있던 양국의 학자들이 나누었을 우정이 서로에 대한 믿음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민족과 나라에 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승화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또 한 명의 친구는 유기석柳基石(1905~1980, 호는 노신의 이름인 수인樹人)이다. 그는 부친인 유찬희柳纘熙(1884~1930), 동생 유기문柳基文과 더불어 항일투쟁에 적극 참여한 독립운동가이자 무정부주의자였으며, 1927년 처음으로 노신魯迅의 광인일기를 한국어로 번역하고 이듬해 아큐정전을 번역한 번역가였다. 1945년 상해에서 항일운동에 참여하면서 「중한문화」 편집장을 맡고 있을 때 여사면에게 원고를 청탁하면서 알게 되었다. 당시 여사면이 쓴 글이 「중한문화서中韓文化敍」, 「조선에 가서 문헌을 찾다(到朝鮮去搜書)」이다.
남은 이야기
근년에 들어 한중관계가 영 형편없다. 나라와 나라의 관계, 즉 국제國際라는 것이 아이들의 장난과 같아 한 대 때리면 곧바로 응수하다 서로 쥐어박기를 시작하는데, 그러다가 또 금세 시시덕거리며 손잡고 뛰어다니기도 한다. 영원한 적도, 영원한 우방도 없다는 말이 혹 그런 뜻인지 모르겠다. 서로의 국익에 따라 행동하니 그럴 수도 있겠다. 하지만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니다. 본서를 소개하면서 문득 든 생각이다.
 # 심규호 한국외국어대학교 중국어과 졸업, 동대학원 중문학 박사. 제주국제대 교수, 중국학연구회, 중국문학이론학회 회장 역임. 현 제주중국학회 회장, (사)제주문화포럼 이사장. 저서로 《육조삼가 창작론 연구》, 《도표와 사진으로 보는 중국사》, 《한자로 세상읽기》, 《부운재》(수필집) 등이 있으며, 역서로 《중국사상사》, 《중국문학비평소사》, 《마오쩌둥 평전》, 《덩샤오핑과 그의 시대》, 《개구리》, 《중국문화답사기》, 《중국사강요》, 《완적집》, 《낙타샹즈》 등 70여 권이 있다. shim42start@hanmail.net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