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OK世通, 제주 읽기] (259) 임마누엘 칸트(이한구 역), 영구 평화론, 서광사, 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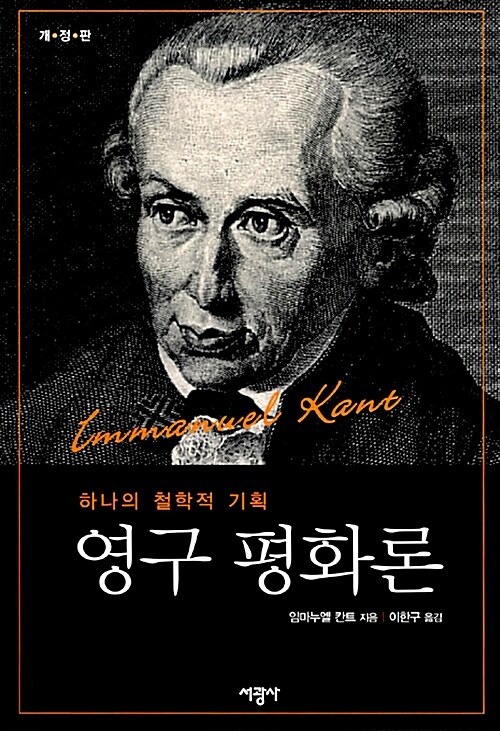
서언
칸트(Immanuel Kant, 1724-1804)는 ‘영구평화론’ ‘서언’에서 다음 두 가지 점을 언급했다. 첫째, 칸트는 네덜란드의 어느 여관집 간판에 그려진 ‘묘지’와 거기에 적힌 ‘영원한 평화를 위하여(Zum ewigen Frieden)’라는 문구를 소개한다. ‘Zum ewigen Frieden’ 문구는 당시 묘지의 비명으로 사용되었기에, 여관 간판에 묘지와 함께 새겨져 있었다. ‘평화’를 고심하던 철학자의 눈에 ‘네덜란드 여관집 간판’이 들어왔고, 이는 자신의 저서 제목이 되었다.
둘째, 칸트는 자신의 ‘평화 기획’이 단순히 이상향을 꿈꾸는 철학자의 허언(虛言)으로 간주되지 않기를 바랐다. 자신과 같은 ‘정치 이론가’가 현학자로 멸시될 수는 있어도, 자신의 이론이 국가에 어떤 해독도 끼치지 않음을 밝히면서, 어떠한 악의에 찬 해석이 개입되지 않기를 바랐다.
예비 조항
칸트는 1796년에 출간한 ‘영구평화론’을 1795년에 체결된 ‘바젤 평화조약’의 형식에 맞춰 ‘예비 조항, 확정 조항, 비밀 조항’으로 구성했다. 칸트는 ‘국가 간의 영구 평화를 위한 예비 조항’에서 6가지 조항을 내세웠다.
1. 장차 전쟁의 화근이 될 수 있는 내용을 암암리에 유보한 채로 맺은 어떠한 평화 조약도 결코 평화 조약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
2. 어떠한 독립 국가도 (크고 작고에 관계없이) 상속, 교환, 매매 혹은 증여에 의해 다른 국가의 소유로 전락할 수 없다.
3. 상비군은 조만간 완전히 폐지되어야 한다.
4. 국가 간의 대외적 분쟁과 관련하여 어떠한 국채도 발행되어서는 안 된다.
5. 어떠한 국가도 다른 국가의 체제와 통치에 폭력으로 간섭해서는 안 된다.
6. 어떠한 국가도 다른 나라와의 전쟁 동안에 상호 신뢰를 불가능하게 할 것이 틀림없는 다음과 같은 적대 행위, 예컨대 암살자나 독살자의 고용, 항복 조약의 파기, 적국에서의 반역 선동 등을 해서는 안 된다.
칸트는 6개 조항을 다시 둘로 나누었다. 칸트의 분류에 따르면, 조항 1, 5, 6은 주위 여건에 관계없이 즉각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엄격한 종류의 조항이다. 조항 2, 3, 4는 그 목적을 잃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시행의 연기가 허용될 수 있다.
확정 조항
칸트는 ‘국가 간의 영구 평화를 위한 확정 조항’에서 3가지 조항을 내세웠다.
1. 모든 국가의 시민적 정치 체제는 공화 정체이어야 한다.
2. 국제법은 자유로운 국가들의 연방 체제에 기초하지 않으면 안 된다.
3. 세계 시민법은 보편적 우호의 조건들에 국한되어야 한다.
첫째, 칸트는 세계의 각 국가가 ‘공화 정체’가 되어야 함을 언급했다. ‘공화 정체’가 ‘공화제가 아닌 체제’에 비해 전쟁을 할지 여부를 결정함에 매우 신중하다는 점을 강점으로 들었다. 공화 정체에 있는 국민은 자신의 신상에 다가올 전쟁의 재앙을 각오해야 하기에, 전쟁의 수행에 쉽게 동의하지 않는다. 반면에 전제국가의 지배자는 보잘것없는 이유로 전쟁을 결정하기도 하고, 외교 부서에 전쟁을 정당화하도록 떠맡기기도 한다.
둘째, 칸트는 ‘평화 연맹’인 ‘국제 연맹’을 제안했다. ‘평화 연맹’은 평화 조약과 구별되는데, 후자는 단지 그때그때의 전쟁을 종식시키는 것이 목적인 반면, 전자는 모든 전쟁의 영원한 종식을 추구한다. 칸트는 ‘세계 정부’를 구상하지 않았다. “이론적으로 옳은 것이 실천에서는 거부된다”는 이유로 ‘세계 공화국’이 아니라 ‘평화 연맹’을 주장했다.
셋째, 칸트는 세계 시민법의 이념이 그 당시로도 더 이상 공상적인 것이 아니라고 봤다. 이때 칸트가 세계 시민법의 내용을 보편적 우호의 조건들에 국한했음에 유의해야 한다. 칸트는 이방인은 영속적인 체류권을 요구할 수 없으며,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것은 일시적인 방문의 권리이고, 교제의 권리라고 말했다. 하지만 칸트는 세계 시민법의 논의가 박애에 관한 것이 아니라 권리에 관한 것임을 명확히 했다.
칸트는 ‘영원한 평화’를 가능하게 하는 ‘체제’를 구상하면서, 공법의 세 단계인 국내법, 국제법, 세계 시민법을 통해 이를 보장하려 했다. 칸트는 세계 시민법의 이념은 더 이상 공상적이거나 과장된 법의 표상 방식이 아니라고 봤다. 그것은 아직 쓰이지 않은, 시민법과 국제법의 발전을 보충해 주고 있으며 공적인 인간의 권리와 영원한 평화의 유지를 위해 필수 불가결한 것임을 설파했다.
전쟁과 평화
‘전쟁과 평화’는 불가분 연결되어 있다. 전쟁이 세계화되면서 평화 또한 세계화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은 인류 역사에 ‘30년 전쟁(1618-1648)’이 유럽에 던진 의미와 비슷한 의미를 던진다.
30년 전쟁 이후 베스트팔렌 조약이 성립되었고, 그 시대를 배경으로 여러 학자들이 ‘평화’를 구상했다. 휴고 그로티우스(Hugo Grotius, 1583-1645)의 ‘전쟁과 평화의 법’이 그랬고, 사무엘 푸펜도르프(Samuel Pufendorf, 1632-1694)의 ‘자연법과 국제법’이 그랬다. 1796년에 발간된 칸트의 ‘영구평화론’은 ‘영원한 평화’를 보장하는 체제(regime)를 구상했다.
30년 전쟁 이후 학자들이 구상했던 내용들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야 현실에서 실현되었다. 헨리 메인(Henry Maine)의 말처럼, “전쟁은 인류만큼 오래된 듯하다. 반면에 평화는 근대의 발명이다.”
‘영구 평화’ 체제를 안착시킬 수 있게 한 것은, 역설적이게도 세계 전쟁이었다. 제1차 세계대전 후 ‘국제 연맹’을 통해서는 실패했다. 2차 세계대전 후 ‘국제연합(UN)’은 순항 중이다. 제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세계 시민법’의 내용은 ‘국제법’에 구체적으로 쓰였다. 꽤 많은 상세한 법규정이 국제법으로 만들어졌고, 현실에서 작동하고 있다. 하지만 국제기구와 국제법을 중심으로 평화의 시대가 계속되리라고 속단할 수 없다.
나가며
칸트의 ‘영구평화론’을 간략하게 정리하면서, 필자는 칸트가 말한 ‘평화 연맹’이 오늘날 작동하기 시작했다는 점에 주목한다. 칸트가 살았던 시대에는 불가능했던, 그래서 이론적으로만 정립할 수 있었던 ‘평화 구상’이 오늘날은 이론에서만큼은 완벽하게 구현되지 않았더라도 상당한 규모로 실현되고 있다.
오늘날에도 전쟁, 내전, 테러가 없지 않고, 분쟁이 끝없이 이어진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주변 국가들과의 분쟁이 끊이지 않는다. 아프리카 여러 국가에서의 내전으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다. 시리아 내전의 참혹한 참상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최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전쟁의 잔혹함과 평화의 간절함을 잘 알려준다.
평화는 결코 이념만으로 도래하는 게 아니다. 국제기구와 국제법, 유엔과 국제재판소, 강대국의 협력, 지구촌 국가의 참여 등이 함께해야 비로소 탄생한다. 전 세계가 ‘지구촌’이라고 할 만큼 연결된 세상에서 우리는 이론이 아닌 현실에서 ‘영구 평화’를 꿈꾸기 시작했다. 물론 그 체제는 여전히 불완전하며, 이를 보완하려는 여러 제도적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칸트가 ‘총론’을 썼다면, ‘각론’은 현대를 사는 우리가 써야 한다.

# 고봉진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고려대 법학과 졸업, 독일 프랑크푸르트대학 법학박사.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법철학/법사회학 전공).
블로그: blog.naver.com/gojuraph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