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OK世通, 제주 읽기] (265) 황임경, 《의료인문학이란 무엇인가》, 동아시아,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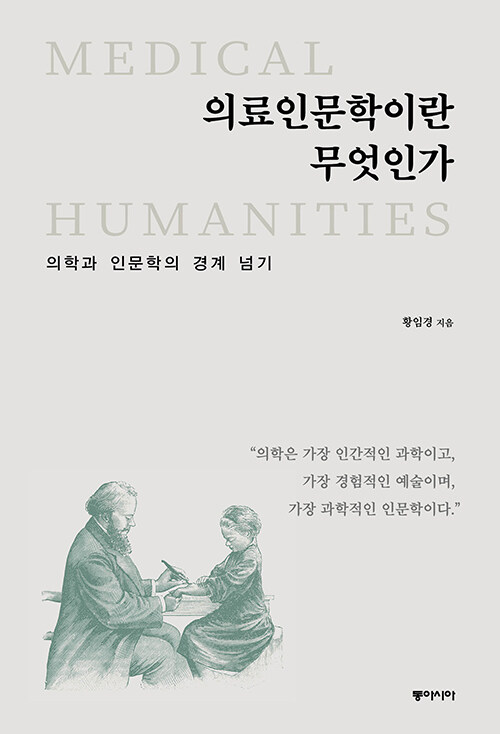
우리의 삶은 생노병사(生老病死)로 요약된다. 아플 때 우리는 병원에 간다. 아플 때만일까? 이제 우리는 병원에서 태어나고, 병원에서 노화를 막거나 감추는 수술을 받기도 하고, 병원에서 장례를 치룬다. 처음 직장을 얻어 사회로 나아가게 될 때도 건강 검진을 받는다. 아플 때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중요한 순간들이 병원에서 벌어진다. 메디컬 드라마가 인기를 얻는 이유가 있었던 것이다. 역동적인 삶의 드라마가 그곳, 병원에서 매일매일 상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병원 밖으로 눈을 돌려 보자. TV나 신문에서 권하는 그대로 건강을 위해 영양제를 챙겨 먹거나, 코로나19 바이러스처럼 전염병이 세상을 극적으로 변화시키기도 한다. 의학은 꼭 병원 안에서만 벌어지는 현상은 아니다. 인간 삶을 다루는 게 인문학이라면, 이렇게 다채로운 의학적 현상이라면 정말로 중요한 인문학적 사유와 궁리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대학교에서도 의과대학과 인문대학이 멀리 떨어져 서로 무관심하게 지내는 걸 보면, 의학과 인문학은 별개의 학문처럼 여겨지는 것 같다. ‘의료인문학’이란 분야는 그만큼 많은 독자들에게 낯설 것이다. 《의료인문학이란 무엇인가》는 제주대 의대에서 의료인문학을 가르치면서 제주대 병원에서 영상의학 전문의로도 일하는 황임경 교수의 노작(勞作)이다. 그는 의료인문학(medical humanities)과 서사의학(narrative medicine) 분야의 대표적인 학자로 이름나 있다. 의료인문학의 연구자와 학생들뿐만 아니라, 나를 포함해 많은 (인)문학 연구자들도 저자의 질병 서사와 서사의학에 관한 논문을 열심히 읽어 왔다.
《의료인문학이란 무엇인가》는 저자가 그동안 연구하고 교육해온 의료인문학의 넓고 깊은 세계를 독자들에게 안내한다. 의학과 인문학 양쪽의 전문적인 독자들에게도, 그리고 의학과 인문학의 “경계 사유(border thinking)”(45쪽)를 궁금해하는 모든 교양 독자들에게도 훌륭한 길잡이가 되어줄 선물 같은 책이다. 이 책에는 의사이자 예비 의사를 기르는 교육자로서, 그리고 문학과 예술, 철학과 역사에 두루 관심을 둔 인문학자로서 저자의 놀랍도록 폭넓고 섬세한 시선이 담겨 있다.
나는 문학평론가로서, 역시 문학과 서사에 대한 내용에 눈이 더 오래 머물렀다. 이를테면, 대학생 시절에 즐겨 읽었던 의사 출신의 시인 허만하의 작품에 대해 다룬 대목이 그렇다. 병리과 의사인 허만하 시인은 강의 도중 뇌출혈로 쓰러진 후 편마비를 겪고 <뇌출혈>이라는 시를 쓴다.
“이 시에는 병리과 의사와 시인의 시선이 중첩되어 있다. ‘은빛 지느러미’나 ‘갈맷빛 물이랑’은 연막pia mater이나 뇌 이랑gyrus 같은 실제 뇌의 표면을 묘사하고 있고, 맥관 속을 달리는 ‘붉은 고깔모자를 쓴 요정들’은 적혈구인 듯하다. 의사들은 CT나 MRI를 통해 뇌출혈의 존재를 파악한다. 아마 시인도 자신의 CT나 MRI 영상을 통해 자신의 뇌출혈을 확인했을 것이다. 하지만 시인에게 영상 속 뇌출혈은 아무도 본 적이 없고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았떤 고대의 바다가 엎질러진 사건으로 체험된다.”
- 274~275쪽
저자의 시 해석은 영상의학 전문의로서의 전문적 지식과 체험이 문학 독자로서의 풍부한 감성과 상상력이 만나 이루어진 결과다. 평범한 문학 독자가 보여줄 수 없는 진귀한 독법이다. 의료인문학에서 “문학은 즉각적인 효과를 보이는 맛 좋은 약은 아니다. 오히려 너무 써서 먹기는 힘들면서 눈에 띄는 효과도 별로 없는 약에 더 까갑다. 그렇지만 그 쓰디쓴 약을 삼킬 때마다 정신이 번쩍 드는 경험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우리는 건강해져 있을 것이다.”(135~136쪽)라고 한 비유 역시 문학의 속성을 놀랍도록 정확하게 파악한 것이다.
의료인문학은 의학적 지식과 성찰, 인문학적 사유와 예술적 시선이 만나 이루어지는 인간학의 광장이다. 의료인문학은 단지 의학에 보조적으로 기여하는 의사들을 위한 인문교양은 아니다. 나는 인문학자로서, 의료인문학이 의학뿐만 아니라 인문사회과학, 나아가 예술과 우리 삶까지 더 풍부하게 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에드먼드 펠리그리노(Edmund D. Pellegrino)는 미국에서 인문학이 의학에 도입되는 데 크게 기여한 의사이자 철학자라고 한다. 저자는 펠리그리노의 말에 한 문장을 더해 이렇게 말한다. “의학은 가장 인간적인 과학이고, 가장 경험적인 예술이며, 가장 과학적인 인문학이다. 또한 가장 실천적인 사회과학이다.”(54쪽) 저자 스스로 성공적으로 증명해 보이는 것처럼, 의료인문학은 의학에 대한 인문학적, 사회과학적 사유이자 예술적이고 윤리적인 ‘실천’인 것이다.
의료인문학에 대한 이렇게 멋지고 우아한 규정 이면에는 사실, 의료인문학의 고투가 숨겨져 있다. 실제로 의료인문학은 현대 의학의 한계에 대한 반성과 비판에서 비롯되었다. 과학적 의료 지식과 기술의 발전 덕분에 수명이 늘어나고 많은 질병이 극복되었다. 하지만 현대 의학은 아픈 사람의 삶 전체에 대한 관심은 없고, 몸 전체가 아닌 특정 환부, 심지어는 인간이 아닌 의학적 데이터에 관심을 갖는다. 몇십 초에 불과한 짧은 진료 시간 동안 의사가 환자와 눈을 맞추지도, 대화를 나누지도 않고, 모니터의 데이터만 주시하는 상황을 겪어 보지 않은 사람은 별로 없다.
환자뿐만 아니라 의사 역시 경쟁적이고, 관료화된 의료 시스템 안에서 소외되기는 마찬가지다. 가장 건강하지 못한 이들이 의사라는 건 그저 우스개 소리가 아니다. 설상가상, 날로 발전해 가는 첨단 의료 기술과 극단으로 치닫는 자본주의는 의료의 상업화와 새로운 생명윤리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다. 과거와 달리 탈모도 병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일상에 알게 모르게 광범위하게 의료화(medicalization)가 진행되고 있다. 자본과 기술이 의학에서 만나 일으키는 이 욕망의 운동들은, 의료인문학이 고민해야 할 문제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의료인문학이란 무엇인가》의 저자는 “의료인문학은 의학의 호르몬”(482쪽)이라고 말한다. 호르몬은 우리 몸에 아주 조금 존재하지만 만약 없다면 신체 기능은 마비되고 말 것이다. 점점 더 복잡해지고 어려워지는 문제들이 발생하는 의료 환경 속에서, 의료인문학은 의학을 올바르고 아름다운 길로 인도해 줄 것이다. 또한 의학과 무관하지 않은, 생노병사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더 행복하게 태어나 늙고 앓고 죽을 수 있도록 지혜를 길러줄 것이다. 이 책은 그 지혜의 여정으로 가는 첫걸음이다.
# 노대원

서강대학교 국어국문학·신문방송학 전공, 동대학원 국문학 박사과정 졸업. 대산대학문학상(평론 부문) 수상. 2011년 ‘문화일보’ 신춘문예 평론 부문 당선. 제주대학교 국어교육과 부교수 재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