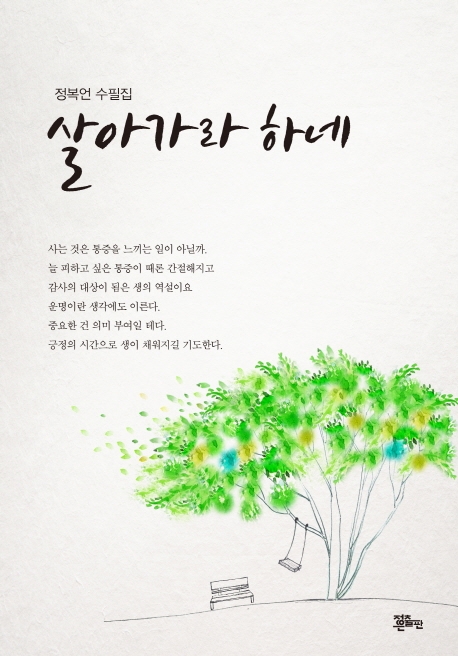
제주 작가 정복언이 첫 번째 수필집 <살아가라 하네>(정은출판)를 펴냈다. 작가는 278쪽 안에 60여편의 수필 작품을 꼭꼭 눌러 담았다.
‘수필은 교설(敎說)의 장르가 아니다. … 수필은 작가가 깨달은 바를 독자에게 가르치고 설명하는 게 아니라 깨달음에 이르는 고통의 과정에 독자와 함께 참여하는 것’이라는 어느 문학평론가의 설명처럼, 정복언의 첫 수필집은 크고 작은 삶의 과정마다 진솔하게 사유하는 고민들이 잘 묻어난다.
특히 끊어지지 않고 술술 읽히는 담백한 글의 흐름은 2016년과 2017년 시인·수필가로 등단한 늦깎이 작가의 내공을 짐작케 한다. “나는 글을 쓰고 싶다. 보는 자에게만 보인다는 말을 새기며 새롭게 눈뜨고 싶다”는 다짐에 진심이 듬뿍 담겨있는 듯하다.
여러 해 전 발목 골절로 수술을 받고 통증을 완화하려고 무통 주사를 맞았던 기억이 난다. 통증이 없어진 게 아니라 못 느낀 것이다. 그땐 의술이 참으로 고맙게 생각되었다. 이제 다리의 신경계 고장을 생각하노라니 몸과 마음에서 통증을 느끼지 못한다면 죽음에 대처할 수 없음을 절감한다.
사는 것은 통증을 느끼는 일이 아닐까. 늘 피하고 싶은 통증이 때론 간절해지고 감사의 대상이 됨은 생의 역설이요 운명이란 생각에도 이른다. 중요한 건 의미 부여일 테다. 긍정의 시간으로 생이 채색되길 기도한다.
자연 속에서 생기를 얻는다. 살아가지 않는 게 없다. 살아가라 하지 않는 게 없다.
- <살아가라 하네> 중에서
불볕더위가 여러 가지 수식어를 달고 지나던 여름, 어느 늦은 아침이었다. 뒤란에 위치한 서재로 향하다 감전된 듯 자리에 멈춰 서고 말았다. 커다란 민달팽이 한 마리가 회색 시멘트 바닥 위에서 최후를 맞았지 않은가. 그것만이라면 집게를 들고 와 마당의 구석진 곳으로 치우고 말았을 것이다. 그러나 주검 옆에는 한 생을 마무리하며 유서를 남겼으니, 도저히 미물 취급을 할 수가 없었다.
…
종종 생각이 닿는다. 대단한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연이 못 되고 조연이라고 섭섭하게 여길 것도 아니라고. 주연을 빛내는 건 관객이지 않은가. 앞서가지 못해 안달인 사람들, 불만덩어리로 벽 속에 갇힌 사람들은 때론 뒷걸음으로 걸어 보고 물구나무도 서 본다면 여러 길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다양한 생명체들이 어우러져 갖가지 흔적을 물려줌으로 지구는 영원히 살 만한 곳으로 남을 것이다.
민달팽이의 유서를 해독해본다.
‘무겁게 길을 걸었네. 마지막에 이르러 동행하는 숨결을 느끼네. 아름다운 발자국을 남기시게나.’
문상객처럼 서서 민달팽이의 죽음을 생각하노라니 자연이 사방에서 우릴 응시한다.
- <민달팽이의 유서> 중에서
저자는 책머리에서 “늦게라도 수필의 길에 들어선 것은 행운입니다. 글쓰기가 어렵고 재능이 없음을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행복하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글밭에 들어서면 오감이 살아납니다. 안 보이던 것이 보이고 안 들리던 것이 들릴 때는, 고통의 희열 속에 춤을 춥니다"라며 "인연을 맺고 따뜻한 목소리로 힘껏 살아가라고 응원해 주는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이제 세상을 향해 삶의 메아리를 전합니다“라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작품 평설을 쓴 김길웅 문학평론가는 “정복언의 수필을 읽다 보면, 언뜻 언어의 숲속에 들어선 느낌을 받는다. 그 숲속은 나무와 풀이 빽빽하고 공기가 맑아 한두 번 흡입으로 경이로움에 빠져든다. 또 싱그러운 숲을 이뤄 놓은 수많은 종들에 놀라게 된다. 어휘의 풍성함에서 오는 포만감”이라고 호평했다.

정복언은 서귀포시 남원읍 남원리에서 태어나 공주사범대학 영어교육과를 졸업하고 제주대 교육대학원 석사 과정을 마쳤다. 교육계에 입문해 고등학교 교장까지 마쳤고 은퇴했다. 황조근정훈장을 받았다.
2016년 <文學광장>, 다음 해 <현대수필>로 시인·수필가로 등단했다. 현재 현대수필문인회, 제주문인협회, 제주수필문학회, 동인脈, 들메동인문학회 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정은출판, 278쪽, 1만3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