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20주년 / 쓴소리 단소리] 이정원 제주한라대 교수‧제주언론학회 총무이사
<제주의소리> 지난 20년을 비평할 생각이 없다. 여기까지 온 것도 대단하다. 축하보다 감사 마음이 크다. 엄혹한 지역 언론 토양을 떠올리면 더욱 그렇다. 앞으로 20년에는 관심이 많다. 그때도 박수를 보낼 수 있을까. 꼭 그럴 수 있길 바란다. 20년을 바라보며 세 가지 질문과 당부를 건넨다.
첫 번째 질문 – ‘정보 민주주의’ 시대를 살고 있는가?
‘정보 민주화’는 왔지만 정보 민주주의는 오지 않았다. 과거 언론사 사명은 명확했다. 소수 기득권이 은폐한 정보를 쟁취해 시민들과 민주적으로 나누는 것. 그 여정에 <제주의소리>도 함께했고 많은 성취를 거뒀다.
언론 덕분에 정보 민주화가 찾아왔다. 이제는 개인이 스마트폰 등 미디어를 갖고 은밀한 정보를 얻고 재가공할 수 있다.
문제는 정보가 너무 많다. 기득권은 민주화를 역이용한다. 일부러 많은 정보를 범람시킨다. 가짜뉴스, 각종 혐오‧왜곡‧폄하 정보를 제한 없이 실어 보낸다.
사실‧진실의 정보를 확인하고 누릴 수 있는, 리터러시(literacy) 능력은 다시 소수의 소유가 됐다. 많은 뉴스가 쏟아짐에도 시민들은 팩트체크(fact-checking)에 목말라한다.
<제주의소리>의 사명이 다시 명확해졌다. 높은 리터러시 역량으로 정보 민주주의를 실현해야 한다. 사실‧진실의 정보를 쟁취해 시민들과 민주적으로 나눠야 한다.
두 번째 질문 - ‘비인간의 소멸’을 어떻게 기록‧증언할 것인가?

앞으로 <제주의소리>는 성장이 아닌 ‘소멸’의 시간을 기록하고 증언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비인간의 소멸’을 지켜봐야 한다.
지난 10년 제주 역사는 이른바 ‘비인간의 네트워크’로 쓰였다. 인간 삶의 주도권을 비인간에게 내줬다.
강정의 구럼비 바위, 그것에서 연결된 남방큰돌고래와 거북이, 산호초, 전복, 보말의 시간들.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로 본격화한 바닷물 소멸의 걱정. 제주의 성장을 지탱한 땅과 나무, 지하수, 공기, 가축 소멸의 걱정들.
걱정의 기반에 인간 소멸의 두려움이 있다. 두려움을 현실의 모습으로 드러낸 주체도 비인간, ‘바이러스’였다. 코로나19 충격은 끝나지 않았다. 더욱 진화한 바이러스 창궐을 걱정하고 있다.
헝가리 출신 거장 벨라 타르(Bela Tarr)의 마지막 영화 <토리노의 말>을 보면 제주가 떠오른다. 아버지와 딸을 둘러싼 비인간의 세상이 서서히 소멸한다.
우물이 마르고 말이 먹이를 먹지 않는다. 바람이 멈추고 햇빛마저 사라진다. 어둠 속에서 아버지와 딸은 생감자의 껍질을 벗기며 마지막 식사를 한다.
<제주의소리>는 비인간 소멸을 어떻게 기록하고 증언할 것인가. 인간 소멸의 먹구름이 서서히 짙어지는 비극적 세기의 진입로에서 공존과 평화, 민주주의를 지킬 방안이 있는가.
세 번째 질문 - ‘돈’과 어떻게 관계를 맺을 것인가?
언론사는 저널리즘(Journalism) 등의 공공적 명분을 내세운다. 이 때문에 돈 버는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하는 데 주저한다.
돈을 빼놓고 언론사 미래를 말할 수 없다. 광고 시장이 척박해지는 제주 실정에서, 돈은 언론사의 생존을 좌우하는 필수 조건이 되고 있다. 짐작건대, <제주의소리>의 가장 큰 고민도 ‘돈’일 것이다.
명분에 얽히면 돈 문제는 더욱 풀기 어렵다. 은밀한 방법으로 해결해야 하는 ‘음지의 거래 대상’이 된다.
비교적 빨리 해결하는 방법은 돈 문제를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다. <제주의소리>에게 바라는 것이 있다. ‘독립언론’이라는, 현실과 동떨어진 명분을 거두길 바란다.
자본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분투하는, 언론을 업태로 하는 영리 법인임을 인정해야 한다. 꼬박꼬박 월급을 주고, 운영 지속성도 유지하기 위해서는 안정된 이윤이 필요하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알려야 한다.
그런 뒤 양지에서 문제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한다. 공적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언론 관련 조례나 공공 기구 등을 만드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기관‧기업이 해결하기 어려운, 도민 지지‧참여가 필요한 문제들을 함께 해결하는 과정에서도 공적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이다.
지역 언론이 돈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건 당연한 상식이 됐다. 현실을 인정하고 태도를 바꿔야 한다. 돈을 벌고 쓰는 데 주저함이 없어야 한다.
그 전에 갖출 조건이 있다. 거래 원칙에 맞게, 민주적으로 돈을 벌고 쓰겠다는 내부의 결의, ‘기업 윤리’다. 그래야 저널리즘의 방어선을 지키며 돈을 벌 수 있다.
“착취당하지 않고,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와 휴식을 보장받는 것”이 ‘정의’다. 청년들은 이 원칙에 특히 민감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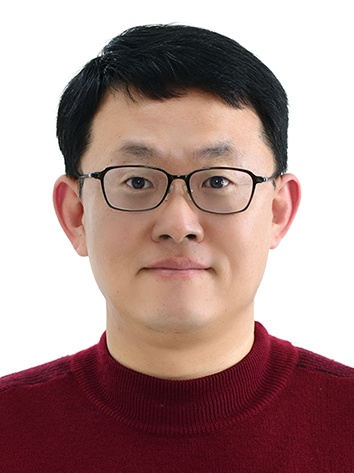
사회 정의를 부르짖는 <제주의소리>가 내부에서부터 정의를 실현하길 바란다. 그래야 현장에서 치열하게 일하는 기자들과 구성원들이 자긍심을 갖고 회사를 오래 다니지 않겠는가.
‘사람’들이 건강하고 안전했기에 20년이 있었다. <제주의소리>를 지켰고, 지키고 있는 ‘사람’들에게 박수를 보낸다. 앞으로 20년도 <제주의소리> 사람들이 건강, 안전하고 행복했으면 좋겠다. <제주의소리> 20년을 거듭 축하드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