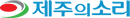제주도 불합리한 행정구역 조정 TF, 분동-통폐합 행정동 대상 의견 수합
1980년대 이후 근 40년 간 변동이 없었던 제주지역 행정구역 조정이 첫 걸음을 뗐다. 개괄적인 밑그림만 그리는 첫 회의임에도 통폐합 대상이 된 지역의 우려가 만만치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특별자치도는 5일 오후 2시 제주도청 삼다홀에서 '불합리한 행정구역 조정 TF팀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학계, 도의회 등 유관기관 관계자를 비롯해 분동이나 통폐합이 고려되는 해당 동장들이 직접 참석해 의견을 개진했다.
제주도가 행정동 개편에 나선 것은 1985년 현재의 행정구역이 확정된 이후 처음이다. 조정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돼 왔지만, 지역주민의 반발 등을 이유로 번번히 무산됐던 탓이다.
제주도는 급격한 인구 증가세와 맞물려 택지개발이 이뤄지면서 원도심 지역의 인구는 빠르게 감소하는 추세가 이어져 왔다. 똑같은 행정동으로 분류돼 있지만, 5만명이 넘어선 동(洞)이 있는 반면, 2000여명에 그친 동도 상존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분동이 유력한 지역보다는 통폐합 후보군으로 언급되는 지역에 대한 우려가 잇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조정의 필요성에는 일정 부분 공감하면서도 어떤 방식을 취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의 목소리다.
통폐합 시 가장 주된 우려는 행정서비스의 거리가 멀어진다는 점이다. 자연스럽게 주민센터 등 주요시설의 물리적 거리가 멀어지며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노인 등 교통약자들에 초점이 맞춰져야한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각 지역마다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자생단체의 존폐 여부도 고민거리로 떠올랐다. 각 지역과 단체의 역사성이나 동질성에 있어 주민들이 받아들이기에 정서적 거부감이 들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실제 제주도는 지난 2008년 과소동 통폐합을 추진하려 했으나 지역 주민들의 강한 반발로 무산된 기억을 지니고 있다. 당시에는 선거 시기까지 맞물리며 논의의 한계에 부딪힌 바 있다.
회의 참가자들은 통폐합이 이뤄질 시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장단점이 명확하게 구분돼 있어야 한다고 의견을 보탰다. 특히 주민의 상실감을 고려한 인센티브 제공이 구체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정이 이뤄지더라도 각 자생단체의 임기가 끝나는 시기와 맞물려 자연스럽게 조정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 당시 시군이 통폐합됐던 경험을 되새겨야 한다는 제언까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올해 초 도정현안 정책을 공유하는 자리에서 행정동 개편 검토를 지시했고, 본격적인 추진을 위한 TF가 발족했다.
행정안전부의 행정동 조정 기준에 따르면 인구 5만명 이상이거나 인구 1만명 미만이어야 조정 대상이 된다.
지난해 12월31일 기준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은 노형동으로, 총 인구가 5만5693명에 달했다. 현재 노형동은 분동이 가장 유력하게 검토되는 지역이다. 노형동 외에도 이도2동 4만9263명, 연동 4만2413명, 아라동 3만9137명 등 택지개발 지구를 중심으로 인구가 몰려있다.
인구 5만명을 코 앞에 둔 이도2동과 연동 역시 유력한 분동 대상으로 검토되고 있다.
반면, 인구가 크게 줄어든 지역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원도심 지역에 몰려있다.
제주시의 경우 도서지역인 우도면·추자면을 제외하면 일도1동 2303명, 도두동 3274명, 이호동 4416명, 봉개동 5270명, 용담1동 6834명, 이도1동 7659명, 삼도2동 7828명, 건입동 8866명으로 인구수 1만명 미만에 머물러 있다.
서귀포시 원도심 지역도 정방동 2136명, 중앙동 3205명, 천지동 3465명, 예래동 3875명, 송산동 3904명, 효돈동 5311명, 영천동 5302명 등으로 조정 가능성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지역 의견을 어떻게 수렴해야 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나눴다. 조정이 이뤄지더라도 최대한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데 목표를 두고 최적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