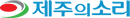[제주의 실험, 대한민국의 미래] ② 제주는 대한민국 균형발전사의 거울

1. 현재, 대한민국의 모습
현재의 대한민국은 광복 후 80년 만에 세계 12위권으로 성장했습니다. 경제적 성장과 전 세계적 위상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놀라운 성장 이면에는 외면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인구와 기업, 다양한 기회가 수도권으로 집중되면서 지방의 숨은 점점 가빠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저출산·고령화·저성장이 맞물리며 국가 전체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구조적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2.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
이러한 현실은 우리에게 묵직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걸어온 길은 과연 올바른 방향이었는가?" 그리고 "지금의 대한민국은 앞으로도 지속가능한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는 과거의 이야기로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의 현실은 어제의 미래였기 때문입니다.
과거를 성찰하는 이유는, 이를 통해 비로소 내일을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주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야기하기 위하여 두 차례에 걸쳐 국내외 국가발전과 지역균형발전의 역사를 살펴보고, 오늘의 우리에게 전해주는 교훈을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3. 대한민국 발전경로, 정부는 미래를 어떻게 계획하고 추진했을까?
정부의 국정비전 및 철학은 당시 시대적 과제와 국민적 요구를 반영하고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의지입니다. 역대 정부의 국정 비전 및 철학을 바탕으로 한 대한민국 발전사 흐름은 “중앙집중형 산업화 → 규제형 분산 → 제도적 분권 → 경쟁형 효율 → 포용·협력형 균형발전”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시대정신이 반영된 대한민국 발전 궤적은 “중앙으로의 압축 성장과 불균형에서 지역으로의 균형”이란 흐름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1960~70년대
1960~70년대(박정희 정부)는 “선택과 집중”으로 대변되는 불균형 성장론과 성장거점 전략을 택하면서 “한강의 기적”을 일궈냈습니다. 하지만 압축성장 이면에는 수도권 과밀과 지방 소외라는 그림자를 남겼습니다.
2) 1980~90년대
1980년대 들어 1990년대(전두환·노태우·김영삼 정부)까지 “진정한 국가발전은 전 국토의 조화로운 발전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규제 중심 성장관리 이론과 다핵분산형 전략으로 수도권을 규제하고 신도시 개발 및 지방도시 육성, 서남부 신 산업지대 조성을 추진해 나갑니다. 국토개발을 공간적 연계발전 구상을 제시하고 지방자치 부활 등 제도적 틀을 마련했으나, 실질적인 지역산업 발전으로 이어지지 못했고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연결하지 못하는 한계를 나타냈습니다. 여전히 수도권으로의 쏠림현상을 지연시키고 분산시키기에는 규제의 실효성이 부족하였습니다.
3) 2000년대
2000년대(김대중·노무현 정부)는 균형발전 패러다임 전환기이자 제도화된 시기로 평가받습니다. 이전의 불균형 성장 중심 모델에서 내생적 발전론, 혁신체계론으로 전환한 시기입니다. 내생적 성장기반 조성(RIS·RIC)으로 지역혁신 담론을 확산하고 지방분권특별법과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정 등 균형발전 제도적 틀이 구축됩니다. 이 시기 지역개발정책은 “경제개발정책의 부속”에서 “국정과제 등 국가운영의 축”으로 격상되었습니다.
혁신도시, 행정중심복합도시 조성 등 분권·분산·분업의 정책기조로 성과도 있었습니다만 추진과정에서 빚어진 효율성 논란, 분산투자의 한계 등이 지적되기도 하였습니다.

4) 2010년대
2010년대(이명박·박근혜 정부) 들어 다시 “균형에서 경쟁으로, 분권에서 효율로”의 국정기조가 변화되었고 지방은 경쟁의 영역으로 여겨졌습니다. 성장거점론에서 클러스터간 경쟁이론 그리고 생활권 개발론으로 진화하여 국가 기간망(SOC) 확충과 광역경제권 기반 형성, 생활권 단위 주민체감형 사업 추진 등 긍정적 성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균형발전보다 혁신과 경쟁 담론으로 지방의 자율성 보다는 중앙주도형 정책주도가 지속되고 수도권 집중 완화 효과가 미미한 한계가 있었습니다.
5) 2020년대
2020년대(문재인·윤석열 정부)는 기존의 균형발전 철학을 계승하고 균형발전은 여야가 없는 초당파적인 정책영역임을 공식화한 시기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포용적·혁신성장 기반의 지역균형발전론과 다핵·연계발전론을 바탕으로 지방소비세율 확대 등 자치분권 2.0, 생활SOC 복합화 사업, 혁신도시 시즌2 등을 추진합니다. 메가시티 등 초광역협력 프로젝트도 추진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전 정책의 연장선 상에서 4+3 초광역발전계획 등을 계획합니다. 특히 기존의‘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과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통합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한 것은 국가·지역 균형발전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는 상징적인 사건으로 여겨집니다.
이재명 정부에서는 “균형발전은 국가의 생존전략이자 운명”이란 철학적 인식하에 수도권 일극에서 5극 3특으로 대한민국 성장지도를 바꾼다는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정책목표를 “잠재성장률 3%+, 비수도권 GRDP 50%+”를 제시하고 핵심전략을 5극3특: 경제권(성장과 집중), 생활권(연결과 확산) 등으로 관련 입법 추진과 세부사항 등을 다듬고 있습니다.

4. 대한민국 발전 과정에 제주에 대한 정부의 시선은 어떤 것이었나?
대한민국의 발전사 속에서 제주를 한마디로 표현해 보면 ‘제주는 대한민국 균형발전사의 거울’이었습니다. ‘변방의 실험대였던 섬이 분권의 교본’으로 위상이 변화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960~70년대의 제주는 국가성장 지도 위에서 늘 비껴 있었습니다. 국토종합개발계획 등에는 제주는 농어업과 관광 중심의 제한적 개발지로 남아있었습니다. 중문관광단지나 한라관광특구 같은 계획은 있었지만, ‘관광산업 실험지’ 성격이 강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980~90년대 들어 제주는 중앙의 통제 아래 있던 섬이, 스스로의 정책과제를 논의할 최소한의 권한을 얻게 된 시기입니다. 1987년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 수정계획(1982-1991)에 관광개발 촉진위한 특별지역으로 지정됩니다. 1990년대 들어 지방자치 부활 등 민주화와 개방이 진행되면서 제주도개발특별법 제정 등 제주의 정체성과 자율성 확립의 제도적 토대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대중 정부는 ‘동북아 중심 비즈니스 중심 국가’라는 정부 비전 실현의 일환으로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을 제정하며, 제주를 국가의 발전의 축이자 파트너로 제도화했습니다.
![2005년 1월 27일 청와대에서 故 노무현 대통령이 ‘제주 평화의 섬 지정 선언문’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출처-대통령 기록관]](https://cdn.jejusori.net/news/photo/202510/440191_470853_2155.jpg)
노무현 정부에 들어서서 제주는 ‘변방의 실험대’에서 ‘분권의 상징’으로 시선이 바뀌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 미래형 지방자치·분권 모델로 끌어올렸습니다.
하지만 이명박·박근혜 정부로 이어지면서 효율성을 중시하는 국가성장전략으로 제주는 다시 관광·외국인 투자 중심의 개발섬으로 회귀했습니다. 이에 따라 각종 갈등과 환경 부담은 커졌고 특별자치의 심화·확산은 멈췄습니다.
문재인, 윤석열 정부에 이어 이재명 정부에 이르러서야 제주는 다시 5극 3특이란 국가 균형성장의 축으로 자리잡았습니다. 이러한 국정의 동반자로 인식된 것은 그동안 제주의 혁신역량과 성과가 축적되어 제주를 ‘정책의 실험장’이 아닌 ‘분권형 국가의 선도모델’로 바라본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주가 더 이상 국가정책의 변방이 되지 않고 대한민국의 발전모델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보다 책임 있는 의지와 역량을 지속적으로 보여줘야 하는 배경이자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5. 대한민국 발전사가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는 교훈: “불균형의 속도에서 균형의 지속으로”
대한민국의 발전사는 “성장을 위한 속도의 역사이며, 결과적으로 불균형의 역사”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날 세계 경제대국으로서의 놀라운 성장을 일궜으나 대한민국 차원에서는 ‘공간적 불균형과 사회적 피로’라는 어두운 그림자도 깊게 드리워졌습니다.
그동안 역대 정부는 블랙홀 같은 수도권 1극 체제 속에서 ‘단기 성장과 장기 불균형’의 딜래마에 갇혀 있는 것 같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균형의 이름으로 정책방향을 수정했지만, 결국‘중앙의 선택적 정책’이 이어져 왔습니다.
“대한민국은 지속가능한가?”에 대한 답은 앞서 논의한 과거의 성찰을 바탕으로 보면 비교적 명확합니다. 지속가능성은 더 큰 성장이나 효율성만을 최우선 가치로 삼기보다는 ‘더 넓고 깊은 균형’을 지향해야 합니다. 균형발전은 경제정책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둘러싼 정책을 망라해야 하는 국가 생존전략이고 자치분권은 중앙과 지방, 지방과 지방간의 협력·자율·책임을 강화해야 하는 대한민국의 미래 조건입니다.
성장의 속도가 오늘의 불균형을 만들었다면, 앞으로는 균형의 넓이와 깊이가 지속가능성을 결정할 것입니다. 중앙의 힘을 나누고, 지방과 협력하며, 지역의 가능성을 믿어야 합니다.
과거의 미래가 오늘을 만들었다면,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대한민국을 결정할 것입니다.
나오며: 해외 선진국들은 어떻게 불균형의 문제를 극복해 나갔을까?
지금의 불균형과 지속가능성의 고민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많은 나라들이 수도권 집중과 지역 격차, 성장의 한계를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균형과 지속가능성을 조화시켰을까요?
다음 이야기는 그 답을 찾아 세계 주요 국가로 시선을 돌려보려 합니다. 다른 나라의 지혜는, 오늘의 대한민국에 어떤 길을 비춰줄 수 있을까요.
대한민국 발전 주요 지표(1960년대 vs 현재)
(1) 양적 성장의 성과
①경제 규모: 1960년 대비 약33배 증가
·1인당 GDP: 1,028달러(1960년) → 34,701달러(2025년 예상)
·세계무역순위(수출규모): 50위권 후반(33만달러) → 8~9위(1.4조 달러; 2025년 현재)
② 인구 및 사회발전 지표
·인구(2배 이상 증가): 2,501만명(1960년) → 5,168만명(2025년 추계)
·도시화율: 37%, 920만명(1960년) → 91%, 4,718만명(2025년 현재)
(2) 질적 발전의 성과
·교육: 문맹률 78% → 문해율 99% 이상, 고등교육 이수율 54.5%
·보건(기대수명;29년 증가): 54.3세(1960년) → 83.5세(2025년 현재)
·기술혁신: 글로벌 혁신지수 4위, 아시아 최고 혁신국가
·국제위상: 최빈국 → G20 주요국
국정비전 및 철학
·박정희 정부(1961-1979) : "조국근대화“, 국가주도의 민족주의, 한국적 민주주주의 토착화
·전두환 정부(1980-1988) : "정의사회 구현“, 정의사회의 구현과 복지사회의 건설
·노태우 정부(1988-1993) : "대한민국 발전“, 경제발전과 사회발전 동시 추진
·김영삼 정부(1993-1998) : "신한국 창조“, 군사정부 종식과 문민정부 시작
·김대중 정부(1998-2003) : "새천년 새출발“, 국민 중심의 참여 민주주의 구현
·노무현 정부(2003-2008) : "국민과 함께 하는 민주주의,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 사회“, 개혁과 통합, 민주주의와 균형발전 추구
·이명박 정부(2008-2013) : "선진일류국가“, 실용과 창조를 통한 신발전체제
·박근혜 정부(2013-2017) : "국민행복, 희망의 새시대“, 국민에게 행복을, 지역에 희망을
·문재인 정부(2017-2022) :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 국민주권 실현과 정의로운 사회 구축
·윤석열 정부(2022-2025) :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기반의 국가 재건
·이재명 정부(2025~ ) :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 경청과 통합, 공정과 신뢰, 실용과 성과

참고문헌
국내 논문
장재홍 (2005). 『지역혁신정책과 지역균형발전간의 관계분석 및 정책대응』. 산업연구원.
임도빈 (2008), "역대 대통령 국정철학의 변화: 한국행정 60년의 회고와 과제", ‘행정논총’ 제46권 1호, pp.211-246
차재권 (2017). "역대정부 균형발전정책의 성과 평가: 박정희정부에서 박근혜정부까지."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9(2), 99-126.
이진희, 이만형 (2019).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지역균형발전 정책 레버리지 탐색: 지역의 기능 집중·분산 구조를 중심으로."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20(12), 60-70.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22). 『지역혁신 기반 균형발전정책의 새로운 전략 방향 모색』.
전성만, 정현민 (2023).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성과와 한계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행정학보』, 20(1), 73-104.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23). 『국가균형발전 3.0 패러다임 구축과 실천전략 연구』.
국토연구원 (2024). 『국토 대전환을 위한 메가시티 정책방향 연구』.
국내 보고서 및 단행본
성경륭 외 (2007).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이론과 실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권오성 외 (2012), ‘역대정부의 국정기조 비교분석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산업연구원 (2021). 『한국 지역정책 변천과 시사점: 2000년대 이후 4개 정부를 중심으로
산업연구원 (2023). 『균형발전정책의 변천과 성과·한계 분석』.
지방시대위원회(2023).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
국토연구원(2022). ‘국토종합계획 50년 1972–2022.’
박종화 외(2024). ‘지역개발론’
대한민국 정부(2025.9)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
국외 논문
Hirschman, A. O. (1958). The Strategy of Economic Development. Yale University Press.
Perroux, F. (1950). “Growth Poles.”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64, 89–104.
Rodríguez-Pose, A. (2010). “Does decentralization matter for regional disparities? A cross-country analysis.” Journal of Economic Geography, 10(5), 619–644.
Lessmann, C. (2012). “Regional inequality and decentralization: An empirical analysis.” Environment and Planning A, 44(6), 1363–1388.
ESPON (2012). POLYCE: Metropolisation and Polycentric Development in Central Europe (Final Scientific Report).
OECD. (2012). Redefining “Urban”: A New Way to Measure Metropolitan Areas. Paris: OECD Publishing.
Camagni, R., & Capello, R. (2015). “Rationale and Design of EU Cohesion Policies in a Period of Crisis.” Regional Science Policy & Practice, 7(1), 25–47.
ESPON (2016). Policy Brief: Polycentric Territorial Structures and Territorial Cooperation.
European Parliament (2020). EU Cohesion Policy in non-urban areas.
Frick, S. A. (2025). “Lessons-learnt from growth pole strategies in the Global South.” World Development (in press)
인터넷 사이트
관계부처합동(2025.9.30.) 보도자료, “수도권 일극에서 ‘5극3특’으로, 대한민국 성장지도 바뀐다.”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2025 글로벌 혁신 지수
통계지리정보서비스 홈페이지(https://sgis.kostat.go.kr/jsp/pyramid/pyramid1.jsp)
국토교통부(2019), 대한민국 국가지도집
통계청, 지표누리 홈페이지
TRADING ECONOMICS 홈페이지(https://ko.tradingeconomics.com/south-korea/gdp-per-capita)
김인성

시민사회단체 활동을 거쳐 14년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정책연구위원과 행정자치전문위원으로 활동하며, 의안 검토보고서 1300여 건과 4400여 건의 의정활동 지원을 수행한 입법·정책 전문가다. 단순한 안건 검토를 넘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 설계와 갈등 조정에 주력하며, 제도개선과 주민체감형 정책 실현을 이끌어 왔다. 행정학 박사로 현재는 제주대에서 강의(행정학)를 하고 있다.
김인성에게 제주는 단순한 근무지가 아니라 사명과 헌신의 현장이다. 그는 제주에서 축적된 자치특례와 혁신 경험을 국가 균형성장 전략인 ‘5극3특 분권형 균형발전 모델’로 확산시키며, 지역과 국가 발전을 함께 견인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그의 철학은 분명하다. “도민과 지역, 그리고 국가 발전을 위해 가장 좋은 해법을 찾고, 일이 되게 하는 균형자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신념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제주를 넘어 대한민국의 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의 미래를 설계하는 정책 전문가로 자리매김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