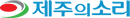[윤석열 정부 제주공약] ②제주 신항만 건설
| 윤석열 정부 출범이 어느덧 해를 넘겼다. 당락을 가른 득표율 격차는 불과 0.73%p. 역대 최소인 24만표의 초박빙 승부였다. 윤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합리주의와 지성주의를 강조했다. 후보 시절에는 제주와 광주를 잇달아 찾아 화해와 상생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취임 이후 통합과 협치에 대한 기대와 달리 보복과 사정당국의 이미지가 부각 되면서 지지율은 곤두박질쳤다. 여야간 정쟁으로 국민들에게 보고한 110대 국정과제와 민생법안은 뒤로 밀렸다. [제주의소리]는 신년을 맞아 윤석열 정부가 약속한 제주지역 7대 핵심공약을 되짚고 점검하는 시간을 갖는다. [편집자 주] |
![1967년 촬영된 제주항의 모습. 당시 정부는 5개년 개발계획에 맞춰 제주항 규모를 키워갔다. [사진출처-제주시 사진DB]](https://cdn.jejusori.net/news/photo/202301/410839_418240_3551.jpg)
제주항은 1927년 길이 580m의 방파제를 갖춘 국제무역항으로 개항했다. 1978년 제주항 종합개발계획이 수립되면서 외항 개발 직전의 모습을 갖췄다.
1999년부터는 외항 개발이 본격 추진되면서 화물처리량을 한층 끌어 올렸다. 이 과정에서 크루즈선 전용 부두와 여객터미널도 들어서며 관광객 유치에도 힘을 보탰다.
제주항의 물동량은 2016년 1119만톤에서 2021년 1690만톤으로 5년 사이 50% 가까이 증가했다. 현재 도내 물동량의 80%를 담당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국제자유도시에 맞게 제주의 항만 물동량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북아의 대표 크루즈 모항으로 키우겠다며 신항만의 밑그림을 제시했다.
제주신항만 건설 논의는 중국인 관광객이 정점을 찍은 2016년부터 본격화 됐다. 한해 300만명 이상의 외국인 관광객이 밀려들면서 크루즈가 새로운 성장산업으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해양수산부는 그해 5월 ‘제주신항만 건설기본계획 수립 및 예정지역 지정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공개하고 7개월 뒤 ‘신항만 건설 기본계획’ 고시를 추진했다.
방파제 7만1910㎡와 항만부지 46만3600㎡, 배후부지 83만2700㎡ 등 136만8210㎡ 규모로 매립하는 내용이었다. 이는 탑동 매립의 8배, 이호유원지 매립의 20배에 달하는 규모다.
항만부지에는 10만~22만톤급 대형 크루즈선박 4척과 내항 여객선 9척이 접안할 수 있는 선석이 들어서도록 했다. 선석 주변에는 크루즈터미널과 국내여객터미널 건설도 포함됐다.
배후부지에는 상업시설용지 34만6000㎡, 업무시설용지 8만2700㎡, 물류산업시설용지 8만5500㎡를 조성하기로 했다. 이에 필요한 예산 추계만 2조5000억원에 달했다.
기본계획 고시 소식과 동시에 환경파괴 논란이 불거졌다. 시민사회단체는 1988년부터 시작된 탑동 매립의 악몽이 재연될 수 있다며 계획 철회를 요구했다.
![매립되기 전인 1980년대 제주시 건입동 탑동 앞바다의 모습. [사진출처-제주시 사진DB]](https://cdn.jejusori.net/news/photo/202301/410839_418241_4217.jpg)
![1991년 제주시 탑동 앞바다 매립 직후 모습. [사진출처-제주시 사진 DB]](https://cdn.jejusori.net/news/photo/202301/410839_418239_3344.jpg)
탑동 매립은 1988년 3월 해녀들의 피해보상 요구를 시작으로 1991년까지 매립면허 취소 요구, 개발이익의 지역사회 환원 요청으로 이어지면서 대규모 개발사업에 경종을 울렸다.
환경훼손 논란 속에 기획재정부가 사업성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2016년 12월 예정된 기본계획 고시는 보류됐다. 중국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태도 영향을 미쳤다.
한국해양수산개발연구원의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비용편익비율(BC)이 기준치 1을 넘었지만 크루즈선 사업 정상화 여부가 불투명해 여전히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2019년 문재인 정부시절 제주도는 예비타당성 면제 신청을 추진했다. 하지만 비난 여론을 의식해 이를 철회하고 한시가 급한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으로 방향을 급선회했다.
그사이 완료하기로 했던 제주항 외항 공사도 미뤄졌다. 제주도는 2001년부터 제주항 동측에 외항을 구축하고 1단계 사업으로 신규 방파제(1.8km)와 크루즈부두 등을 조성했다.
반면 잡화부두와 해경부두(0.9km), 연결교량(0.2km)을 건설하는 2단계 사업은 착공조차 하지 못했다. 당초 2020년 완공이 목표였다.


기획재정부는 중국발 사드 문제로 경제성의 근거가 되는 연간 크루즈선 260척 입항 조건이 충족되지 못했다는 이유로 예산 협의를 계속 늦췄다.
이에 제주도는 외항 2단계 사업 중 길이 210m의 잡화부두만 우선 건설하는 내용으로 사업을 축소했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제주외항 2단계 사업 타당성 재조사 용역’을 다시 진행했다.
2022년 10월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가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하면서 사업 추진 7년 만에 외항 2단계 사업이 재추진되고 있다.
다만 해경부두와 연결교량을 건설하는 3단계 사업 추진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이에 제주외항 준공 시점도 2020년에서 2027년 이후로 재차 늦춰졌다.
신항만 건설을 위해서는 외항 사업이 우선 마무리돼야 한다. 추진 과정에서 대규모 해양매립에 따른 환경 훼손 논란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제주도는 현 정부 임기 중인 2024년 사전타당성 조사와 2025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기대하고 있다. 2035년까지 1단계 사업을 끝내고 단계별 공사를 거쳐 2045년 준공이 목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