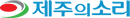[환대받지 못하는 이방인] ④ 김상훈 사무국장이 본 제주 난민 현실
제주가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된 지 20주년, 국제자유도시로 지정된 지 24주년을 맞았다. 그러나 ‘평화’와 ‘자유’의 이름 뒤 난민 심사 문턱까지 가지 못한 채 ‘불회부 결정’과 이름도 생소한 ‘T-2 비자’ 속에 갇힌 이들이 있다. 일할 권리도, 지원도 없이 난민도 불법체류자도 아닌 ‘숨만 쉬는 존재’로 살아가는 현실. [제주의소리]는 그 높은 벽과 법적 사각지대, 그리고 그 안에서 버티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통해 제주가 벼랑 끝에 내몰린 난민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묻는다. [편집자 글]
제주국제공항은 여행자에게는 설렘의 시작이지만, 누군가에게는 끝없는 대기의 공간이 되기도 한다. 공항 난민을 지원해 온 천주교 제주교구 이주사목 나오미센터 김상훈 사무국장을 만나 제도적 공백과 현장의 현실을 들어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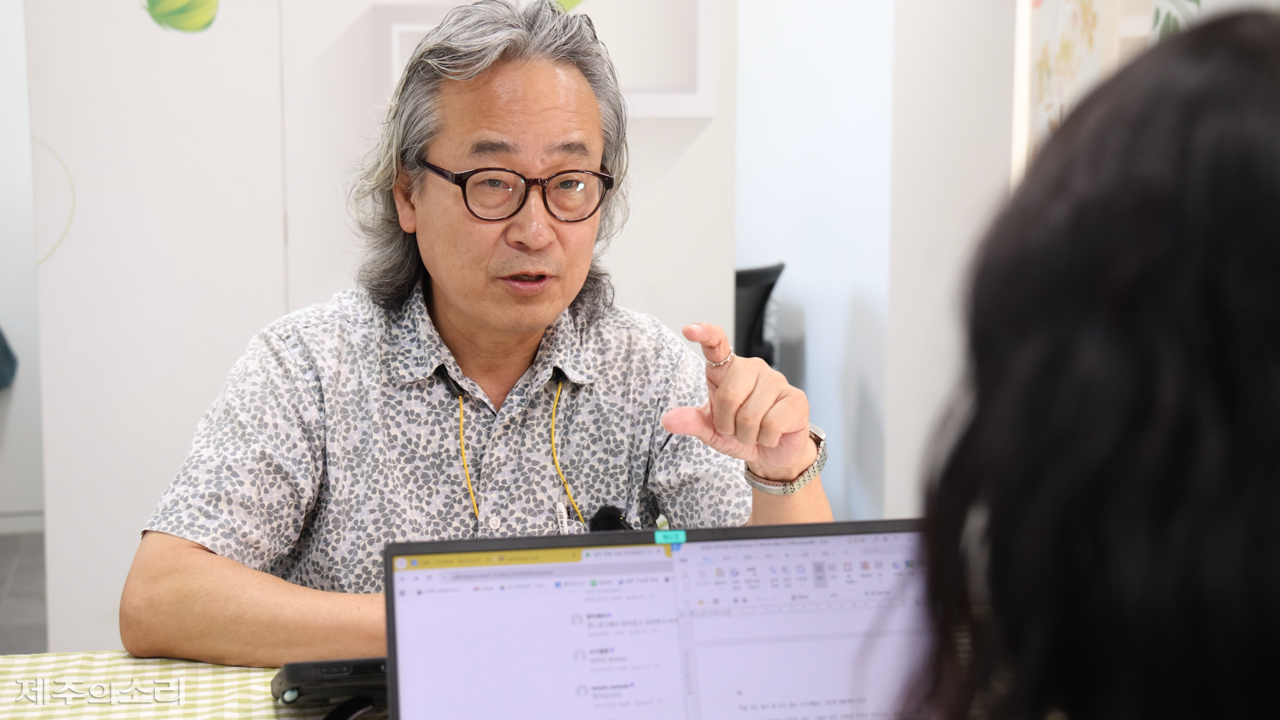
지난 2일 나오미센터에서 만난 김 사무국장은 2008년부터 이주민 지원 활동을 시작해 2014년부터 제주 현장에서 난민을 직접 마주해 온 인물이다. 그가 ‘공항 난민’을 실감한 것은 3~4년 전, 인권 변호사가 “갈 곳 없는 분이 있다”며 도움을 요청하면서였다.
김 사무국장은 “난민 여부를 가릴 전문 심사에 가기도 전에 공항 근무자가 신청서를 받아줄지 여부를 정한다. 사실상 심사 문턱에 서 보기도 전에 기회 박탈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난민 신청은 접수 → 전문 조사 → 인터뷰 → 판단의 절차가 상식인데, 그 절차로 들어갈 권리조차 봉쇄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수치도 이를 방증한다. 지난해 국내 전체 난민 신청은 1만8336건이었고,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접수된 건수만 848건에 달했다.
그러나 심사 과정은 더뎠다. 난민 신청 심사에 평균 14개월이 걸렸고, 특히 공항·항만에서 접수된 309건 가운데 단 67건(21.6%)만이 심사 절차로 이어졌다. 공항이나 항만에서 난민 신청 의사를 밝힌 100명 중 21명만이 문턱을 넘었을 뿐이다. 나머지는 불회부 처분을 받아 자국으로 돌아가거나 불회부 취소 소송을 선택해야 했고, 이 경우 14개월에 더해 수개월을 더 기다려야 했다.

김 사무국장이 도움을 준 사례 가운데는 최장 7개월 동안 공항에서 생활한 난민도 있었다.
그는 “공항 난민을 비롯해 의뢰인 접견을 위해 시설을 방문한 변호인 모두 ‘그곳은 사람 살 곳이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소송 1심에서 이겨도 끝이 아니다. 김 사무국장은 “2023년부터 법무부가 항소하기 시작하면서 절차가 더욱 복잡해졌다”고 설명했다. 설령 1심에서 승소해 제주공항을 벗어나더라도 항소가 진행 중일 때는 법적으로 ‘입국’이 인정되지 않아 난민 신청 자격이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는 이를 “발은 제주에 있지만 자유는 하나도 없는 상태”라고 표현했다.
최종 승소해 난민 신청을 시작하더라도 ‘6개월간 노동이 금지’된다. 불회부 소송 1심 수개월과 항소 수개월을 버틴 뒤 다시 6개월을 견뎌야 하니, 현실적으로는 1년 이상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상태가 지속된다. 기약 없는 기간 동안 먹을 것, 잘 곳, 생계는 개인과 민간단체 지원에 의존해야 한다.
이 때문에 나오미센터는 난민이 오면 면담을 통해 경제 상황부터 파악한다. 김 사무국장은 “6개월 정도는 버틸 준비가 되어 있다는 분도 있지만, 아무것도 없는 분도 있다”며 “넉넉하지는 못해도 먹고 자는 데 필요한 생필품을 맞춤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사무국장은 무사증 제도와 국제자유도시라는 간판의 모순을 지적했다.
그는 “돈 쓰는 관광객만 받겠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무사증 제도가 있는 제주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몰려들어온다. 그런데 제도는 다른 지역과 동일하다. 자유로운 입국이 가능한데 체류의 합법적 경로는 막혀 있으니, 불법과 사각지대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평화는 상식이 만든다”
인터뷰의 끝에서 김 사무국장은 ‘평화의 섬’의 조건을 이렇게 풀었다. 그는 “평화는 군인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제도와 문화가 상식적으로 작동할 때 자연스레 자리 잡는다. 한국이 ‘집 앞에 둔 택배가 없어지지 않는 사회’로 불리는 것은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규범이 그렇게 형성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서문로터리의 외국인 밀집 원룸촌에서도 택배가 사라지지 않았다. 이는 한 번 평화가 이뤄지면 들어오는 이들도 그 질서에 익숙해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난민 제도 또한 그러한 상식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사무국장이 제시하는 해법은 복잡하지 않다. 불회부 남용을 막고, 전문 심사로의 ‘진입권’을 보장할 것. 더불어 단기 교육·계절노동 등 합법적 체류 경로를 설계할 것.
그는 말을 맺으며 이렇게 덧붙였다.
“제주가 평화의 섬이라면 난민을 둘러싼 제도부터 상식에 맞게 작동해야 합니다. 평화는 거창한 구호로 만들어지지 않거든요. 사회 제도가 합리적으로 작동하고, 문화가 상식에 따라 움직일 때 비로소 일상 속에서 구현됩니다. 제주가 진정한 평화의 섬으로 남기 위해서는 난민 문제 역시 그 상식의 테두리 안에서 풀어야죠. 그래야 들어오는 이들도 자연스럽게 평화에 익숙해지고, 제주가 지향하는 ‘평화의 섬’의 가치가 완성될 겁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