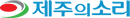[제주의 교통정책] ⑥승차공유서비스
교통혼잡 완화 vs 생존권 침해 갈등
제주는 1990년대 본격적인 마이카시대를 맞아 차량이 급증했다. 2000년대 들어서는 각종 택지개발로 인구도 늘었다. 2010년대에는 관광객까지 밀려들면서 교통인프라가 포화 상태에 놓였다. 주요 도로는 막히고 도심지 곳곳에서 주차 전쟁이 벌어졌다. 교통량을 분산하기 위해 2017년 버스준공영제가 도입됐다. 렌터카총량제와 차고지증명제 등 각종 정책도 쏟아졌다.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수송 분담률은 제자리걸음이다. 갖은 교통정책도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제주의소리는 창간 21주년을 맞아 제주 교통정책의 현주소를 순차적으로 점검하는 시간을 갖는다. [편집자 주]

승차공유서비스 업체인 우버(Uber)는 2009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혜성처럼 등장했다. 운전자와 승객을 모바일로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도입 초기부터 주목을 받았다.
덩치를 키운 우버는 2013년 8월 국내 시장에 문을 두드렸다. 렌터카 기반의 ‘우버 블랙’과 택시 호출인 ‘우버 택시’, 승차 공유인 ‘우버 엑스(X)’ 서비스가 순차적으로 등장했다.
이 중 문제가 된 것은 우버 엑스였다. 이는 운전자가 자신의 차량을 이용해 사람을 목적지에 데려다주는 서비스다. 출근길 함께 차량을 이용하는 카풀(car pool)과 비슷한 개념이다.
국내 택시와 렌터카 업체는 법령 위반이라며 반발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 제1항에 따라 자가용을 이용한 유상운송 제공과 임대, 알선은 불법이기 때문이다.
다만 ‘출퇴근 때 승용차를 함께 타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예외조항이 있었다. 하지만 등하교나 출퇴근이 아닌 시간에도 영업이 이뤄지면서 논쟁이 일었다.
관련 신고가 잇따르자 우버는 2015년 3월 서비스를 중단하고 한국 시장에서 철수했다. 현재 도로에 보이는 우버 차량은 승차 공유가 아닌 카카오와 같은 택시 호출 서비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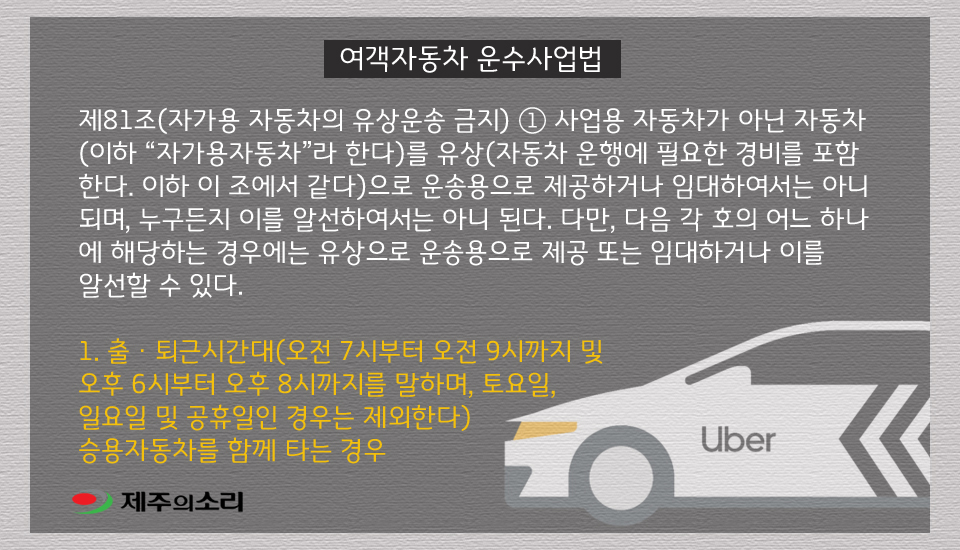
2018년 10월에는 제주에 본사를 둔 쏘카(socar)가 브이씨엔씨(VCNC)를 인수하고 새로운 서비스를 선보였다. 렌터카 기반의 차량 호출 서비스인 ‘타다’(TADA)의 등장이었다.
타다는 법적 분쟁을 피하기 위해 쏘카의 렌터카(11인승 카니발)를 활용했다. 당시 여객자동차법상 렌터카를 이용한 유상운송 행위는 금지되지만 카풀은 가능했다.
택시와 렌터카 업계는 또다시 반발했다. 제주를 포함해 전국에서 찬반 논쟁이 불거졌다. 정치권은 기존 업계의 피해를 우려해 여객자동차법 개정에 나섰다. 이른바 ‘타다금지법’이다.
여객자동차법 제34조를 개정해 타다 영업 조건을 관광 목적의 11~15인승 승합자동차 이용과 대여시간 6시간으로 제한했다. 대여와 반납 장소도 공항 또는 항만으로 제한했다.
타다금지법으로 카풀을 포함한 승차공유서비스는 사실상 자취를 감췄다. 졸지에 일반인들의 출퇴근 시간 외(오전 6~9시/오후 6시~8시) 카풀도 불법이 됐다.
승차 공유가 사라지면서 제주는 택시와 렌터카의 영향력이 더욱 커졌다. 총량제로 새로운 사업자의 진출까지 막히면서 경쟁은 사라지고 개인택시면허 가격과 렌터카 몸값은 치솟았다.
그 사이 카카오(카카오T)는 도내 택시 호출시장을 야금야금 침범하기 시작했다. 초기 택시업계의 반발이 있었지만 현재는 도내 토종 콜택시를 밀어내고 호출시장을 장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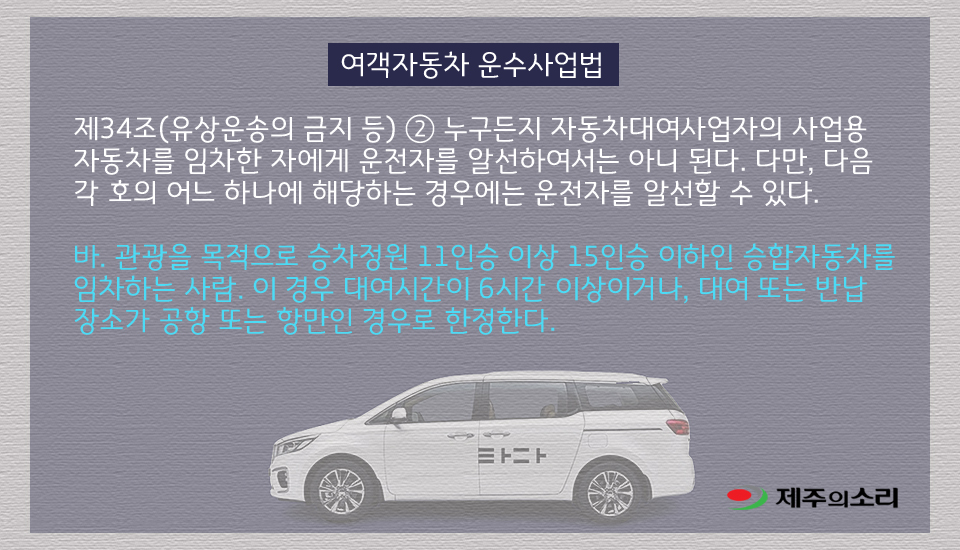
렌터카 업계도 국내 1, 2위 기업인 롯데렌탈(롯데렌터카)과 SK렌터카가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다. 도내 122개 렌터카 업체 중 이들 2곳의 차량 점유율은 20.63%(6145대)에 이른다.
애초 카풀을 포함한 차량 공유는 도심지 교통혼잡 완화와 수요 분산에서 호응을 얻었다. 도심지 진입 차량을 거점 지역까지 이동하고 카풀과 대중교통으로 유도할 수 있어서다.
하지만 기존 운수업계 입장에서는 영업권과 생존권과 직결된 사안이다. 특히 택시와 렌터카 이용률이 높은 제주에서는 업계의 충격이 더욱 크게 다가올 수밖에 없다.
최근에는 타다금지법이 재소환되면서 정치권에서도 찬반 논쟁이 불거졌다. 모빌리티 플랫폼 업계도 가세하면서 혁신과 성장에 대한 규제 논리로 확전되고 있다.
승차 공유를 포함한 새로운 플랫폼은 교통정책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제주는 대중교통 역할을 하는 택시와 관광객들이 이용하는 렌터카의 분담률이 높은 지역이기 때문이다.
대선을 앞두고 타다금지법이 현안으로 떠오를 수 있다. 기존 운송업계와 공유경제가 상생하는 방안이 마련되면 소비자 편익과 함께 제주 교통정책에도 일대 변화와 마주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