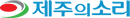[조용해서 더 아픈 손가락] ④ 호흡기장애인 강희용씨
장애인 인구 270만명 시대. 그 중에서도 안면, 심장, 뇌전증, 간, 장루·요루, 호흡기 장애를 앓는 이들은 전체의 1%도 채 되지 않는 ‘소수 장애인’으로 분류된다. 이들은 장애인이라는 소수자 안에서도 또다시 소수로 분류되며, 제도와 사회의 시선에서 더욱 먼 변두리에 서 있다. [제주의소리]는 이중의 소외를 겪고 있는 ‘소수장애인’들의 삶을 조명하며, 낯설고 적은 수라는 이유로 정책과 복지의 중심에서 밀려난 이들의 현실은 어떤지 그들의 목소리를 통해 전한다. [편집자주]

“숨만 쉬어도 산다지만, 우리 같은 호흡기장애인에게는 숨 쉬는 것조차 늘 버거운 일이죠.”
최근 제주탐라장애인복지관에서 만난 강희용(가명·76)씨는 말하는 내내 숨이 몰아쳤다. 쇳소리가 섞인 쉰 목소리. 그는 척추와 호흡기, 두 가지 중증 장애를 안고 산다.
강씨의 장애는 초등학교 시절 학교폭력에서 비롯됐다. 3학년 무렵, 친구에게 빗자루 손잡이로 심하게 맞은 뒤 척추가 C자 형태로 휘어버렸다. 지금 같으면 학교폭력으로 처벌받을 일이었지만, 그 당시로는 꾹 참을 수밖에 없었다.
강씨는 “그때부터 학교생활이 힘들어졌다”며 “너무 공부하고 싶었는데 제대로 다니지 못했다. 지금도 공부에 대한 한이 크다”고 말했다.
세월이 흐르며 등은 점점 굽어갔다. 결국 폐 기능까지 영향을 미쳐 10년 전 호흡기장애 진단을 받았다.
젊어서부터 척추장애로 고생했기에 결혼을 하지 않으려 했다. 그러나 집안 장녀였던 그는 가족의 설득 끝에 중매로 결혼했다. 남편은 착했지만 알코올중독이 있었고,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 장애를 안은 채 홀로 두 아이를 키우는 일은 고된 여정이었지만, 두 아들을 모자람 없이 길러냈다.
생계를 위해 슈퍼를 운영하다 지인에게 세탁공장 일자리를 소개받아 7년간 일했다. 하지만 먼지와 화학약품 냄새가 가득한 세탁공장은 호흡기 장애인에게 가장 열악한 공간이었다. 결국 병원에 실려간 뒤에야 일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
강씨는 “숨쉬기도 힘든데, 먼지를 너무 많이 먹어 입원한 적도 있었다”며 “그래도 먹고 살려면 버텨야 했다. 척추장애에 호흡기장애까지 겹치다보니 남들보다 일이 뒤쳐질 수 밖에 없었고, 늘 비교당하며 야단맞기 일쑤였다. 속으로 정말 많이 울었다”고 말했다.
이제 강씨의 삶은 대부분 집 안에서 이뤄진다. 그런 그의 곁에는 늘 산소통이 놓여 있다. 매달 12만원의 유지 비용이 들어가지만, 별도의 지원은 없다.
그는 “숨 쉬는 게 제일 어렵다”며 인터뷰 내내 가슴을 연신 두드렸다.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말하다가 호흡이 막혀서 끝내 못 하니 답답할 때가 많다”고 했다.

외출은 최대한 줄인다. 횡단보도조차 건너기가 두렵기 때문이다. 강씨는 “천천히 걷다보면 신호등이 금새 바뀌어 버린다”고 토로했다. 이는 모든 호흡기 장애인들이 겪는 불편이기도 하다.
강씨는 목소리가 약해 교통약자 택시를 부를 때도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다. 언제는 수화기 너머로 도착지를 이야기하던 중 기사에게 목소리가 약해 기사에게 ‘안 들린다’는 핀잔을 듣기도 했다. 병원에 가서도 의사를 보러 가기까지 걷는 일이 힘겹다.
호흡기장애인에게는 작은 환경 변화도 위협이 된다. 미세먼지와 황사, 고기 굽는 연기조차 치명적이다. 강씨는 태풍 같은 재난 상황이 닥치면 ‘급히 달려가야 할 일이 생기면 어쩌나’ 하는 불안에 시달린다고도 전했다.
그가 바라는 것은 거창하지 않다. 낮은 씽크대와 안전한 욕실, 가벼운 보행기 지원, 공기청정기 보급 같은 일상적 배려다.
강씨는 “집에서라도 할 수 있는 가벼운 일, 내 몸에 맞는 일이 있으면 바랄게 없다”고 말했다.
호흡기장애인들은 강씨와 마찬가지로 일상 곳곳에서 ‘숨’을 이유로 제약을 받는다.
정기 진료조차 이동이 어려워 포기하는 경우가 많고, 집 안의 먼지나 곰팡이, 겨울철 난방 연료 냄새도 증상을 악화시킨다.
장시간 노동은 불가능해 경제적 자립이 막히고, 외출을 자제하다 보니 사회적 고립감과 우울증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에 전문가들은 “호흡기장애인의 경우 단순한 이동 지원을 넘어 주거환경 개선, 의료 접근성 보장, 맞춤형 일자리 마련 같은 사회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 이 인터뷰는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이 주관하고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후원한 ‘소수장애인의 복지욕구 및 실태에 관한 연구’의 포커스 그룹 인터뷰(FGI)로 진행됐습니다. 희용씨와 같은 1% 미만의 소수장애인들의 목소리가 정책에 닿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