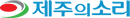[4.3 때 뒤틀린 가족 찾기 나선 제주 사람들] ③ 김상종(64)씨

“그 어린 나이에 겁에 질려 엄마 옷가지를 잡고 끌려가 아무 이유 없이 죽임을 당한 거잖아요. 그런데 누구 하나 이름을 기억하는 이가 없어요. 호적에도 오르지 못했으니 그야말로 세상에 없는 존재가 된 거죠. 그럼 안 되는 거잖아요. 학살을 자행한 국가가 이제라도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최근 제주시 조천읍 북촌리에서 만난 김상종씨(64)는 얼굴도, 이름도 알지 못하는 이복누나들을 떠올릴 때마다 가슴 한쪽이 바늘에 찔린 듯 아릿해진다고 했다.
어떤 기구한 운명을 타고났기에, 세상에 나와 이름 석 자도 남기지 못했을까. 끔찍했던 4.3의 광풍이 몰아친 194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평화로운 바다를 자랑하는 북촌리는 4.3 당시 가장 큰 비극을 안은 마을로 꼽힌다. 1949년 1월17일 ‘북촌사건’이 일어났다. 이날 아침 제2연대 3대대의 중대 일부 병력이 대대본부가 있는 함덕으로 가던 도중 북촌마을 너븐숭이에서 무장대의 기습을 받은 군인 2명이 숨졌다.
보초를 서던 원로들은 군인 시신을 군부대로 운구해 가라는 명령을 받고 들것에 실어 함덕리 주둔부대로 찾아갔고, 흥분한 군인들은 본부에 찾아간 9명의 연로자 가운데 경찰 가족 한 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사살했다.
이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사람이란 사람은 전부 북촌초등학교 운동장으로 내몰아 무자비하게 총격을 가했다.
김씨의 할아버지 김원길과 아버지 김석호(1922~1964)의 첫 번째 부인 양수정(1923~1949) 그리고 이복누나 2명(?~1949)도 마을 사람들과 함께 운동장에 끌려가 죽임당했다. 당시 몸을 피했던 아버지만이 홀로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다.
아버지와 사실혼 관계에 머물던 양수정과 피붙이 두 딸은 호적에 올라가지도 못한 채 눈을 감았다. 그마저 두 딸은 엄마와 달리 이름도 잃었으며, 유해도 어디에 묻혀있는지 아무도 기억하지 못한다. 4.3의 산 증인인 동네 어르신들은 “분명 어디 소낭 밭에 묻혀 이실 거여”라고 짐작하기만 했다.

아버지는 할아버지와 아내, 두 딸을 잃고 4.3 사건의 여파가 가라앉을 즈음인 김씨의 어머니 윤희순과 재혼했다.
그 사이에서 2남1녀를 둔 아버지는 오랜 기간 지병을 앓다 김씨가 5살 될 적 사망했다.
1960년생인 김씨는 아버지가 어쩌다 4.3 이야기를 꺼내도 워낙 어려 알 수 없었다. 단지 음력 12월19일이 되면 온 동네가 명절보다도 북적였기에 희한한 일이라 생각하며 얼마나 많은 희생이 있었을지 가늠할 뿐이었다.
4.3의 참혹한 진상을 알게 된 건 고등학생 때의 일이었다. 입 밖으로 꺼내는 것조차 금기시되던 시기를 지나 수십년 만에 4.3의 비극이 수면 위로 올라왔고, 한참 뒤 유족회가 발족하며 진상 조사가 이뤄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70여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양수정과 두 딸은 호적에 오르지 못하면서 가족과 ‘남’으로 남아있다. 오랜 시간이 흘렀듯 이제 그들을 기억하는 이들도 없다.
희생자로 기록돼 제주4.3평화공원 위패봉안실에 이름이 올랐지만, 이곳에서도 이복누나들은 ‘1녀’, ‘2녀’로 이름을 찾지 못한 채 남아있다.
김씨는 휴대전화 사진첩에 있는 이복누나들의 위패를 보여주며 “군인, 경찰 가족을 빼고는 모두 다 갈겨 죽였으니,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비극”이라며 “비참하기도 했지 참...”하고 말끝을 흐렸다.
그는 양수정을 큰어머니라 불렀다. 김씨는 “아버지네 형제자매는 운 좋게 학살에서 빗겨나갔지만, 큰어머니는 4.3으로 모든 가족을 잃었다”며 “그래서 누구도 기억해 줄 사람이 없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아들의 심경으로 생각하면 눈물이 차오른다”고 말했다.
특히나 이복누나들을 떠올리는 김씨의 심경은 누구보다도 절절했다. 그는 “첫 번째 어머니의 유해는 아버지, 할아버지와 함께 북촌 공동묘지에 모셔 매년 벌초와 제사를 지내며 자식 됨됨이를 하고 있지만, 이복누나들의 유해는 어디 있는지조차 알지 못하니 가슴이 꽉 막힌 것처럼 답답하기만 하다”며 “이제라도 누나들의 가족으로 남고 싶은 마음”이라고 글썽였다.
어느덧 흰머리가 성성한 60대 중반이 된 김씨는 큰어머니와 이복 누나들을 아버지 밑으로 등재해 뒤틀린 가족관계를 정정하는 과정을 밟고 있다. 이제라도 가족으로 인정받는 것이 그의 마지막 바람이다.
김씨는 “누군가는 보상금에 혈안이라고 말하지만, 보상은 큰 문제가 아니다. 그 돈 없이도 평생을 잘 살아왔다.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났으면 어떻게 살다 죽었는지 기억하는 것이 후손들의 몫이다. 그걸 해내지 못했기에 평생의 한으로 남았다. 발자취를 정확하게 따져 원혼의 억울함이 없도록 풀어야 한다. 그것이 살아남은 자들, 후손의 과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