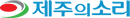[소나무 재선충병 기획] ② 진입로 내면서 일대 '처참'...곶자왈 맞춤형 방제 ‘절실’
제주에서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에 투입된 예산만 1000억원에 육박했다. 수많은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고 있지만 기대했던 방제성과는 거두지 못하고 있다. 그사이 수백년간 제주 땅에 뿌리를 내리며 자라온 보호수들이 줄줄이 고사하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주민들이 환경파괴를 우려하며 방제작업을 막는 일까지 벌어졌다. 지역 특성에 맞는 제주형 방제를 위한 연구는 더디기만 하다. 당장 추진해야할 제3차 방제 계획 수립도 걱정이다. [제주의소리]가 4번째 재선충 기획을 통해 방제 실태와 문제점을 짚어봤다. -편집자주
글 싣는 순서
①‘600년 소나무의 눈물’ 사라지는 보호수
②‘잘려나간 곶자왈’ 온몸으로 막는 주민들
③소나무방제에 1000억, 연구에는 고작 2억

방제를 위한 중장비 투입시 청수리와 산양리, 저지리 주민들은 온몸으로 저지할 각오까지 하고 있다. 제주 생태계의 허파로 불리는 ‘곶자왈’ 마을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곶자왈은 제주도 화산활동 중 분출한 용암류가 만들어낸 불규칙한 암괴지대로 숲과 덤불 등 다양한 식생을 이루는 곳이다. 분포면적은 제주도 전체면적의 6%인 1만900ha에 달한다.
토양이 빈약한 반면 온도변화폭이 작고 습도가 높아 세계적 멸종위기종인 제주고사리삼을 비롯한 다양한 양치식물과 선태식물이 자란다. 희귀동물의 보금자리 역할도 한다.
주민들의 방제거부 지역은 한경-안덕곶자왈 지대에 속하는 청수 곶자왈이다. 다양한 식생은 물론 돌숯가마와 농경유적인 산전(山田) 등 역사문화유적이 연이어 발견된 지역이다.
제주시는 2014년 11월부터 청수 곶자왈에 대한 고사목 제거작업을 시작했다. 청수와 산양,저지로 이어지는 곶자왈 면적만 400ha다. 내부에 자라는 소나무만 1만 그루로 추정된다.
문제는 작업 중 발생하는 산림훼손 등 환경 파괴다. 고사한 소나무는 재선충병을 확산시키는 숙주역할을 하는 만큼 베어낸 후 밖으로 꺼내 옮기고 파쇄까지 마쳐야 한다.
작업자들은 이를 위해 곶자왈 내부로 들어갈 수 있는 진입로를 만든다. 이 과정에서 곶자왈 식생 훼손이 계속되고 있다. 고사목 제거 작업을 틈타 백서향 등도 무단 도채되고 있다.



김문혁 한경면 산양리장은 “곶자왈 방제작업을 하던 인부들이 구찌뽕(국가시나무) 등을 캐서 화분에 심는 모습을 목격했다”며 “향기가 좋은 백서향도 불법 도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주의소리]가 청수 곶자왈 일대를 확인한 결과 도로변에서 곶자왈 내부로 이어지는 진입로를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나무들의 무덤으로 착각할 만큼 ‘초토화’ 그 자체였다.
종가시나무와 팽나무 등 수목들이 잘려 나갔고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지정 희귀종인 백서향(천리향) 훼손 흔적이 보였다. 바위에 붙어 자라는 콩짜개난(돌난)도 널브러져 있었다.
중장비 이동이 쉽게 나무를 자르고 울퉁불퉁한 지면은 인근 바위로 메워진 채 방치됐다. 여기저기 무너진 돌담과 잘려나간 나무가 보였지만 원상복구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다.
김성훈 한경면 청수리장은 “곶자왈은 각종 희귀생물이 많아 생태적 가치가 높다”며 “빈데 잡으려다 초가 삼간 태울 수는 없다. 생태계 보호를 위해 작업을 막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곶자왈은 다른 지역과 달리 집단고사목 발생지역이 없고 단목 등의 형태로 여러 곳에 흩어져 있다. 때문에 고사목을 발견하더라도 제거 작업이 어렵다.
당장 3월말, 늦어도 4월까지 고사목을 제거해야 하지만 제주시는 곶자왈 작업 설계조차 하지 못했다. 2013년을 기점으로 재선충병이 창궐했지만 3년째 뚜렷한 매뉴얼도 없는 실정이다.



제주시는 항공방제와 훈증, 도르래 이용 등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지만 뚜렷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추가 작업에 따른 예산 확보도 걱정거리다.
제주시청 관계자는 “청수 곶자왈 내부에는 운반거리가 800m에 이르는 소나무도 있다. 고사목을 방치할 경우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수 있는 만큼 반드시 제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곶자왈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진입로를 활용하는 등 여러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조만간 곶자왈 방제 계획안을 마련해 주민과 대화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항공방제의 경우 환경단체는 물론 주민들도 반대하고 있다. 친환경 작물과 도내 최대 규모로 알려진 반딧불이(개똥벌레) 서식지 파괴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지하수 오염도 걱정거리다.
김성훈 청수리장은 “곶자왈 주변에 40여 농가가 토마토와 딸기 등 친환경농업을 하고 있다”며 “항공방제를 하면 생태계 파괴는 물론 지하수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종우 미래에코시스템 엔지니어링연구소장은 “항공방제는 생태계 파괴 문제로 외국에는 이미 포기한 방식”이라며 “제주도의 주장처럼 생태계가 곧 복구될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김정순 곶자왈사람들 사무처장은 “재선충 방제 10년이 지나도록 곶자왈 등 지형에 맞는 방제법조차 마련되지 않았다”며 “방제만 위한 무차별 방제는 또다른 환경파괴”라고 꼬집었다.
김 사무처장은 “곶자왈 소나무 제거 작업에 앞서 주변 환경으로의 매개충 이동 등 사전연구가 필요하다”며 “더 늦기 전에 친환경적 방제방법 등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