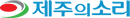[4.3 때 뒤틀린 가족 찾기 나선 제주 사람들] ① 이용석(76)씨

태어나자마자 제주4.3을 겪은 노인은 2명의 어머니가 있다는 사실을 말하면서 눈시울을 붉혔다. 어머니 중 한명은 얼굴조차 본 적이 없고, 성인이 되고 나서야 존재 사실을 알았다. 갑자기 찾아온 사람의 부탁으로 시작된 제사와 벌초는 어느덧 50년째 이어지고 있다.
이용석(76)씨가 태어난 1947년 제주에는 4.3의 광풍이 몰아쳤다. 이씨의 고향은 제주시 조천읍 북촌리. 그는 갓난아이 때 어머니 등에 업혀 북촌초등학교에서 벌어진 집단학살에서 살아남은 생존자다.
북촌 집단학살은 4.3으로 비롯된 단일 사건으로는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사건이다. 마을 단위로는 노형 다음으로 많이 희생된 지역이 북촌이며, 북촌 다음으로 가시리와 화북, 이호, 도두 등 지역에서 각각 3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다.
이씨의 증조모와 조부모, 아버지(이윤옥) 모두 4.3으로 삶을 마감했다.
1949년 1월 당시 북촌은 말 그대로 지옥과 같았다. 군인 2명이 숨진 채 발견되자 군·경 토벌대는 분노하면서 북촌 마을을 모두 불태웠고, 마을 사람들을 모두 북촌초등학교로 모이게 했다.
이어 사람들을 2곳으로 나뉘게 했는데, 한쪽에는 군·경의 가족이나 민보단 관계자 등이 모였다. 그들을 제외한 나머지들은 10명 정도씩 다른 곳으로 끌려갔고, 총성이 울리면서 수백명의 목숨이 사라졌다.
당시 이씨는 어머니 고(故) 부옥전(당시 19) 등에 업혀 있었다. 부옥전도 총살될 그룹으로 끌려갈 뻔 했는데, 부옥전은 자신의 아버지 덕에 생존자 그룹으로 이동할 수 있었다.
부옥전의 아버지 고 부기선은 표선리에서 개원해 1946년부터 제주시 이도1동에서 ‘십자의원’을 운영하던 의사다. 당시 부기선은 제주도립병원에서 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부옥전은 토벌대에 구타를 당하면서도 자신의 아버지가 도립병원에서 일한다며 살려달라고 애원했고, 도립병원에서 치료받은 적 있는 군·경이 부옥전의 얼굴을 기억하면서 생존했다. 부옥전 등에 업혀 있던 이씨도 가까스로 목숨을 부지했다.
토벌대는 생존자들을 향해 함덕으로 이동할 것을 명령했고, 함덕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연출됐다. 토벌대가 사람들을 2개의 그룹으로 나눌 때 부옥전은 아버지의 이름을 언급해 생존할 수 있었다.
이씨는 중학생때까지 10여년을 함덕에서 살았고, 어머니 부옥전이 서울 사람과 재가하면서 같이 제주를 떠났다. 가족관계등록부에 이씨는 아버지 이윤옥과 어머니 부옥전의 아들로 기재돼 있다.
24살에 나이로 결혼한 이씨는 서울에서 안경점을 운영하면서 2남1녀를 뒀다.
성인이 된 이씨는 제주에 남아있는 친인척을 만나기 위해 가끔씩 북촌을 찾았는데, 어느날 모르는 사람이 찾아왔다.
그들은 이씨에게 4.3 때 사망한 고 고흥희에 제사를 지내야 한다고 말했다. 고흥희가 누군지 몰랐던 이씨가 어머니 부옥전에게 묻자 제사를 지내라는 대답을 들었다.
고흥희는 이씨의 아버지 이윤옥과 1년 정도 같이 살았는데, 이윤옥과 고흥희가 별거한 이후 이윤옥이 부옥전을 만나 이씨를 낳았다.
당시 이윤옥과 고흥희의 집안 사람들은 부옥전이 낳은 아들을 고흥희에게 양자로 보내기로 약속도 했다.

그러던 중 제주4.3이 몰아치면서 이윤옥과 고흥희를 비롯해 북촌 마을 수백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으면서 이씨는 양자가 아닌 부옥전의 아들로 계속 남게 됐고, 고흥희의 친인척이 성인이 된 이씨를 찾아와 제사와 벌초를 맡긴 상황이다.
부옥전은 이 같은 상황을 설명해주면서 아들 이씨에게 고흥희를 정성스레 모셔야 한다고 강조했다.
몰랐던 집안 사정을 알게 된 이씨는 1974년부터 매년 4월11일에 고흥희의 제사를, 또 1975년부터 고흥희 묘지 벌초를 맡고 있다.
이씨는 60세의 나이로 서울 생활을 모두 정리해 고향 제주로 돌아왔다. 때마침 고흥희의 묘가 있던 토지가 다른 사람에게 팔리게 되면서 이씨는 고흥희의 묘를 마을공동묘지로 이장했다. 이장하면서 이씨는 고흥희 묘비에 양자 ‘용석’이라며 자신의 이름도 새겨 넣었다.
2005년에는 고흥희에 대한 4.3희생자 신고를 한 고흥희 친익척과 만나 각서도 받았다. 자신이 고흥희에 양자로서 모든 역할을 다하겠다는 취지다. 고흥희는 이듬해인 2006년 4.3희생자로 결정됐다.
이씨는 고흥희의 유족으로 인정해달라고 신청했지만, 올해 제주4.3실무위원회로부터 유족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문서를 받았다.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라 이씨가 고흥희의 자녀로 등록돼 있지 않은 것이 이유다.

4월의 어느 날 조천읍 북촌리에서 만난 이씨는 “저에게는 2명의 어머니(고흥희, 부옥전)가 있고, 20대때부터 얼굴한번 본 적이 없는 큰 어머니(고흥희)의 제사와 벌초를 도맡아 양자로서 역할을 다하려고 평생을 노력해 왔다. 4.3이 없었다면 큰 어머니 품에서 자랐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큰 어머니 유족으로 인정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가족관계등록부 문제로 인정받지 못하는 이 마음이 어떻겠나. 누군가는 4.3희생자 보상금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제사와 벌초를 시작한 1970년대는 4.3을 언급조차할 수 없었던 시기다. 또 2005년에 큰 어머니 친인척으로부터 각서를 받았는데, 2005년에도 보상금 같은 얘기는 전혀 없었다. 나는 돈이 아쉬울 나이도 아니다”라며 눈시울을 붉혔다.
이씨는 “얼굴도 모르지만, 큰 어머니의 양자라고 생각해 살아온 세월이 유족 불인정이라는 문서 하나에 무너지는 기분이다. 뉴스를 보니 가족관계정정 등이 가능해진다고 하더라. 호적(가족관계등록부)을 정정해서라도 큰 어머니의 아들로 인정 받고 싶다”고 말했다.
현재 이씨는 고흥희의 유족으로 인정받기 위해 당시 상황을 기억하는 마을 주민들로부터 인우보증(鄰友保證)을 받는 절차 등을 밟고 있다.